산업
다시 불거진 재벌가 상속 분쟁을 현대차 오너가가 주목하는 이유는
LG그룹의 상속 분쟁 사태로 재벌가들의 집안싸움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분 상속 과정에서 유언장이 있든 없든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일어난다. 지분은 곧 경영권과 재산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LG가의 상속 분쟁은 향후 현대차 오너가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비상한 관심을 끈다. 현대차 오너가 지분 상속 관심 증가 16일 재계에 따르면 LG가의 상속 분쟁은 과거 같은 내란을 겪었던 삼성그룹, 한진그룹, 한화그룹에 이어 현대차그룹의 오너가까지 소환하고 있다. 현대차 역시 정의선 회장이 경영 승계를 통해 총수가 됐지만 아직 지분이 미진하기 때문이다. 정의선 회장은 지난 연말 기준으로 현대차 지분 2.62%를 보유하고 있다. 정몽구 현대차 명예회장이 5.33%를 지닌 개인 최대주주다. 이에 정몽구 명예회장의 지분 향방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인 정몽구 명예회장의 지분은 증여보다는 지분 상속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대차 오너가도 언젠가는 찾아올 ‘정 명예회장의 지분 배분 해법’을 고려해야 하는 시점이다. LG가에서 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더욱 꼼꼼하게 접근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은 셈이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현대차그룹에서도 LG그룹의 상속 분쟁을 눈여겨볼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분쟁 결과가 현대차 오너가의 상속 과정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현대차는 경영 승계는 이뤄졌지만 지배구조상 아직 지분이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전기차로 빠르게 전환하는 등 모빌리티그룹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현대차의 지분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천문학적인 금액이라 지분에 대한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정 명예회장의 배우자인 이정화 여사는 고인이 됐지만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식이 4명(1남3녀)이나 된다.
정의선 회장의 경영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구광모 회장의 상속처럼 지분을 일정 부분 몰아주는 시나리오가 가장 좋다. 하지만 정 명예회장의 딸들도 사업을 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의선 회장의 누나인 첫째 딸 정성이 이노션 고문, 둘째 딸인 정명이 현대커머셜 사장은 현대차 지분이 극히 미미하다. 둘은 0.1%도 되지 않은 1445주를 보유하고 있다. 셋째 딸인 정윤이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사장은 현대차 지분이 전무하다. 경영권을 물려받은 외동아들 정의선 회장은 559만8478주를 갖고 있다. 유산 상속 시 법정 비율대로라면 자식 4명이 정 명예회장의 지분을 4등분으로 나누게 된다. 그러면 한 명당 1.33%씩 돌아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정의선 회장의 지분율은 3.95%로 4%도 되지 않게 된다.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는 지분율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이에 현대차와 기아 지분 비율을 적절히 배분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정 명예회장은 현대모비스 지분 7.19%, 현대제철 지분 11.81%도 갖고 있다. 지분을 4명에게 똑같이 나누는 것보다 계열사 지분을 적당히 배분한다면 정의선 회장의 현대차 지분을 높일 수 있는 해법도 찾을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현대차그룹은 지배구조 개편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주사 전환 작업이 여의치 않은 현대차그룹은 현재 현대모비스 →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로 지배하고 있는 형국이다. 정의선 회장이 현대모비스 지분을 확대하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LG의 경우 딸들의 경영 참여가 거의 없었던 반면, 현대차 오너가는 여성들도 사업을 하는 등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에 상속 과정에서도 제 몫을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재벌가의 상속 분쟁, 잡음 최소화에 초점 과거 유언장을 통한 지분 상속은 많은 잡음을 불려 일으켰다. 삼성그룹의 이건희, 이맹희 형제가 벌인 상속 분쟁이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규모도 컸다. 이병철 창업주의 재산 규모가 컸던 만큼 소송 금액이 4조원대에 달했다. 2012년 이맹희 전 CJ그룹 회장은 알려지지 않은 차명 주식을 동생인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이 가져갔다며 소를 제기했다. 동생인 이숙희 씨도 가세해 이건희 전 회장을 상대로 지분을 요구했다. 당시 경영권을 승계받은 이건희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주식을 지분을 이병철 창업주에게 그대로 물려받은 바 있다.
유언을 통해 이건희 전 회장이 몰아서 받았기에 상속 분쟁의 빌미가 된 셈이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이건희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맹희 전 회장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했다. 재산을 두고 벌어진 형제간 법정 다툼은 2년 만에 막을 내렸다. 당시 이맹희 전 회장의 법률대리인 측은 “주위의 만류도 있고, 소송을 이어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 간 관계라고 생각해 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화그룹도 명확한 유언을 남기지 않아 형제간 재산 분쟁이 벌어진 경우다. 김종희 한화그룹 창업주는 1981년 갑작스럽게 타계했고, 김승연 회장이 20대의 젊은 나이에 경영을 승계했다. 김승연 회장의 동생인 김호연 전 빙그레 회장은 김종희 창업주의 유산 40%의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992년 당시 김호연 전 회장은 김승연 회장이 본인과 의논하지 않고 임의로 상속재산을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3년 6개월 동안 31차례나 재판이 이어졌다.
둘은 1995년 할머니의 장례식 때 만나 재산 분할에 합의하고 소송도 모두 취하하면서 분쟁을 마무리 지었다. 또 그해 어머니의 칠순 잔치에서 화해했다. 한진그룹은 유언장대로 상속했음에도 형제간 다툼이 벌어졌다. 조충훈 창업주가 사망하면서 뒤늦게 유언장이 공개됐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등을 물려받았다. 하지만 동생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은 2005년 정석기업의 주식 7만주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으로 인해 한진은 유언장까지 감식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법원은 원래 재산 분할에 합의한 대로 정석기업의 주식을 조남호 회장과 조정호 회장에게 증여하도록 강제조정 결정을 내리면서 소송은 막을 내렸다.
유언장이 있든 없든 상속 분쟁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유언장 없이 법정 비율대로 상속하는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다. 삼성그룹도 이건희 전 회장 사망 이후 법정 비율대로 상속이 이뤄지면서 잡음이 일어나지 않았다. 오일선 소장은 “법정 비율대로 상속하는 것이 상속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꼽히고 있다”며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 재벌가의 재산 분할이라 형제, 남매간 의 상하지 않고 뒷말이 나오지 않는 게 중요한데, 최근 재벌가에서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3.17 07:00






![‘아내 폭행 살해’ 前김포시의회 의장, 살인 무죄로 징역 7년 [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0300001B.jpg)
![비만치료제, 가격 인하 전망에도 시장은 더 커진다[클릭, 글로벌 제약·바이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0200477T.jpg)


![[PC&MOBILE-리뉴얼] 행사&비즈니스7 (300x80)](https://image.isplus.com/data/isp/upload/save/popup/isp16956935979933.600.0.png)
![[[PC&MOBILE-리뉴얼] 행사&비즈니스1 (300x80)](https://image.isplus.com/data/isp/upload/save/popup/isp16955536343819.600.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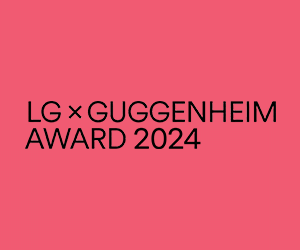

![[포토] 허경민, 9회 안타 쳤으나](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4/06/02/isp20240602000297.400x280.0.jpg)
![[포토] 두산, 잠실전 3연패](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4/06/02/isp20240602000296.400x280.0.jpg)
![[포토] LG, 3연승 세리머니](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4/06/02/isp20240602000295.400x280.0.jpg)
![[포토] LG, 기분 좋은 3연승](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4/06/02/isp20240602000294.400x280.0.jpg)
![[포토] LG, 두산 전 스윕](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4/06/02/isp20240602000293.400x280.0.jpg)
![[포토] 김대현-박동원, 우리가 이겼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4/06/02/isp20240602000292.400x280.0.jpg)
![[포토] 염경엽 감독, 신나는 홈런 축하](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4/06/02/isp20240602000290.400x280.0.jpg)
![[포토] 염경엽 감독, 홈런을 환영해](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4/06/02/isp20240602000289.400x280.0.jpg)
![[포토] 문보경, 짜릿한 백투백 홈런](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4/06/02/isp20240602000288.400x280.0.jpg)
![[포토] 문보경-오스틴, 홈런 포옹](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4/06/02/isp20240602000287.400x280.0.jpg)
![[포토] 오스틴 투런포, 감독도 신나](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4/06/02/isp20240602000286.400x280.0.jpg)
![[포토] 오스틴 투런포, 기분 좋은 세리머니](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4/06/02/isp20240602000285.400x28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