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뭘 해도 안 되더라"...LG '울보경'의 다짐 "후반기 다시 시작"
- [TVis] 장근석 “갑상선암 발견 후 10개월 만에 수술, 부모님께도 말 안 했다”(‘라스’)
- [TVis] 이홍기 “日 가장 싫어하는 10대 연예인 선정”…알고보니 열애설 탓?(‘라스’)
- [TVis] 신지, 결혼 논란 심경 “너때문에 코요태 끝났다 댓글이 제일 힘들어” 눈물(‘유퀴즈’)
- ‘세대교체 천명→동아시안컵 우승’ 초석 다진 신상우 감독 “신구조화가 한 방향으로 갈 수 있어”
- ‘1달 만에 경신’ 육상 이재웅, 남자 1500m 신기록
- 대성, 8월 호주 멜버른 콘서트 취소 “예기치 못한 기술 및 제작 사유”[전문]
- [TVis] 김종민 신혼 일상 “귀가하면 아내가 반겨줘, 너무 행복” (‘유퀴즈’)
- 결승 골 터뜨린 ‘지메시’의 웃음 “우승까지 오래 걸려…더 좋은 팀 될 것”
- 이수근 측 “건물 매각, 아내 건강 문제 아닌 자산운용 계획 따른 것”[전문]
스포츠일반
창단 첫 정상KT, ‘우승하니까 더 바쁘네’
등록2011.03.16 10:29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한 부산 KT가 때아닌 고민에 빠졌다. 행복한 고민이 대부분이지만 머리 아픈 고민도 있다.
KT는 2003년 코리아텐더를 인수한 뒤 구단 사상 처음으로 프로농구 정상에 올랐다. 부산을 연고로 한 프로스포츠단으로는 프로축구 대우 로얄즈가 1997년 우승한 이후 14년 만이다.
KT 사무국 직원들은 당장 20일 열리는 울산 모비스와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 준비로 눈코 뜰 새가 없다. KT는 이날을 챔피언스데이로 지정했다. 홈 팬 앞에서 치르는 우승 축하연이다. 이 자리에는 이석채 KT 회장을 비롯한 임원 및 전국에 있는 5000여 KT 직원, 허남식 부산시장과 부산 지역 기관장이 대거 참석한다. 이권도 사무국장은 "우승을 처음 해 봐서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다. 정신이 없다"며 웃었고, 이상국 홍보팀 대리는 "이날 꼭 만원 관중을 채우고 싶다"고 했다.
농구에 투자를 아끼지 않은 KT는 대대적인 선물 보따리를 풀 예정이다. 아이폰4G와 최고급 정장 한벌씩을 선수와 코칭스태프 등 우승에 기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포상금을 주자는 얘기도 나온다. KT의 한 관계자는 "이러다 챔프전까지 우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며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KT는 이석채 회장이 일일이 선수단을 챙길 만큼 농구단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크다. 농구단의 요구 사항을 거의 다 들어줘 통이 큰 전창진 감독조차 몸 둘 바를 모른다고 한다. 하지만 모기업의 기대가 큰 만큼 고민도 많다. 삐끗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다.
가장 신경 쓰이는 건 다가오는 4강 플레이오프다. KT는 원주 동부·서울 삼성·창원 LG 중 한 팀과 격돌하는데 세 팀 다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KT의 한 관계자는 "정규리그에서 우승해 기대치가 더 높아졌는데 챔프전에 못 올라가면 정말 큰일이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KT는 지난 시즌 4강 플레이오프에 직행하고도 전주 KCC에 져 챔피언결정전에 오르지 못한 아픈 기억이 있다. 우승을 확정지은 뒤 간만에 푹 잔 전창진 감독은 다시 잠을 뒤척이고 있다.
김우철 기자 [beneath@joongang.co.kr]
당신이 좋아할 만한정보
AD
당신이 좋아할 만한뉴스
지금 뜨고 있는뉴스
행사&비즈니스
많이 본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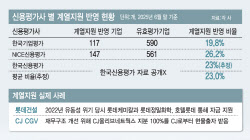










![[포토] 아크, 사랑스러운 소년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7/16/isp20250716000494.400x280.0.jpg)
![[포토] 아크 '호프'로 컴백했어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7/16/isp20250716000495.400x280.0.jpg)
![[포토] 아크, 세 번째 미니 앨범 '호프'로 컴백](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7/16/isp20250716000496.400x280.0.jpg)
![[포토]이프아이 카시아, 신비스러운 눈빛](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7/16/isp20250716000493.400x280.0.jpg)
![[포토] 아크 도하, 시크한 춤선](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7/16/isp20250716000482.400x280.0.jpg)
![[포토] 아크 지빈, 댄스 타임~](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7/16/isp20250716000483.400x280.0.jpg)
![[포토] 아크 최한, 무대 장인](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7/16/isp20250716000479.400x280.0.jpg)
![[포토] 아크 끼엔, 사랑스러운 미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7/16/isp20250716000480.400x280.0.jpg)
![[포토] 아크 최한, 내가 부리더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7/16/isp20250716000481.400x280.0.jpg)
![[포토] 아크 현민, 끼 가득 미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7/16/isp20250716000475.400x280.0.jpg)
![[포토] 아크 앤디, 눈빛에 심쿵](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7/16/isp20250716000478.400x280.0.jpg)
![[포토] 아크 리오토, 왕자님 눈빛](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7/16/isp20250716000477.4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