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금메달 침묵 깬 中, 한국 뛰어넘고 신났다 “그들의 조롱은 너무 일렀다” [2026 밀라노]
- 은퇴 위기 딛고 일어선 이해인, 씩씩했던 올림픽 데뷔전…클린 연기와 입상 도전 [2026 밀라노]
- [스포츠토토 공동기획] WBC 개봉박두…한국계 4명 류지현호 VS 빅리거 8명 이바타호
- 피투성이 되고 UFC 첫 패→폭식 “미국인들처럼 비만은 아니지 않은가”…근황 공유한 핌블렛
- [2026 밀라노] 유승은, 슬로프스타일 결선 12위…멀티 메달은 좌절
- LG 예비역 1년 차의 다짐 '이정용답게'..."직구 더 빠르게, 더 공격적으로'
- 범접 불가능한 ‘얼음 위의 펠프스’ 크로스컨트리 클레보, 대회 5관왕→통산 10번째 금메달 [2026 밀라노]
- '1등 잡아봤어?' 스웨덴 꺾은 한국-캐나다, 女 컬링 최종전 대격돌…'세계 1위' 넘어야 메달 보인다 [2026 밀라노]
- 264,082,000,000원 받고도 또 '먹튀' 위기…한때 MLB 최고 3루수, 전지훈련 중 짐 싸서 집에서 재활
- [2026 밀라노] ‘개인전 노 금메달’ 남자 쇼트트랙, 히든카드 앞세워 골리앗의 빈틈 노린다
연예
[차길진의 갓모닝] 40. 애경사
등록2011.11.07 11:07
가을이 되면 애경사가 많다. 좋은 일도 많고, 슬픈 일도 많다. 경사건 조문이건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다. 어제 온 비엔 꽃이 피고, 오늘 온 비엔 꽃이 진다는 사실이다. 같은 비라도 어제와 오늘은 매우 다르다.
얼마 전 모 기업 임원의 가족행사에 참석했다.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부터 줄이 너무 길었다. 모두 그 임원의 손님이라고 생각하니 놀라웠다. 다들 빈손으로 오진 않았을 터. 순간 '이 분이 오래 가진 못 하시겠구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달 뒤 회사를 그만뒀다는 소식이 들렸다. 소문에 의하면 그날 행사를 본 총수에게 미움을 받았다나.
모름지기 애경사(哀慶事)는 조용히 소박하게 해야 한다. 사람이 많이 모이다보면 반드시 나쁜 소문이 돌기 마련이다. 과거 박 대통령 시절 모 고위공직자가 상가에 갔다가 화를 내면서 뛰쳐나갔다고 한다. 엄연히 공직자인 상주의 집이 궁궐을 방불케 할 정도로 지나치게 화려했던 것이다. 윗사람 입장에선 밑에 사람이 분에 넘치게 사치스러우면 일단 좋게 보지 않는다. 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소가 바로 애경사다. 얼마 전 한 공직자 자녀의 결혼식에 무려 30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찾아와 일대 교통이 마비되는 사태가 있었다.
결혼식에 초대받았던 한 지인은 '매우 불쾌한 행사'였다고 씁쓸해했다. 고위 공직자 자녀의 결혼식을 호텔에서 했으니 한 사람 당 적지 않은 액수의 봉투를 넣었을 텐데 무려 3000여 명이 북적거렸다면 도대체 결혼식 한 번에 얼마를 챙겼다는 것이냐며 "내 생애 돈 내려고 그렇게 오래 서 있어보긴 처음입니다"라며 한숨 쉬었다.
나 역시 얼마 전 애경사로 섭섭한 적이 있었다. 나와 동갑인 재미교포 사업가의 모친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다. 미국에 계신 분이기에 300불 정도의 조촐한 조의금을 보냈다. 그런데 며칠 뒤 그에게도 연락을 받았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 때문에 한국에서도 장례식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유명 종합병원 장례식에서 올린 영결식에는 대통령 화환을 비롯 수많은 재벌·기업인들의 화환들이 즐비했다. 미국으로 조의금을 보냈던 나는 한 번 더 조의금을 낼 수밖에 없었다. 평소 검소하며 소박하기로 소문난 그가 아흔이 넘은 어머니를 보내드리는 장례식을 미국과 한국에서 두 차례나 화려하게 치르는 이유를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장례식 후 나는 그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그는 미국으로 곧 돌아간다며 나를 찾아왔다. "차법사, 내가 뭐 섭섭하게 한 것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나는 조목조목 화려한 장례식을 두 번이나 한 이유를 물었다. 그는 가족들의 의견에 따랐을 뿐이라며 해명했지만 나와의 오해는 풀었을망정 두 번의 장례식으로 잃어버린 인심은 어떻게 할지 걱정됐다.
내가 아는 한 지인은 공직자의 후손이지만 부친의 묘에 상석도 비석도 놓지 않는다. 공작새가 나는 터라 일제 상석과 비석을 놓지 않았다고 했지만 무엇보다 공직자 가문으로서의 검소한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였다.
"부친은 출근하시기 전에 반드시 거울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오늘 절대 남에게 자장면을 얻어먹지 않는다.'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공직자라면 반드시 애경사를 검소하게 하고 남에게 대접받지 말 것이며 자신의 부를 과시해서는 안 된다. 이 가을 애경사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자신과 남을 위해 소박·검소함을 잃지 마시길 바란다.
(hooam.com/ 인터넷신문 whoim.kr)
얼마 전 모 기업 임원의 가족행사에 참석했다.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부터 줄이 너무 길었다. 모두 그 임원의 손님이라고 생각하니 놀라웠다. 다들 빈손으로 오진 않았을 터. 순간 '이 분이 오래 가진 못 하시겠구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달 뒤 회사를 그만뒀다는 소식이 들렸다. 소문에 의하면 그날 행사를 본 총수에게 미움을 받았다나.
모름지기 애경사(哀慶事)는 조용히 소박하게 해야 한다. 사람이 많이 모이다보면 반드시 나쁜 소문이 돌기 마련이다. 과거 박 대통령 시절 모 고위공직자가 상가에 갔다가 화를 내면서 뛰쳐나갔다고 한다. 엄연히 공직자인 상주의 집이 궁궐을 방불케 할 정도로 지나치게 화려했던 것이다. 윗사람 입장에선 밑에 사람이 분에 넘치게 사치스러우면 일단 좋게 보지 않는다. 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소가 바로 애경사다. 얼마 전 한 공직자 자녀의 결혼식에 무려 30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찾아와 일대 교통이 마비되는 사태가 있었다.
결혼식에 초대받았던 한 지인은 '매우 불쾌한 행사'였다고 씁쓸해했다. 고위 공직자 자녀의 결혼식을 호텔에서 했으니 한 사람 당 적지 않은 액수의 봉투를 넣었을 텐데 무려 3000여 명이 북적거렸다면 도대체 결혼식 한 번에 얼마를 챙겼다는 것이냐며 "내 생애 돈 내려고 그렇게 오래 서 있어보긴 처음입니다"라며 한숨 쉬었다.
나 역시 얼마 전 애경사로 섭섭한 적이 있었다. 나와 동갑인 재미교포 사업가의 모친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다. 미국에 계신 분이기에 300불 정도의 조촐한 조의금을 보냈다. 그런데 며칠 뒤 그에게도 연락을 받았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 때문에 한국에서도 장례식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유명 종합병원 장례식에서 올린 영결식에는 대통령 화환을 비롯 수많은 재벌·기업인들의 화환들이 즐비했다. 미국으로 조의금을 보냈던 나는 한 번 더 조의금을 낼 수밖에 없었다. 평소 검소하며 소박하기로 소문난 그가 아흔이 넘은 어머니를 보내드리는 장례식을 미국과 한국에서 두 차례나 화려하게 치르는 이유를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장례식 후 나는 그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그는 미국으로 곧 돌아간다며 나를 찾아왔다. "차법사, 내가 뭐 섭섭하게 한 것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나는 조목조목 화려한 장례식을 두 번이나 한 이유를 물었다. 그는 가족들의 의견에 따랐을 뿐이라며 해명했지만 나와의 오해는 풀었을망정 두 번의 장례식으로 잃어버린 인심은 어떻게 할지 걱정됐다.
내가 아는 한 지인은 공직자의 후손이지만 부친의 묘에 상석도 비석도 놓지 않는다. 공작새가 나는 터라 일제 상석과 비석을 놓지 않았다고 했지만 무엇보다 공직자 가문으로서의 검소한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였다.
"부친은 출근하시기 전에 반드시 거울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오늘 절대 남에게 자장면을 얻어먹지 않는다.'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공직자라면 반드시 애경사를 검소하게 하고 남에게 대접받지 말 것이며 자신의 부를 과시해서는 안 된다. 이 가을 애경사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자신과 남을 위해 소박·검소함을 잃지 마시길 바란다.
(hooam.com/ 인터넷신문 whoim.kr)
당신이 좋아할 만한정보
AD
당신이 좋아할 만한뉴스
지금 뜨고 있는뉴스
행사&비즈니스
많이 본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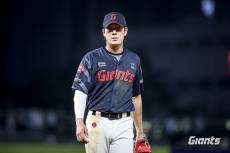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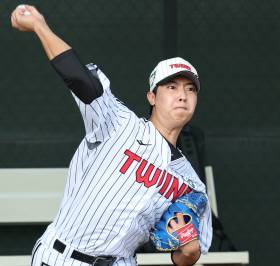

![디지털자산기본법 윤곽…스테이블코인 '인가제' 도입[only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1800612T.jpg)









![[포토] 티파니 영, 미소에 홀릭](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35.400x280.0.jpg)
![[포토] 티파니 영-이찬원, 한터뮤직어워즈 MC 맡았어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37.400x280.0.jpg)
![[포토] 티파니 영, 우아함 종결자](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34.400x280.0.jpg)
![[포토] 티파니 영, 아름다운 드레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32.400x280.0.jpg)
![[포토] 티파니 영, 사뿐사뿐](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36.400x280.0.jpg)
![[포토] 티파니 영, 공주님 들어가십니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33.400x280.0.jpg)
![[포토] 이찬원, 팬분들 사랑해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30.400x280.0.jpg)
![[포토] 이찬원, 멋진 슈트핏](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31.400x280.0.jpg)
![[포토] 이찬원, 여유로운 MC의 입장](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29.400x280.0.jpg)
![[포토] 윤종신, 18년 만에 내는 정규앨범 기대해 주세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27.400x280.0.jpg)
![[포토] 윤종신, 인자한 손인사](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28.400x280.0.jpg)
![[포토] 이창섭, 감기투혼 포즈](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25.4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