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다" 오사카 나오미, 복부 부상으로 호주오픈 3회전 기권…조코비치 400승 대업
- 베테랑에 기댄 KBO 포수진, 십년대계는 준비됐나 [IS 서포터즈]
- '집에 머물며 적절한 기회 기다린다?' 슈어저, 2007년 클레멘스·2009년 마르티네스의 길을 걷나
- H리그 부산시설공단, 3연승 질주…선두 SK 슈가글라이더즈는 4전 전승
- "재발하는 부상, 우려스럽다" NBA 스타 아데토쿤보, 종아리 문제로 4~6주 이탈
- "던질 생각 없었다, 경기 시작될 때 커피" 등판 준비에서 멈춘 야마모토의 WS 3차전 비하인드
- 지성, 박희순·손병호 연합에 맞섰다…‘판사 이한영’ 판 흔드는 정면충돌
- 아이브 리즈, 컴백 전 ‘셀폰코드’서 활약…다채로운 매력 발산
- '워니 40분 트리플 더블' 4위 SK, 최하위 한국가스공사 꺾고 시즌 20승…현대모비스도 승리
- 임영웅, 무대 밖은 이런 남친美…댄디한 매력 [IS하이컷]
야구
ML '어퍼 스윙'의 부활, 야구는 진화한다
등록2017.03.20 06:00

지난해 메이저리그의 주요 키워드는 ‘홈런’이다.
시즌 홈런 수는 5610개로 역사상 두 번째로 많았다. 2014년까지의 투고타저와 저득점 현상과는 정반대였다. 그래서 '공인구 반발력이 인위적으로 높아졌다'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지금은 스트라이크존 조정과 타자들의 적응이 홈런 증가 원인으로 꼽힌다. 변화를 이끈 것은 메이저리그에 도입된 최첨단 기술, 스탯캐스트 시스템이었다.
이 시스템은 카메라와 레이더를 이용해 투구와 타구를 더 정밀하게 포착한다. 새로운 데이터는 새로운 분석, 그리고 혁명을 이끌었다. 타자가 타석에서 노려야 할 목표가 보다 뚜렷하게 제시됐다. '타구 속도(Exit Velocity)’와 ‘타구 발사 각도(Launch Angle)’가 그것이다.
경기 결과로 타자의 능력을 평가하는 건 고전적인 방법이다. 가령 OPS(출루율+장타율) 기록으로 에릭 테임즈가 KBO 리그 최고 타자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무엇이 좋은 타자와 나쁜 타자의 차이를 만드는지는 알 수 없었다.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는 알 수 없었다.
대략 2000년대 중반부터 힌트가 나왔다. 타자 타구가 땅볼, 라인드라이브성 타구(직선타), 뜬공 등 세 가지로 분류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땅볼보다는 직선타와 뜬공 타구의 생산성이 더 높다는 게 밝혀졌다. 이와 함께 ‘강하게 맞힌 타구'일수록 결과도 좋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여기에서 1차 결론이 나왔다. 강타자가 되기 위해선 땅볼보다 라인드라이브성 타구와 뜬공을, 느린 타구보다 빠른 타구를 더 많이 만들어 내야 한다. KBO 리그에선 넥센이 인플레이타구타율(BABIP)에 주목해 '강한 타구'를 타자들에게 주문하고 있다.
2015년 스탯캐스트가 도입되자 한 단계 더 발전이 이뤄졌다. 메이저리그 모든 타구의 정확한 속도와 발사 각도값이 제공되기 시작했다. 분석가들은 두 개의 결론에 도달했다. '최적의 발사 각도'가 존재하며, '빠른 타구 속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최근 메이저리그에선 ‘배럴(Barrel)’이라는 새로운 지표가 나왔다. 5할 이상의 타율과 1.500 이상 장타율을 기록한 타구들의 집합이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타구는 속도가 시속 98마일(158km) 이상, 발사 각도는 26~30도 사이가 돼야 한다. 지난해 ‘배럴’ 타구 1위는 트리플크라운에 빛나는 특급 강타자 미겔 카브레라(33)였다.
사실 '빠른 타구'의 중요성은 스탯캐스트 이전에도 타자들이 알고 있었다. 더 강하게 공을 때리기 위해 타자들은 웨이트트레이닝을 했다. 그러나 발사 각도의 발견은 메이저리그를 지배해 왔던 스윙, 정확히는 스윙 궤적에 대한 통념을 뒤집는 계기가 됐다.
'최후의 4할 타자' 테드 윌리엄스는 어퍼 스윙을 이상적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많은 타격코치들은 이를 위험하게 여겼다. 그래서 나무 장작을 도끼로 쪼개는 듯한 다운스윙을 강조했다. 그러나 스탯캐스트 시스템의 분석 결과는 여기에 반기를 든다. 다운스윙으로는 라인드라이브성 타구는 만들 수 있어도 홈런이 되는 뜬공 타구는 칠 수 없다. 아무리 강하게 때려도 땅볼은 홈런이 될 수 없다.
데이터와 분석은 현장의 변화시켰다. LA 다저스의 저스틴 터너는 2013년까지 한 시즌 홈런 4개가 최고 기록이었던 땅볼 타자였다. 그러나 2013년 여름, 터너는 동료 말론 버드(39)의 소개로 더그 래타라는 이름의 코치를 만났다. 그의 지도를 받은 뒤 2014년 다저스의 중심타자로 만개했다. 이후 3년 동안 홈런 50개를 쳤다.
래타 코치는 ‘공을 띄워야 한다’는 철학의 소유자다. "나무를 내려찍는 듯한 스윙은 전혀 쓸모없는 생각"이라고 한다. 그뿐 아니라 41홈런을 친 강타자 조시 도날드슨, 클린트 허들 피츠버그 감독도 뜬공과 라인드라이브성 타구를 강조한다.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어퍼 스윙은 더 이상 천덕꾸러기가 아니다.
물론 골프를 치는 듯한 극단적인 어퍼 스윙은 여전히 지양 대상이다. 지금 어퍼 스윙의 지지자들이 강조하는 건 ‘살짝 올려 치는 스윙(Slightly Upper Cut Swing)’이다. 지나친 어퍼 스윙 궤적은 잦은 헛스윙, 늦은 반응속도라는 헛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과도한 어퍼 스윙 각도를 낮추는 타자들도 등장하고 있다. 2016년 내셔널리그 MVP 크리스 브라이언트도 스윙 궤적을 조정한 선수다. 브라이언트는 2015년 26홈런을 치며 신인왕에 올랐지만 삼진을 무려 199개나 당했다. 2016시즌 전 브라이언트는 소속팀, 데이터 분석 업체, 그리고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스윙을 수정했다. 그 결과 홈런 숫자는 26개에서 39개로, OPS는 0.858에서 0.939로 늘어났다. 어퍼 스윙을 유지하면서도 메이저리그 정상급의 발사 각도를 유지했다는 게 성공 이유였다. 스탯캐스트라는 최첨단 기술과 데이터 분석, 그리고 '열린 마인드'도 성공의 밑바탕이다.
2006년 이후 10년 가까이 메이저리그는 투고타저였다. 스트라이크존은 폭이 좁아지고 위아래가 길어지는 쪽으로 달라졌다. 투수들은 투심, 싱커, 커터 등 존 아래쪽을 공략하는 공을 주 무기로 삼았다. 그러자 땅볼이 늘어났다. 여기에 수비 시프트가 늘어나면서 타자들에게 ‘공 띄우기’는 생존 전략이 됐다. 2010년 연간 3천 번 수준이었던 수비 시프트 작전은 지난해 메이저리그에서 3만 번이 넘게 지시됐다.
그런데 2015년부터 메이저리그 스트라이크존의 아래쪽 경계선은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자 투심, 싱커, 커터 계열 구종에 볼 판정이 늘어났다. 여기에 타자들은 강한 어퍼 스윙으로 낮은공을 '띄우기' 시작했다. 메이저리그에서 홈런과 득점이 늘어난 시점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제 투수들도 스탯캐스트를 본다. 탬파베이는 이제 구단 차원에서 투수들에게 적극적으로 높은 패스트볼을 던질 것을 주문하고 있다. 적응과 진화를 반복하는 생태계처럼, 야구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박기태(야구공작소)
야구 콘텐트, 리서치, 담론을 나누러 모인 사람들. 야구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고자 한다.
당신이 좋아할 만한정보
AD
당신이 좋아할 만한뉴스
지금 뜨고 있는뉴스
행사&비즈니스
많이 본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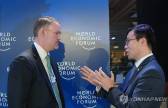








![[포토] 에이엠피 김신, 뽀뽀 쪽](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1/isp20260121000206.400x280.0.jpg)
![[포토] 에이엠피 '최장신' 김신](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1/isp20260121000207.400x280.0.jpg)
![[포토] 에이엠피 김신, 시크한 볼하트](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1/isp20260121000208.400x280.0.jpg)
![[포토] 에이엠피 크루, 푸처핸섭](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1/isp20260121000205.400x280.0.jpg)
![[포토] 에이엠피 크루, 사랑스러운 하트](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1/isp20260121000203.400x280.0.jpg)
![[포토] 에이엠피 크루, 멋진 볼하트](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1/isp20260121000209.400x280.0.jpg)
![[포토] 에이엠피 하유준, '패스' 무대 기대해 주세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1/isp20260121000204.400x280.0.jpg)
![[포토] 에이엠피 하유준, 귀엽게 브이](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1/isp20260121000202.400x280.0.jpg)
![[포토] 에이엠피 하유준, 금발로 변신](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1/isp20260121000201.400x280.0.jpg)
![[포토] 에이엠피 주환, 카리스마 작렬](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1/isp20260121000200.400x280.0.jpg)
![[포토] 에이엠피 주환, 눈빛으로 압도하는 분위기](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1/isp20260121000210.400x280.0.jpg)
![[포토] 에이엠피 주환, '패스' 피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1/isp20260121000199.4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