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치과의사 이지영, 2025 미스유니버스코리아 시즌2 진(眞) 영예
- 음저협, 포상금 청구 항소심 승소…法 “부정선거 입증 안 돼”
- 세븐틴, 10주년에도 잘 달렸다…팀X유닛 & 음악성·대중성 다 잡았네
- '6개 슛 모두 실패' 무득점에 코트 마진 -29…부상 안고 뛰었는데 '크리스마스의 악몽'
- 전현무, 진료기록부 공개 강수 불구…의료계 “병원 밖 주사 안 돼” [왓IS]
- 씨엔블루, 정규 3집 ‘쓰릴로지’ 콘셉트 포토 공개
- 인천관광공사X놀던오빠들, 대한민국국제합창대회 업무협약 체결
- 스키즈 현진, 8000만원짜리 귀걸이 분실 해프닝 “울면서 퇴근할 뻔” [왓IS]
- '2026년 운영 예산 3억5000만원' 연천 미라클 향한 아낌 없는 지원, 일구회 '적극적으로 지지'
- 이시언, 내년에 아빠 된다…♥서지승 임신 [공식]
야구
김재환이 중3 꿈나무에게 비법 전수한 사연
등록2017.08.16 06:00

"어제 TV로 보던 선수가 지금 제 눈앞에 있다는 게 실감 나지 않아요."
까까머리 중학생 야구선수는 연신 말문이 막혔다. 마치 요즘 한창 인기 있는 걸그룹 멤버라도 만난 것처럼 얼굴을 붉히며 쑥스러워했다. 고개를 숙인 채 눈조차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는 후배의 모습에 선배는 너털웃음을 지었다. 파주 금릉중 3학년에 재학 중인 포수 권순욱(15)군이 "평소 가장 좋아하는 선수"라는 김재환(29·두산)과 마주 앉은 날의 풍경이다.
일간스포츠와 조아제약㈜이 공동 제정한 '조아제약 프로야구 대상'은 지난해부터 저소득층 유소년 선수 및 야구 재단을 후원하는 '야구에게 희망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월간 MVP 수상 선수의 이름으로 매월 유소년 야구선수에게 100만원을 지원한다. 김재환은 7월 조아제약 월간 MVP로 선정됐다. 7월 20경기에 출전해 타율 0.434 9홈런 24타점을 올렸다. 타율과 홈런은 이 기간 리그 1위. 타점도 KIA 최형우, 삼성 구자욱과 공동 1위다. 월간 출루율(0.506)과 장타율(0.855) 역시 10개 구단 타자들 가운데 가장 높았다. 출루율과 장타율을 합친 OPS는 1.361에 달했다.
심지어 7월 26일 수원 kt전부터 지난 9일 잠실 한화전까지 13경기 연속 타점을 기록했다. KBO 리그 역대 최다 연속 경기 타점 기록(종전 11경기)을 갈아 치웠다. 김재환과 권군이 만난 9일은 김재환이 12경기째 연속 타점을 올려 신기록을 작성한 바로 다음 날이었다. 권군은 "처음부터 끝까지 게임을 다 보면서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다"며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했다.
김재환은 수줍어하는 권군에게 먼저 살갑게 다가갔다. "왼손이냐, 오른손이냐" "포지션은 무엇이냐" "학교에선 몇 번을 치느냐"고 차근차근 질문도 던졌다. 권군은 "오른손 타자다" "투수를 하다 팔꿈치에 핀을 고정하는 수술을 받아서 지금은 포수로 뛴다" "주로 3번과 4번을 맡는다"고 답변했다. "지금 키가 177cm다"라는 권군의 말에 "중3인데 그 정도면 엄청 큰 것이다. 나는 그때 169cm였다"고 기운을 북돋아 줬다.
한창 성장기인 권군은 요즘 키 때문에 고민이 많다. 지금은 또래보다 크지만, 혹시 이 상태에서 멈춰 버릴까 봐 걱정하고 있다. 김재환은 그런 권군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줬다. "키가 크려면 벌써부터 웨이트트레이닝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며 "나는 성장이 조금 늦은 케이스다. 중학교 3년간 7cm씩 컸고, 그러다 고등학교에 간 뒤에도 5cm씩 꾸준히 자랐다. 군대에 가서도 계속 키가 커졌다"고 했다.
학창 시절 시도해 봤던 '민간요법'도 알려 줬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지만, 부모님이 중학교 때 축구 골대 아래서 점프해 손으로 바를 찍는 훈련을 하루에 100개씩 시키셨다"고 귀띔했다. 또 "학교에 갈 때 어머니가 검은콩 두유를 들고 문앞에 서 계셨다. 맛이 없어서 내가 안 먹으려고 하면 아예 학교에 안 보냈다"며 "실제로 '재환이가 두유를 안 먹어서 학교에 못 갈 것 같다'고 전화하신 적도 있다"고 웃어 보였다.
권군은 곧 고교 진학을 앞두고 있다. 프로 선수가 되는 길목에서 가장 중요한 3년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김재환은 권군의 손을 뒤집어 손바닥을 살펴보더니 장난스럽게 혀를 끌끌 찼다. "중3 학생 손바닥이 이러면 안 된다. 굳은살이 더 박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솔직히 우리나라 중·고교 선수들이 국제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비결 중 하나는 그 시기에 다른 나라 선수들에 비해 운동을 훨씬 많이 하기 때문"이라며 "성인이 되면 신체 조건부터 외f국 선수들을 따라가기 어렵다. 어릴 땐 확실히 연습량이 많은 게 나중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했다.
주변에 야구를 잘하는 선수가 있다면 '벤치마킹'을 하는 게 좋다는 충고도 했다. 김재환은 "뱀의 머리보다는 용의 꼬리가 낫다. 잘하는 사람들을 옆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실력에 큰 도움이 된다"며 다시 한 번 학창 시절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처음 고등학교(인천고)에 가서 1년 선배였던 SK 이재원 형과 항상 캐치볼 파트너였다. 그때 내 키는 170cm밖에 되지 않았고, 형은 이미 키 185cm에 몸무게가 100㎏ 가까이 나갈 때였다"며 "캐치볼할 때 나는 죽을 힘을 다해 던지는데, (이)재원이 형은 가볍게만 던져도 공이 '퍽퍽' 하고 날아오는 거다. 그래서 밸런스를 맞추려고 나도 따라 하다 보니 함께 (실력이) 늘었다. 그 후로 재원이 형이 하는 건 다 따라 했다"고 귀띔했다.
이어 "나는 두산처럼 잘하는 선수들이 많은 팀에서 뛴 게 내게 분명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정말 잘하는 선배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 봐야겠다'는 마음으로 따라 하다 보면 자기만의 것이 생긴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권군은 "우와" 하는 감탄사를 곁들이면서 김재환의 한마디, 한마디를 머릿속에 새겼다.
권군은 미래가 기대되는 유망주다. 이미 팀에서 중심타자를 맡는 데다, 시속 130㎞가 넘는 공을 던지던 투수 출신 포수라 도루 저지에 강점도 있다. 2학년이던 지난해 경기도협회장기 중학야구대회에서 타율 0.750를 기록해 타격상도 받았다. 게다가 가족도 야구에 조예가 깊다. 아버지가 권혁돈 전 신일중 감독이다. 필라델피아 김현수와 KIA 나지완이 신일중 시절 권 감독의 제자였다. 권 감독은 "정말 소중한 기회다. 이렇게 프로에서 성공한 선배에게 직접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되겠느냐"며 고마워했다.
내내 쑥스러워하던 권군은 헤어질 시간이 되자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김재환 선배님 덕분에 장학금도 받고 이렇게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정말 감사하다. 더 훌륭한 선수가 되시기를 응원하겠다"는 인사를 건넸다. 김재환도 "앞으로 부상만 당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기회가 되면 함께 야구를 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김재환과 권군 모두에게 뜻깊었던 만남.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았지만 여운은 오래 남았다.
배영은 기자
사진=두산 제공
당신이 좋아할 만한정보
AD
당신이 좋아할 만한뉴스
지금 뜨고 있는뉴스
행사&비즈니스
많이 본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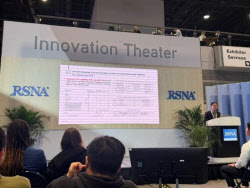










![[포토] 영케이, 귀여운 손인사](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25/isp20251225000212.400x280.0.jpg)
![[포토] SBS 가요대전 3MC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25/isp20251225000213.400x280.0.jpg)
![[포토] 엔시티 드림, 백마 탄 왕자님들 여기 다 모였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25/isp20251225000209.400x280.0.jpg)
![[포토] 엔시티 드림 마크, 귀엽게 팔 흔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25/isp20251225000211.400x280.0.jpg)
![[포토] 아이브 장원영, 눈맞춤에 심쿵](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25/isp20251225000207.400x280.0.jpg)
![[포토] 아이브 장원영, 럭키비키 워킹](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25/isp20251225000206.400x280.0.jpg)
![[포토] 아이브, 산타걸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25/isp20251225000208.400x280.0.jpg)
![[포토] 아이브 안유진, 아름다운 드레스 자태](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25/isp20251225000205.400x280.0.jpg)
![[포토] 스트레이 키즈, 멋진 무대 기대해 주세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25/isp20251225000204.400x280.0.jpg)
![[포토] 스트레이 키즈 필릭스, 왕자님 비주얼](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25/isp20251225000200.400x280.0.jpg)
![[포토] 스트레이 키즈 현진, 시크한 손인사](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25/isp20251225000203.400x280.0.jpg)
![[포토] 에이티즈 산, 멋진 손인사](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25/isp20251225000201.4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