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허웅 51점 대폭발' KCC, SK에 대승...허웅은 신기록 잔치 [IS잠실]
- 박지수 23점 17R…KB, BNK 격파하고 5연승
- “죽도록 보고싶어” 그리움 절절…故서희원 1주기, 구준엽 친필 편지+조각상 제작 [종합]
- 구준엽, 故서희원 1주기 절절한 그리움…”한없이 눈물, 죽도록 보고싶어” [전문]
- 류현진, ♥배지현에 적극 플러팅…”美서 쉬지 않고 연락” (‘짠한형’)
- “계속 바뀌는데 무슨 사랑이냐”…황재균, ‘아나운서 킬러’ 시절 소환 ‘당황’ (‘짠한형’)
- [왓IS] K팝 최초 그래미 수상…‘유퀴즈’도 “’케데헌’, 진심으로 축하”
- 전희철 SK 감독, "다들 다니엘 이야기만...에너지 레벨 높은 상승세 원동력 맞다" [IS잠실]
- 나란히 걷는 '동희즈'...거인 군단 진격 부스터 [IS 타이난]
- [IS하이컷] ‘강철부대W’ 곽선희, 동성 연인과 로맨틱 순간…웨딩화보 추가 공개
스포츠일반
인터뷰는 수사가 아니다
등록2018.02.21 06:00

지난해 8월, 2018 러시아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예선 A조 한국- 이란전이 치러졌다. 6만 관중이 외치는 "대~한민국!"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경기는 0-0으로 끝났다.
이날, 말 한마디로 오천만 한국인의 '적'이 된 선수가 있었다. 대표팀 주장 김영권(28·광저우 에버그란데)이다. 인터뷰에서 "경기장 안에서 관중의 함성이 워낙 커서 선수들과 소통이 힘들었다"면서 "소리를 질러도 잘 들리지 않았다. 계속 연습해 왔던 것들을 제대로 펼치지 못해 답답했다"고 얘기했다. 무승부를 관중의 응원 소리 탓으로 돌리는 듯한 발언이었다. 이에 대표팀을 응원하던 국민들은 뿔이 났다. 김영권에게 비난이 폭주했고 결국 그는 울먹이며 "나쁜 의도는 없었다. 내 발언에 화난 분들께 죄송하다"고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뷰는 특히 그렇다. 습관처럼 경기 소감을 말하고 지나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 마이크 앞에 서서 인터뷰하는 선수 개개인의 말속에는 그 자신은 물론이고 팀이나 지도자, 더 나아가 종목 자체에 대한 방향성이 담겨 있다. 말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펼쳐 놓냐가 중요한 이유다. 나라를 대표해 태극마크를 달고 있는 '국가대표'라면 두말할 것도 없다. 자신이 뱉는 말 한마디에 얼마나 큰 무게감이 있는지 알아야 한다. 경기장 안에서 인생을 펼치는 선수들에게 인터뷰는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창구 중 하나다.
종종 이 사실을 잊은 듯한 선수들이 보인다.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의 김보름(25·강원도청)과 박지우(20·한국체대) 얘기다.
경기를 마친 뒤에 마지막 주자인 노선영(29·부산 콜핑)에게 화살을 돌리는 듯한 이들의 발언이 문제가 됐다. 김보름은 "중반까지는 경기를 잘하고 있었지만, 뒤(노선영)에서 우리와 격차가 벌어지면서 기록이 조금 아쉽게 나온 것 같다"고 했다. '앞에 있던' 자신과 박지우는 '뒤따라오던' 노선영과 달리 좋은 기록을 유지했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박지우 역시 "작전 실패다. 한 사람(노선영)이 뒤로 처질 것이라는 걱정을 미리 하긴 했다"면서 "기록을 단축해 보려고 애썼는데, 이렇게까지 격차가 벌어질 줄은 몰랐다"고 했다. 명백하게 한 사람에게 패인을 떠넘겼다. 이게 과연 '대한민국 국가대표'의 공식 인터뷰인가.
프랑스 알파인스키대표팀은 '말조심'하지 않은 한 자국 대표 선수 마티외 페브르(26)를 쫓아냈다. "언론을 상대로 팀 정신에 맞지 않은 발언을 했다"는 이유다. 페브르는 18일 남자 대회전에서 7위에 오른 뒤 "상위 7명 안에 프랑스 선수 4명이 포함됐다"는 질문을 받았다. 그러자 "나는 오직 나를 위해 이곳에 경기하러 왔다"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고 "결과에 넌더리가 난다. 난 월드컵 8위가 최고 성적인 선수다. 기적을 바라지 말라"는 말도 했다. 페브르는 예정됐던 팀 이벤트 출전자 명단에서 제외된 채 불명예스럽게 올림픽을 마쳤다.
강릉= 김희선 기자
당신이 좋아할 만한정보
AD
당신이 좋아할 만한뉴스
지금 뜨고 있는뉴스
행사&비즈니스
많이 본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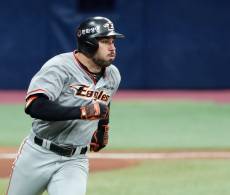















![[포토]채수빈, 호기심 발동!](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1/isp20260201000212.400x280.0.jpg)
![[포토]채수빈, 작은 얼굴에 '도대체 몇등신이야?"](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1/isp20260201000211.400x280.0.jpg)
![[포토]채수빈, 미소로 주위를 밝히는 마법 시전](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1/isp20260201000207.400x280.0.jpg)
![[포토]채수빈, 수줍은 미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1/isp20260201000206.400x280.0.jpg)
![[포토]채수빈, 눈빛만으로 '분위기 여신'](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1/isp20260201000204.400x280.0.jpg)
![[포토]채수빈, 현실감 떨어지는 비율](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1/isp20260201000203.400x280.0.jpg)
![[포토]채수빈, 청순함 가득 담아 '하트'](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1/isp20260201000202.400x280.0.jpg)
![[포토]채수빈, 오늘은 하트 요정](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1/isp20260201000201.400x280.0.jpg)
![[포토]채수빈, 하트 더하기 애교](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1/isp20260201000200.400x280.0.jpg)
![[포토]채수빈, 팬들 선물에 함박미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1/isp20260201000199.400x280.0.jpg)
![[포토]채수빈, 청순 하트](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1/isp20260201000198.400x280.0.jpg)
![[포토]이주빈, 날씨만큼 화사한 출국길](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1/isp20260201000182.4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