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김수로, 故안성기에 마지막 인사 “대한민국 배우들에 최고의 귀감”
-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정부, 故안성기에 금관문화훈장 추서
- 신동엽 “아내 선혜윤 PD, ‘어떤 어른들은 오빠도 재혼인 줄 안다’고” (‘짠한형’)
- “함께 해 영광이었습니다”…송선미, ‘미술관 옆 동물원’ 故안성기 스틸컷 공개
- 정보석, 故 안성기 추모 “배우로서 길라잡이 돼 주신 큰 스승님”
- ‘충격 속보’ 맨유, ‘구단 저격’ 아모링 감독과 14개월 만에 결별
- 이영애, ‘김건희 친분설’ 주장 유튜버 상대 손배소 2심 취하 [왓IS]
- 서울E, ‘경영 전문가’ 우상배 신임 대표이사 선임 “이제는 결과를 만들 시점” [공식발표]
- 몬스타엑스 주헌 “2년 8개월 만의 솔로 컴백…미쳐야 빛나죠”[일문일답]
- '돌격대장' 황유민, 매드캐토스 옷 입고 세계 무대 누빈다
무비위크
[인터뷰③] 변혁 감독 "촌스러운 결말? 어정쩡함의 미덕"
등록2018.09.16 15:30

변혁 감독(52)이 돌아왔다. '오감도(2009)' 이후 꼬박 10년 만이다. 첫 영화 '인터뷰(2000)'를 만들고 개봉시킬 때만 해도 모든 것을 '뻔뻔하게' 받아 들였다는 변혁 감독은 "걱정되고, 긴장되고, 책임감도 느끼고, 그래서 두렵다"는 속내를 조심스레 털어놨다. 긴 세월 제작 환경이 바뀐 탓도 있겠지만 결국 '눈 높아진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느냐'가 감독으로서는 가장 큰 목표이자 우려였다.
10년 만 복귀작으로 택한 '상류사회'는 15일까지 75만 명을 누적, 100만 명을 채 동원하지 못한 채 흥행에 실패했다. 개봉 전부터 문제작으로 이슈화 된 '상류사회'는 영화가 전하는 메시지보다 일부 장면에 대한 불편함과 불쾌감이 더 주목 받으면서 선입견에 휩싸이기도 했다. 작품을 선택하고 열연한 배우들에게, 그리고 영화를 기다리고 기대했던 관객들에게도 모두 아쉬운 결과다.
하지만 변혁 감독이 그리고자 했던 '상류사회'의 지향점은 명확했다. 그에 따른 관객들의 평도 겸허히 받아 들이겠다는 마음이다. 흥행 여부를 떠나 자신이 만든 영화임에도 주제 의식에 대한 흔들림을 보이거나, "영화를 잘못 봤다"며 관객들과 기싸움을 하려는 일부 감독들과는 분명 다른 태세전환이다. 변혁 감독은 개봉 전 고(故) 이은주 관련 루머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표했다. 자신이 아닌, 영화에 참여해준 이들을 위한 결정이었다. 작심한 컴백은 조용히 마무리 될 전망. 차기 행보는 미정이다.
※②에서 이어집니다.

- 첫인상이 주는 느낌이 있다.
"제목을 정할 때부터 염두했던 부분이다. '이 영화를 소개하는 첫 이미지가 뭔가' 고민하게 되더라. '상류사회'라고 하면 '어떤 류의 영화겠구나' 딱 떠오르는 그림이 있지 않나. 결국 그렇게 흘러간 것 같기도 하고…. 첫인상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다. 첫인상으로 그 다음을 평가받게 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더 아쉽다."
- 10년만의 컴백작을 '상류사회'로 택한 이유가 있다면.
"내 관심은 항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쏠려 있었다. 그럼 웬만하면 내가 직접 쓴 글을 연출하고 싶고,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된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걸린다. 사실 '상류사회'는 '자유부인'이라는 60년대 영화를 베이스로 한 현대무용 공연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다. 그 공연을 내가 연출했다. 굳이 첫번째 동기를 찾으라면 거기에서부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 다른 작품은 생각하지 않았나.
"뒤돌아보니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흘렀더라.(웃음) 단편보다 장편은 시간이 더 걸리지 않나. 엄두를 못 내고 있다가 3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다. 공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 했고, 부부 이야기로 확장 시켰다. 시나리오 작업에, 촬영, 편집까지 마치니 꼬박 3년이 걸렸다."
- 독특한 부부가 탄생했다.
"한 캐릭터, 내지는 한 가치관을 내가 선택해 영화로 만들게 되면 어떤 관객들은 동의하고, 어떤 관객들은 배척한다. '두 가치관의 대립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부부 사이에 대립이 있다 합의점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했다. '클린턴 되고 나서 이야기 하자' 그 대사가 모든 것을 설명하고 표현해 준다고 생각한다. '대학에 들어간 후에, 취업한 후에'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지 않나. 어떻게 보면 이 사회는 그 힘으로 이끌어 진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렇게 달릴 땐 '도덕적 문제나 불합리함은 참고 가자'는 마음도 생기기 마련이다."
- 누구에게나 이중성은 있기 마련이다.
"유효한 가치관이다. '개같이 사느니 칼에 맞아 죽겠어'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있지 않나. 정의로운 목소리에 의해 사회가 바뀌고 세상을 바꾸는 힘이 생기기도 한다. 하지만 각자가 살아가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는 '그래, 훌륭한 일은 저 분들에게 하라고 하고 우리는 우리 일 하자'는 목소리도 커진다. 동시에 표현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그걸 어떻게 정리될 수 있는지가 고민이었다. '상류사회' 속 부부는 끝내 자존심을 택한다. 같은 상황에서 몇 %가 그런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적이면서도 현실적이지 않은 우리의 선택이 때론 옳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 수애의 독백 장면이 꽤 길게 연출됐다.
"6분 정도에 해당한다. 엄청 길다. 체감상은 길게 느껴지지 않기를 바랐다. 영화를 보다가 주인공이 갑자기 연설을 하면 오글거리지 않나. '아, 이 영화 이제 끝나는구나. 이쯤에서 박수치고 울어야 하는구나' 싶기도 하고.(웃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마지막까지 고민했는데 수애 씨가 설득력있게 소화해 주면서, 순간의 설득력을 보여 준 것 같다. 수애 씨는 촬영 직전까지 힘들어 하다가 카메라가 돌면 언제 그랬냐는 듯 연기한다. 배우의 열연을 보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다'고 타협했다."
- 엔딩 변화도 없었나.
"좀 촌스러운 결말 같기도 하다. 하하. 결국 '그래도 옳을 일을 하자!'는 것 아닌가. 어떤 의미에서는 고전적으로 볼 수 있고. 선을 지키면서 오수연과 장태준이 매력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굉장히 영화적인 결말이라 피하고 싶은 욕심도 있었지만 우리 영화와 가장 어울리는 결말 같기도 하다. 어정쩡함의 미덕이랄까?(웃음)"
- 개봉 전 고(故) 이은주 루머와 관련 악플러들을 고소했다. 풀고 싶은 오해가 있다면.
"글쎄. 오해나 억울함 보다는 미안한 마음이 커 액션을 취했다. 어떤 삶, 일들에 대해서는 분명 손해를 보기도 했고, 억울한 적도 있었지만 '나 억울하다' 따질 마음은 없었다. (루머 내용이) 너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라 오히려 현실감이 없기도 했다. 역으로 그 피해로 인해 덕을 본 적도 있다. 하지만 내가 연관된 일로 인해 정당한 평가에 누를 끼치고, 작품에 대한 주목도가 바뀌고,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 생각했다. 내 억울함 보다는 미안함 때문에 결정한 고소다. 때문에 (작품·고 이은주를 위해서라도) 가급적으로 언급이 안 되면 좋겠다는 마음이다."
- 차기작은 또 오래 기다려야 할까.
"아마도 당장은 힘들지 않을까 싶다. 관심있는 소재가 있고, 준비 중인 것들도 있지만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지 않나. 나 조차도 당장 내일의 나를 모르니까. 좋은 작품이 있다면 찾아뵙게 될 것 같다."
조연경 기자 cho.yeongyeong@jtbc.co.kr
사진=박세완 기자
당신이 좋아할 만한정보
AD
당신이 좋아할 만한뉴스
지금 뜨고 있는뉴스
행사&비즈니스
많이 본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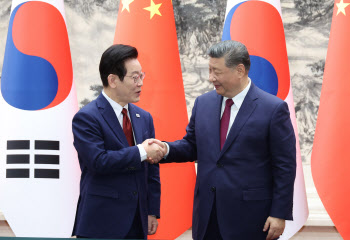











![[포토] 아이덴티티 예스위아, 사랑해 주세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05/isp20260105000268.400x280.0.jpg)
![[포토] 아이덴티티, 멋지게 포즈 취하는 유네버멧](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05/isp20260105000264.400x280.0.jpg)
![[포토] 아이덴티티 유네버멧, 귀엽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05/isp20260105000269.400x280.0.jpg)
![[포토] 아이덴티티, 유네버벳과 예스위아](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05/isp20260105000267.400x280.0.jpg)
![[포토] 아이덴티티, 두 유닛의 합체](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05/isp20260105000266.400x280.0.jpg)
![[포토] 아이덴티티, 훈남들 여기 다 모였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05/isp20260105000265.400x280.0.jpg)
![[포토] 아이덴티티, 멋진 엔딩](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05/isp20260105000260.400x280.0.jpg)
![[포토] 아이덴티티, 화려한 무대 구성](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05/isp20260105000255.400x280.0.jpg)
![[포토] 아이덴티티, 화려함의 끝판왕](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05/isp20260105000257.400x280.0.jpg)
![[포토] 아이덴티티, 힙함 가득한 무대](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05/isp20260105000259.400x280.0.jpg)
![[포토] 아이덴티티, 강렬한 분위기](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05/isp20260105000258.400x280.0.jpg)
![[포토] 아이덴티티, 푸쳐핸섭](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05/isp20260105000256.4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