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TVis] 엄지원, 피부 관리법 “바늘로 혀 뚫어…어혈 뺄 때 쾌감” (라디오스타)
- [TVis] 김조한 “‘케데헌’ 사자보이즈 에이전트…조건 너무 깐깐해” (라디오스타)
- [TVis] 명예영국인 “英 인종차별, 미국과 달라…기분 나빠” (라디오스타)
- ‘권태성 해트트릭’ 아주대, 용인대 4-0 완파…한산대첩기 8강 안착
- [TVis] 엄지원, 눈물의 대상 소감에 “망했다 싶었다” (라디오스타)
- “엄마 이거 AI 아니야” 방탄소년단 RM, 母도 못믿는 운전 실력
- [TVis] ‘가족 절연’ 심형탁 “子 하루, 좋은 엄마 만나 행복” 눈물 (슈돌)
- “황당한 해프닝”…노진원, ‘AI 여친’ 논란 자처 후 해명 [왓IS]
- 中도 스노보드서 금메달 가뭄 끝냈다…생일 맞은 쑤이밍, 남자 슬로프스타일 정상[ 2026 밀라노]
- [2026 밀라노] 이의진-한다솜, 크로스컨트리 스키 팀 스프린트 결선행 좌절
스포츠일반
[IS 핸드볼피플] '슈퍼루키' 박광순의 동반자, 친구 정재완과 어머니
등록2018.12.24 06:00

지긋지긋한 부상에 시달렸다. 양쪽 발목이 교대로 말썽을 부렸다. 한 번 다칠 때마다 '이제 정말 그만 두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박광순(22·하남시청)은 그럴 때 "엄마를 생각하면 버티게 됐다"고 했다.
그는 2018~2019 SK 핸드볼 코리아리그에 화려하게 데뷔한 특급 신인이다. 남자부가 팀당 8경기씩 마친 상황에서 67골을 넣어 득점 단독 1위에 올라 있다. 2위 최현근(52골·상무피닉스)과 무려 15점 차이가 난다. 그 정도로 이 신인 선수의 활약이 대단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핸드볼 코트 밖의 박광순은 '슈퍼 루키'라는 으리으리한 타이틀 하나만으론 설명할 수 없는 선수다. 암초로 가득했던 고난의 여정을 묵묵히 이겨 내며 여기까지 왔고, 아직 걸어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다. 그는 이제 본격적으로 날개를 펼칠 채비를 막 마쳤을 뿐이다.
방황과 부상을 이겨 내고 '슈퍼 루키'가 되기까지
핸드볼을 처음 시작한 것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전국의 수많은 초등학교 가운데 운명적으로 핸드볼 명문인 진천 상산초를 다녔다. 게다가 늘 같이 놀던 친구는 핸드볼부 소속이었다. "너도 같이해 보자"는 말에 호기심이 생겼다가 곧 푹 빠져 버렸다.

세상의 수많은 유사 사례처럼, 원래 핸드볼을 하던 친구 대신 '친구를 따라간' 박광순이 선수로 끝까지 남았다. 어린 시절부터 운동신경이 남달랐고, 무엇보다 핸드볼이 너무 좋았기 때문이다. 박광순은 "어머니는 운동이 힘들다고 처음엔 반대를 많이 하셨다. 하지만 그때는 너무 재미 있어서 내가 하겠다고 우겼다"며 "결국 '그렇게 하고 싶으면 열심히 해 보라'는 승낙을 받았다"고 했다.
그렇게 신나게 운동하던 그는 중학교에 진학한 뒤 갑자기 유니폼을 벗겠다고 선언했다. 이번에는 어머니가 말렸다. 아들은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다. "사춘기가 찾아오면서 갑자기 운동을 하기 싫어졌다. 엄마가 많이 속상해하셨는데, 그래도 고집을 부렸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중학교 3학년이 되자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현실적 고민이 찾아왔다. 남들보다 어린 나이에 미래를 결정해야 하는 갈림길에 섰다.
결론 내기가 어렵지 않았다. 핸드볼을 쉬는 2년 동안 키가 20cm 넘게 자라 있었다. 무엇보다 '가장 좋아하는 것'과 '가장 잘하는 것'이 모두 핸드볼이라는 데 생각이 미쳤다. 다시 공을 잡았다.
고난은 그때부터 시작됐다. 한창 몸과 기량이 성장하는 시기에 2년 동안 쉬었더니, 공백을 메우기가 쉽지 않았다. 최대한 빨리 몸을 만들기 위해 무리하다 발목 부상이 찾아왔다. "쉬는 동안 운동을 안 하면서 살이 많이 쪘고, 체력적으로도 힘에 부쳤다"며 "부상도 쉼없이 이어졌다. 고등학교 입학 이후 2년 동안 계속 다치기만 한 것 같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몸만큼 마음도 힘들었다. 그래도 이겨 냈다. "다칠 때마다 운동을 정말 그만두고 싶었다. 재활도 힘들었고, 재활 이후 다시 복귀할 때도 너무 힘들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자꾸 엄마 생각이 났다"고 털어놓았다. 어머니는 어린 시절부터 혼자 힘으로 두 남매를 뒷바라지했다. 아들은 그런 어머니에게 힘이 되고 싶었다. 버티고 또 버텼다.
학창 시절 내내 통증을 참고 뛰었던 그는 대학 진학 이후에야 수술대에 올랐다. 양쪽 발목을 한꺼번에 수술받았다. 부상으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스로 내린 결정이었다. 한동안 휠체어에 의지해야 했고, 치료가 끝난 뒤에도 고통은 엄청났다. 그는 "재활이 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운동을 다시 시작해 많이 힘들었다. 그떄는 내가 욕심이 참 많았던 것 같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그래도 그 수술한 덕분에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던 '발목 부상'과 홀가분하게 이별했다. 부상이 지나간 자리에는 뜻하지 않은 훈장도 남았다. "부상을 극복하려면 근력을 더 보충해야 한다. 웨이트트레이닝을 정말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다"며 "안 다치려고 신경 쓰다가 덩달아 체력이 좋아진 셈"이라고 했다. 박광순의 특장점으로 꼽히는 '파워'는 그렇게 완성됐다.
성공 드라마가 마침내 시작됐다. 친구들과 힘을 합쳐 경희대를 대학 무대의 최강자로 이끌었다. 주니어 대표팀부터 대학 대표팀, 성인 대표팀까지 두루 거치면서 또래 선수들에 비해 국제 대회 경험도 많이 쌓았다. 2020 도쿄올림픽에서 한국 남자 핸드볼 국가대표팀의 주축이 될 선수로 벌써부터 거론되고 있다.

◇'영혼의 단짝' 정재완을 만나다
박광순의 핸드볼 인생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영혼의 콤비'도 만났다. 하남시청에서 한솥밥을 먹고 있는 동갑내기 정재완(22)이다. 둘은 그야말로 '운명'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사이다. 상산초등학교-진천중학교-청주공업고등학교-경희대를 모두 함께 다녔고, 실업 팀에서도 같은 유니폼을 입게 됐다. 박광순은 "(정)재완이와 나는 한마디로 '세트'라고 보면 된다"며 웃었다.
박광순이 코트 중앙에서 팀 공격을 리드하는 센터백이라면, 정재완은 상대 선수들과 몸싸움을 벌이면서 백 플레이어들에게 슛할 기회와 공간을 열어 주는 피봇이다. 하도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추다 보니 이젠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서로의 플레이를 잘 안다. 시너지 효과도 엄청나다.
핸드볼을 2년간 쉰 데다 부상으로 공백도 잦았던 박광순에게 가장 큰 자극을 안겨 준 존재도 바로 정재완이다. 박광순은 "한동안 쉰 뒤 돌아와 보니 재완이의 실력이 엄청나게 좋아졌다"며 "누구한테든 지는 걸 싫어한다. 친구가 너무 잘하니까 그보다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다 저절로 실력이 늘었다. 내게 정말 좋은 동기부여가 됐다"고 웃어 보였다.
어린 시절에 서로에게 느꼈던 라이벌 의식은 세월이 흐르면서 동지애로 변했다. 박광순은 "지금 우리는 그냥 '동반자' 같은 느낌"이라고 했다. 실제로 그들은 가장 찬란했던 순간을 모두 공유한 친구자 동료다. 최고의 팀워크를 자랑하는 경희대에서 함께 뛰며 대학 무대를 평정했던 일과 지난 8월 크로아티아에서 열린 세계대학핸드볼선수권대회에 함께 출전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순간 등은 박광순이 "가장 좋았던 기억"이라고 떠올리는 장면들이다.
승부욕이 강한 박광순은 하남시청에서도 '정상'을 꿈꾼다. 올해 창단해 SK 핸드볼 코리아리그에 처음 합류한 하남시청은 여자 핸드볼의 '우생순' 신화를 일군 임영철 감독이 사령탑을 맡고 있다. 임 감독의 트레이드마크인 '지옥 훈련'은 하남시청에서도 다르지 않다. 그래도 그는 다 이겨 낼 준비가 돼 있다. "대학교 때도 훈련을 많이 했다. 어차피 '훈련'은 어디서 어떻게 하든 다 힘들다"며 "그렇게 좋게 생각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다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하남시청이 '신생팀치고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 것에도 만족해하지 않는다. 그는 "우리(나와 정재완)는 욕심이 많다. 대학교 때 만날 1등만 했으니, 실업 리그에 와서도 1등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남자부는 최강팀 '두산'의 벽이 여전히 높지만 "경희대 시절 전국체전에서 두산을 만나 비긴 전력이 있다. 올 시즌에도 한 번쯤 우리팀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자신감을 표현했다.

이제 스물두 살. 박광순의 핸드볼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하남시청에 입단하자마자 팀의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는 그는 "감독님이 기회를 많이 주시니, 그 기회를 잘 잡으려 한다"고 했다. 첫째 목표는 "앞으로 부상 없이 뛰는 것"이지만 "욕심을 내 보자면 올 시즌 신인왕에 오르고 싶다"는 바람도 털어놓았다.
'혼자 신인왕이 되면 친구(정재완)가 서운해하지 않겠냐'고 짓궂은 질문을 던졌다. 의젓한 대답이 돌아왔다. "나는 공을 많이 만지는 포지션이고 재완이는 내게 도움을 주는 포지션이니, 어차피 재완이 없이는 나도 신인왕을 받을 수 없다." 사실상 둘이 같이 받는 상이라는 의미다.
배영은 기자
사진=양광삼 기자
당신이 좋아할 만한정보
AD
당신이 좋아할 만한뉴스
지금 뜨고 있는뉴스
행사&비즈니스
많이 본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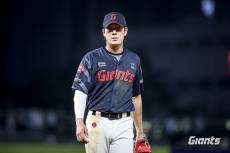




![디지털자산기본법 윤곽…스테이블코인 '인가제' 도입[only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1800612T.jpg)









![[포토] 티파니 영, 미소에 홀릭](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35.400x280.0.jpg)
![[포토] 티파니 영-이찬원, 한터뮤직어워즈 MC 맡았어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37.400x280.0.jpg)
![[포토] 티파니 영, 우아함 종결자](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34.400x280.0.jpg)
![[포토] 티파니 영, 아름다운 드레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32.400x280.0.jpg)
![[포토] 티파니 영, 사뿐사뿐](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36.400x280.0.jpg)
![[포토] 티파니 영, 공주님 들어가십니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33.400x280.0.jpg)
![[포토] 이찬원, 팬분들 사랑해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30.400x280.0.jpg)
![[포토] 이찬원, 멋진 슈트핏](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31.400x280.0.jpg)
![[포토] 이찬원, 여유로운 MC의 입장](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29.400x280.0.jpg)
![[포토] 윤종신, 18년 만에 내는 정규앨범 기대해 주세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27.400x280.0.jpg)
![[포토] 윤종신, 인자한 손인사](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28.400x280.0.jpg)
![[포토] 이창섭, 감기투혼 포즈](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25.4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