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후크라이는 이제 그만' 선발 2연승, 삼성 후라도 "예전 순위로 돌아갔으면" [IS 스타]
- '벌써 세 번째' 최원준의 수비 불안, 만만하게 볼 '문제' 아니다…모두 실점과 연결 [IS 포커스]
- 신현준, 오세훈 서울시장 만났다 “명예시장들과 다양한 이야기”
- 하이라이트, 팬클럽 개인정보 유출… 소속사, 3주 만에 “진심으로 사과” [공식]
- 풍자, 홀쭉해진 근황 공개… “느슨한 다이어트”
- [TVis] ‘제이쓴♥’ 홍현희, 치앙마이 이민설?… 그럴만한 비주얼 (‘라스’)
- [TVis] 백지연, 목주름 성형 의심받아… “수술했는지 확인해보라는 이야기도…” (‘라스’)
- [TVis] 선우용녀, 200억 상당의 빚 있었다 “보증인 줄 모르고 도장 찍어” (‘유퀴즈’)
- [TVis] 이정진, 재산 어마어마하네… “전세금 20억→주식 5억” (‘신랑수업’)
- 신시아, 앤드마크와 이달 말 전속계약 종료 “앞으로의 길 응원” [공식]
야구
롯데, 암흑기 이후 최소관중? 성적·흥행 참패
등록2019.09.05 06:00

롯데의 올해 홈 관중이 2000년대 초반 암흑기 이후 최저치로 떨어질 전망이다.
롯데는 3일 사직 삼성전까지 홈에서 61경기를 치른 가운데 총 관중 64만1075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경기 수 대비 18%나 감소한 수치다.
경기당 평균 관중을 고려하면 산술적으로 총 관중 75만6648명을 불러들일 수 있다. 이 경우 2006년 44만1133명(7002명) 이후 총 관중과 경기당 관중 모두 최소 규모를 기록하게 된다. 개막 전에 제시한 100만 관중 목표에 한참 모자란 수준이다.
롯데는 2000년대 초반 암흑기를 보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 연속 최하위(8위)에 처졌고, 경기당 관중 역시 6069명(총 40만573명)-1910명(12만7995명)-2284명(15만722명)-4590명(30만7537명)으로 성적과 흥행 모두 처참했다. 이듬해 5년 포스트시즌 진출 싸움을 하며 전년 대비 2배 이상 오른 65만2475명의 관중을 기록했으나, 2006년 총 관중은 44만1133명으로 사직구장을 찾는 팬들의 발걸음이 다시 줄었다. 그래도 2007년 이후 적게는 경기당 평균 1만1124명, 많게는 2만1901명의 관중을 기록했다.
연도별 경기 수에 차이가 있어 총 관중보다는 경기당 평균 관중을 비교하는 것이 관중 추이를 좀 더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다.
자칫 올해 경기당 평균 관중이 1만명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위기가 닥쳤다. 홈에서 남겨둔 11경기에서 입장 관중이 7만8924명 이하로 떨어지면 경기당 관중이 1만명 미만 수준으로 떨어진다. 지난 3일 홈에서 열린 삼성전은 궂은 날씨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이번 시즌 사직구장 최소 관중을 기록했다. 이날 고작 2390명이 야구장을 찾았다. 4일 경기에서도 올해 사직구장 두 번째 최소관중인 3551명에 그쳤다.
특히 롯데의 후반기 경기당 평균 관중은 5894명(15경기 8만8419명, 울산 3경기 포함)으로 뚝 떨어졌다. 1만 관중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롯데 입장에서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KBO가 잔여 경기를 편성하면서 상대적으로 관중 유입에 유리한 추석 연휴 및 금토 경기를 사직구장에 많이 배정했다는 점이다.
관중의 바로미터는 성적이다. 팀 성적이 좋으면 관중이 늘어나고, 반대로 성적이 부진하면 팬들의 발걸음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롯데는 5년 연속 포스트시즌에 진출한 2008~2012년 매 시즌 100만 관중을 가볍게 돌파했고, 5년 만에 다시 가을야구 무대를 밟은 2017년 역시 100만 관중을 넘어섰다. 이번 시즌 롯데는 개막 초반부터 하위권으로 처졌고, 이후 반등하지 못한 채 경기력이 형편없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롯데의 관중 감소를 단순히 최하위로 처진 성적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평가가 많다. 외국인 선수 교체와 계약 등에 있어 프런트가 보여준 행보, 야구의 날 행사에 이대호의 참석 논란 등의 팬 서비스, 상대 팀 선수의 부상을 야기한 시설물 관리 미흡 등 여러 측면에서 논란과 아쉬움을 보였다. 이런 요소 들이 팀 전력과 분위기를 저하시키고, 결국 성적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낳는다. 시즌 내내 롯데에 희망적인 이야깃거리는 좀처럼 없었다.
부산을 연고지로 두고 있어 흥행 참패는 더욱 아쉬운 대목이다. 수도권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인 부산은 '구도(球都)'로 통할 만큼 가장 열성적인 응원 문화와 팬층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팀 성적이 바닥에서 헤매고 있고, 각종 논란 속에 계속 아쉬움을 낳으면서 팬들이 발걸음이 떠나고 있다. 수 십 년째 팬들의 기대감을 제대로 채워주지 못하고 있는 롯데다.
이형석 기자

당신이 좋아할 만한정보
AD
당신이 좋아할 만한뉴스
지금 뜨고 있는뉴스
행사&비즈니스
많이 본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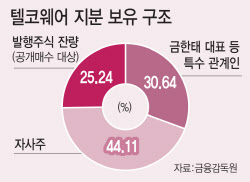









![[포토] 박철우 코치, 스포츠마케팅 써밋 아카데미 강의](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5/21/isp20250521000380.400x280.0.jpg)
![[포토] 박철우 코치, 오늘은 강단에서](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5/21/isp20250521000379.400x280.0.jpg)
![[포토] 박철우 코치, 진지한 명강의](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5/21/isp20250521000378.400x280.0.jpg)
![[포토] 박철우 코치, '제2의 김연경은 나올 수 있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5/21/isp20250521000377.400x280.0.jpg)
![[포토] 열강중인 박철우 코치](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5/21/isp20250521000376.400x280.0.jpg)
![[포토] 강단에 선 박철우 코치](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5/21/isp20250521000375.400x280.0.jpg)
![[포토] 박철우 코치, 오늘은 명강의](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5/21/isp20250521000374.400x280.0.jpg)
![[포토] 류선규 전단장, ' 야구팬에서 야구단 단장까지'](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5/21/isp20250521000328.400x280.0.jpg)
![[포토] 류선규 전단장, ' LG 유광점퍼 기획'](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5/21/isp20250521000327.400x280.0.jpg)
![[포토] 이연규 대표,' 캐릭터 산업 팬덤의 가치' 강의](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5/21/isp20250521000315.400x280.0.jpg)
![[포토]박진영-박보영, 비주얼 '박남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5/21/isp20250521000310.400x280.0.jpg)
![[포토] 스포츠 굿즈에 대해 강의 하는 이연규 대표](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5/21/isp20250521000311.4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