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윤동희→홍민기→한태양...'데일리 MVP'' 꼽기 어려울 정도...멈추지 않는 거인 [IS 포커스]
- 가차 없는 김태형 감독, 황성빈 실책 수습은 '불펜 새 기둥' 홍민기
- 뉴페이스 신드롬은 이어진다...전민재·장두성·박찬형 바통 받은 한태양→KIA전 인생 경기
- 와이스 10K+문현빈 3안타...3G 만에 승리한 한화→'광현진' 맞대결 앞두고 먼저 기선 제압
- [TVis] 안재현, 벌크업 몸매 자랑 “71kg→81kg… 손 안 차고 피도 잘 돌아” (‘나혼산’)
- [TVis] 백진희, 알고 보니 9시 뉴스 시보 소녀… “도대체 누구냐고” (‘전현무계획2’)
- ‘살림남’, 은지원 이어 겹경사… 이민우, 예비 신부 최초 공개
- [TVis] 김재중, 채팅으로 만난 ♥첫사랑과 상견례까지… 母 “예쁘고 부모님도 좋아”
- [TVis] 김금순, 훈남 아들 최초 공개… “방탄소년단 뷔 닮은꼴” 감탄 (‘편스토랑’)
- '우주의 기운' 염경엽 LG 감독 "응원 덕분에 선수들 집중력을 높아져" [IS 승장]
스포츠일반
도우미에서 주인공 된 정재원 “기분이 완전 달라요”
등록2020.03.18 08:35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막내 정재원(19·서울시청)이 수줍게 웃으면서도 조곤조곤 말했다. 정재원은 지난 9일 네덜란드 헤이렌베인 티알프 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2019~20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파이널 대회 남자 매스스타트에서 7분47초06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2017년 성인 대표팀 선발 후, 국제 무대에서 개인 종목 첫 금메달을 획득했다.
16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그는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에선 형들을 돕는 게 우선이었다. 그때는 메달을 따야 한다는 생각도 없었다”며 “올림픽을 한 번 경험한 뒤 나도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1등을 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다”고 말했다.
당시 정재원은 태극마크를 단 지 5개월 만에 평창올림픽 팀 추월에서 은메달을 땄다. 국내 스피드스케이팅 사상 최연소 올림픽 메달리스트(17세)였다. 그는 이승훈(32)·김민석(21) 등 형들이 이끌어준 메달이라고 여겼다.

정재원은 “난 그때 경험이 없는 신인이었다. 메달을 딸 실력이 안 됐다. 코칭스태프와 짠 전략대로 형들을 돕는 역활을 하는 데 집중했다”고 했다.
시끄럽기는 했지만 그의 첫 올림픽은 나름대로 성공적이었다. 메달을 딴 덕분에 병역 특례도 받았다. 정재원은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나도 개인 종목에서 우승하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다”고 했다.
훈련 강도를 높였다. 일주일에 2번 하던 웨이트 트레이닝을 매일 1~2시간씩 했다. 평창올림픽 당시 그는 키 1m75㎝, 체중 60㎏이었다. 2년 만에 만난 정재원은 키가 크고 어깨는 떡 벌어져 있었다. 그는 “매스스타트는 쇼트트랙처럼 몸이 부딪히는 경우가 있다. 몸이 커야 유리하다. 근육량을 많이 늘려서 지금은 키 1m79㎝, 체중 63㎏ 정도”라고 했다.
경기를 앞두고 정재원은 탄수화물을 집중적으로 섭취해 체중을 늘리는 전략을 썼다. 선수들이 동시에 출발해 트랙 16바퀴를 도는 매스스타트는 막판 스퍼트 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간 순위 점수와 마지막 순위 점수를 부여해 총점으로 순위를 정한다. 중간 순위 점수보다 마지막 순위 점수 비중이 높아 마지막 바퀴가 가장 중요하다.
정재원은 “이번 월드컵 파이널을 앞두고 일주일 동안 빵과 밥만 먹었다. 체중을 늘려 나가니까 마지막 스퍼트를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재원은 경기 초반 중위권에 머물다가 마지막 바퀴를 남기고 선두권의 조이 만티아(미국), 바트 스윙스(벨기에)를 따돌리고 우승했다.
사실 정재원은 긴 호흡으로 목표에 다가가려고 했다. 지난 시즌 월드컵에서 번번이 결승 진출에 실패하면서 겸허해졌다. 그는 “주니어 대회에서는 종종 메달권에 들었다. 성인 무대는 확실히 다르더라. 선수들 체격이 크고, 속도로 훨씬 빨라서 따라가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게다가 정재원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 반 동안 허리 통증으로 제대로 훈련하지 못했다. 월드컵 2차 대회와 4대륙 선수권대회 매스스타트에서 은메달을 따면서 자신감을 얻었다. 그는 “잘하는 선수들의 영상을 보면서 다양하게 레이스 전략을 짰다. 경기 때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잘 통했다”고 말했다.
고교생 정재원은 형들의 우승을 위해 묵묵히 얼음을 지쳤다. 이제 그는 자신의 레이스를 주도한다. 정재원은 “(평창올림픽 때는) 하라는 대로 하면 되니까 마음이 편했다. 지금은 금메달을 위한 레이스를 하느라 생각이 복잡하다. 그래도 금메달을 따는 기분이 좋다”며 웃었다.
17세 소년은 올림픽에 나간 것만으로도 들떴다. 불과 2년 만에 정재원은 세계 정상을 노리는 에이스가 돼 있다.
박소영 기자 psy0914@joongang.co.kr
당신이 좋아할 만한정보
AD
당신이 좋아할 만한뉴스
지금 뜨고 있는뉴스
행사&비즈니스
많이 본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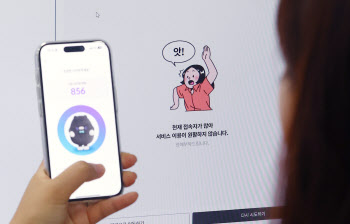










![[포토] 임세미-윤계상-김요한, 트라이 화이팅](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7/25/isp20250725000175.400x280.0.jpg)
![[포토] '트라이', 화이팅!](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7/25/isp20250725000174.400x280.0.jpg)
![[포토] '트라이', 본방사수 해주세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7/25/isp20250725000173.400x280.0.jpg)
![[포토] '트라이', 기대해도 좋아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7/25/isp20250725000171.400x280.0.jpg)
![[포토] 임세미-윤계상-김요한, '트라이' 셋 케미 기대해 주세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7/25/isp20250725000169.400x280.0.jpg)
![[포토] 임세미-윤계상-김요한, '트라이' 화이팅](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7/25/isp20250725000170.400x280.0.jpg)
![[포토] 임세미-윤계상-김요한, '트라이' 주역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7/25/isp20250725000172.400x280.0.jpg)
![[포토] 윤계상-김요한, 브로맨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7/25/isp20250725000167.400x280.0.jpg)
![[포토] 윤계상-김요한, 주먹 콩](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7/25/isp20250725000168.400x280.0.jpg)
![[포토] 윤계상-김요한, 사이좋은 포즈](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7/25/isp20250725000166.400x280.0.jpg)
![[포토] 임세미-윤계상, 서로에게 해주는 볼하트](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7/25/isp20250725000163.400x280.0.jpg)
![[포토] 임세미-윤계상, 기분 좋은 하트 포즈](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7/25/isp20250725000164.4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