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보플2’ 출신 연습생 타이치, 퀴어 예능 ‘남의연애4’ 출연 [공식]
- 이영지, 몸무게 이실직고…“13kg 감량→11kg 복구된 상황, 모른 척하기 어려워”
- ‘새신랑’ 김우빈, 열일 모드…‘♥신민아’ 반하게 한 치명적 미소 [IS하이컷]
- 김우빈, 블루 셔츠도 찰떡 소화 [AI 포토컷]
- “韓 A조 3위 32강” 홍명보호 월드컵 전망 나왔다…손흥민·황희찬·이강인 스리톱 예상
- 배성재·곽윤기·김아랑…JTBC, 입체적인 동계 올림픽 중계 예고
- [영상] 캐치더영, ‘정규앨범 들고 돌아왔다!’…열정과 비주얼 다 잡은 5인조 밴드
- [영상] 캐치더영, 무대를 채운 밴드 사운드…‘Amplify(앰플리파이)’
- [영상] 캐치더영, 멈추지 않는 청춘의 항해…‘찬란히 빛나줘(Sail)’ 무대
- "다른 선수 생각하면 배신" 사이판 멤버들만 본다, '김하성·송성문 낙마' 악재 어떻게 해결할까
경제
서민 울리는 '신용카드깡'…입증 못하면 신고도 안 받는 금융감독원
등록2020.10.13 15:25

일명 ‘카드깡’으로 알려진 신용카드 현금화 범죄 신고가 올해 상반기 단 1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입증자료를 완비하지 않으면 신고 접수 자체를 않고 있어 사실상 관리·감독 구멍을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의 상시감독시스템에 카드사가 접수한 카드깡 의심 신고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했다. 2017년 251건이었던 신고가 3년 만에 거의 사라진 것이다.
‘카드깡’은 유령가맹점에서 물건을 산 것처럼 매출을 발생시킨 후 현금으로 돌려받고 명의자에게 수수료 20~30%를 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의 불법 사금융 범죄다. 주로 급전이 필요한데 정상적인 대출이 어렵거나, 고리대임을 모른 채 쉽고 간편하게 대출 가능하다는 말에 현혹된 서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주로 서민층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까닭에 금융감독원은 2016년 ‘카드깡 실태 및 척결 대책’을 발표하고 카드깡을 ‘5대 금융악’으로 지정, 이를 뿌리 뽑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겠다 공표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 불법금융광고 적발현황’에서 지난해 신용카드 현금화 광고 2036건을 적발했으며, 이는 전년 270건 대비 654.1% 증가한 수치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카드깡 광고가 기승을 부린 지난해 접수된 신고는 겨우 46건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신고 접수가 급격히 줄어든 이유를 “2018년부터는 혐의 입증자료가 완비된 경우에 한해 신고”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17년에는 카드사들이 입증이 불충분한 건도 금감원에 신고했지만, 이후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증거자료가 구비된 건만 수사의뢰 해달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개별 카드사가 카드깡 범죄로 의심되는 거래를 신고할 때 증거자료를 찾아내 제출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서 접수 자체를 받지 않는다는 말로 풀이할 수 있다. 4년 전 카드깡을 척결하겠다던 금융감독원이 감독자가 아닌 전달자 역할만 자처하고 있는 셈이다.
홍성국 의원은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서민들이 대출 필요하냐는 전화 한 통에 현혹되어 불법 고리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를 감독해야 할 금융당국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금감원이 발표한 대로 최근 불법광고가 폭증한 까닭은 범죄자들이 이러한 허점을 우습게 봤기 때문이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당신이 좋아할 만한정보
AD
당신이 좋아할 만한뉴스
지금 뜨고 있는뉴스
행사&비즈니스
많이 본뉴스







!["업스테이지 논란, 韓 AI의 자정과 기술을 남겼다"[only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1/PS26011901212B.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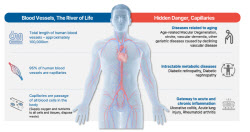









![[포토]최우식, 패션위크 위해 파리 출국](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9/isp20260119000128.400x280.0.jpg)
![[포토]최우식, 몰아치는 강풍에 깜짝!](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9/isp20260119000127.400x280.0.jpg)
![[포토]최우식, 춥다 추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9/isp20260119000126.400x280.0.jpg)
![[포토]최우식, 추워진 날씨에 잔뜩 웅크린 어깨](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9/isp20260119000125.400x280.0.jpg)
![[포토]최우식, 남친룩의 좋은 예](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9/isp20260119000124.400x280.0.jpg)
![[포토]최우식, 눈웃음에 무장 해제](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9/isp20260119000123.400x280.0.jpg)
![[포토]최우식, 애교 장인의 하트](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9/isp20260119000122.400x280.0.jpg)
![[포토]최우식, 파리 잘 다녀올게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9/isp20260119000121.400x280.0.jpg)
![[포토]최우식, 장난꾸러기 미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9/isp20260119000120.400x280.0.jpg)
![[포토]최우식, 하트에서 꿀이 뚝뚝](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9/isp20260119000119.400x280.0.jpg)
![[포토]최우식, 애교장인](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9/isp20260119000118.400x280.0.jpg)
![[포토]세븐틴 민규, 엔딩포즈같은 출국길 인사](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9/isp20260119000113.4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