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혈통이 역사 만든다…제2의 메니피 꿈꾸는 ‘닉스고’
- “오타니는 충분히 잡는다” WS 동료에서 WBC 라이벌로…커쇼 은퇴 마음 돌린 이유
- [TVis] 서범준·리정, 박나래·키 빈자리 채웠다…구성환→바자회 에피소드 공개 (나혼산)
- 김수미 “개코 수입 몰라, 아이 낳고 ‘내 삶 뭘까’ 생각”…과거 발언 재조명
- ‘단국대 vs 경희대’ 챔피언 더비 성사…대학축구 8강 대진 완성
- ‘사상 초유’ 경기 지연…KB, 강이슬 32점 앞세워 2연승→신한은행은 9연패
- [TVis] 김혜윤, 첫방부터 속사포 막말…상처받은 로몬 “미친 여자 아니야” (인간입니다만)
- [TVis] 손태진母, 둘째 딸 떠나보낸 슬픈 가정사…“숨만 쉬어도 감사” (편스토랑)
- ‘임짱’ 임성근 셰프, 학폭 의혹 해명…“학교를 안 다녔다”
- 현빈 ‘메이드 인 코리아’, 2025년 디플 공개작 중 최다 시청작
해외축구
[이정우의 스포츠랩소디] 유럽프로축구는 모든 걸 판다, 한가지만 빼고
온라인 일간스포츠 기자
등록2020.11.09 06:00
수정
2023.09.20 14:27

전 세계적인 축구 인기에 힘입어 많은 기업은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스폰서십에 참여하고 있다. 축구 스폰서십에는 크게 두 가지의 중요한 스폰서가 존재한다. 셔츠 스폰서(shirt sponsor)와 킷 스폰서(kit sponsor, 나이키·아디다스 등 유니폼 제조사)이다.
셔츠 혹은 저지(Jersey) 스폰서십을 최초로 시도한 축구 클럽은 1950년대 우루과이의 페냐롤(Peñarol, 129년의 역사 동안 리그 우승을 49번 기록한 우루과이 최고의 클럽)이었다. 그 후 1960년대 들어 덴마크와 오스트리아가 유럽 최초로 셔츠 스폰서십을 도입했으나, 다른 축구리그는 이러한 스폰서십을 격렬하게 반대하며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축구협회와 팬들의 강한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1970~80년대 셔츠 스폰서십은 독일을 시작으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에 정착하는 데 성공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클럽들은 이를 좀 더 늦게 받아들여 90년대가 돼서야 대부분의 클럽이 셔츠 스폰서를 보유하게 되었다.

스페인의 FC 바르셀로나는 스폰서에 클럽의 영혼을 팔 수 없다며 오랫동안 셔츠 스폰서십에 저항했다. 그들에게는 자랑스러운 역사였다. 하지만 이러한 바르셀로나마저도 비영리 단체인 유니세프와 카타르 재단을 셔츠에 새기면서 팬들의 반응을 살피더니, 2013~14시즌부터 상업적인 회사 카타르 항공사의 로고를 셔츠에 새겼다. 심지어 바르셀로나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셔츠 안쪽에도 스폰서의 로고를 새기는 계약을 맺었다.
유럽축구에서 발전된 셔츠 스폰서십은 이후 전 세계로 뻗어 나갔다. 이제는 거의 모든 프로축구 리그에 정착되었다. 아울러 이러한 스폰서십은 축구 외에 다른 스포츠 종목으로도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전통적으로 유니폼을 성스러운 공간(sacred space)으로 생각해 광고 혹은 스폰서 로고 부착을 터부시한 미국의 프로스포츠도 더는 셔츠 스폰서십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셔츠 스폰서십도 세분되어가고 있다. 셔츠 슬리브(sleeve, 소매) 스폰서십의 등장이 바로 그것이다. 잉글랜드의 프리미어리그는 2017~18시즌부터 오른팔 소매에도 스폰서 로고를 새기고 있다. 하지만 스페인과 프랑스의 1부 리그인 라리가와 리그앙에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슬리브 스폰서가 존재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셔츠 뒷면에도 스폰서를 새기는 프로축구 리그도 늘어나고 있다.
셔츠와 킷 스폰서 외에도 유럽의 프로축구팀은 수많은 스폰서 겸 파트너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는 글로벌, 지역(regional), 파이낸셜과 미디어 파트너를 거느리고 있다. 맨유의 글로벌 파트너 기업만 23개에 달한다. 아울러 28개 기업이 지역, 파이낸셜과 미디어 파트너에 속해 있다. 즉 현재 맨유가 보유한 스폰서 겸 파트너 기업만 무려 51개인 것이다.

일부 클럽은 축구장 이름도 스폰서에게 팔기 시작했다. 팬들은 보통 새로 건설한 경기장에 네이밍 라이츠(naming rights, 명칭 사용권)를 하는 것에는 커다란 거부감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미 존재하는, 특히 유서 깊은 축구장 이름에 스폰서 기업 이름을 붙이려 하면 강한 거부 반응을 나타낸다. 만약 아스날이 에미레이트 항공사의 이름을 2006년 개장한 새 축구장이 아닌 클럽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예전의 '하이베리 구장'에 붙였다면, 아스날의 서포터스들은 이를 절대 용납하지 않았을 것이다.
맨유의 유서 깊은 홈 구장 '올드 트래포드'의 네이밍 라이츠를 판매한다는 루머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몇 년 전에는 나이키가 홈구장의 이름으로 내정되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이 뉴스를 본 팬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사실 2005년 맨유를 인수하면서 막대한 빛을 지게 된 미국의 글레이저 가문은 홈구장의 이름을 팔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맨유의 ‘올드 트래포드’와 리버풀의 ‘안필드’ 같은 유서 깊은 축구장의 이름을 스폰서에게 판매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이루어지기 힘들다. 대신에 맨유는 자신들이 보유한 캐링턴 트레이닝 센터의 이름을 미국의 보험사에 판매했다. 2013년부터 8년 동안 이 센터는 스폰서의 이름을 따 에이온(Aon) 트레이닝 컴플렉스로 불렸다.
이렇듯 유럽 프로축구팀들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팔 수 있는 것은 모두 팔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들이 팔지 않고 마지막 보루로 남겨놓은 것이 있다. 바로 클럽 이름이다. 다음 주 칼럼에서 이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
이정우 경영학 박사(이화여대 국제사무학과 초빙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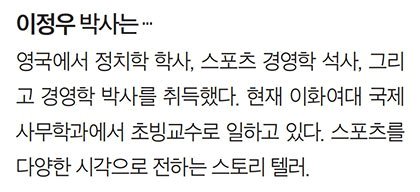
온라인 일간스포츠 기자 isplus@edaily.co.kr
당신이 좋아할 만한정보
AD
당신이 좋아할 만한뉴스
지금 뜨고 있는뉴스
행사&비즈니스
많이 본뉴스



















![[포토] '슈가' 화이팅](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5/isp20260115000302.400x280.0.jpg)
![[포토] '슈가' 주역들의 아름다운 가족사진](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5/isp20260115000301.400x280.0.jpg)
![[포토] '슈가' 재미있게 봐주세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5/isp20260115000303.400x280.0.jpg)
![[포토] '슈가' 빛나는 주역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5/isp20260115000299.400x280.0.jpg)
![[포토] 최지우, 비타민 손인사](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5/isp20260115000298.400x280.0.jpg)
![[포토] 최지우, 아름다운 분위기](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5/isp20260115000300.400x280.0.jpg)
![[포토] 고동하, 귀여운 손인사](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5/isp20260115000296.400x280.0.jpg)
![[포토] 훌쩍 커버린 '슈가' 고동하](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5/isp20260115000297.400x280.0.jpg)
![[포토] 민진웅, 완벽 올블랙 슈트핏](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5/isp20260115000292.400x280.0.jpg)
![[포토] 민진웅, 멋진 손인사](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5/isp20260115000294.400x280.0.jpg)
![[포토] 최신춘 감독, '슈가' 화이팅](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5/isp20260115000293.400x280.0.jpg)
![[포토] 포즈 취하는 최신춘 감독](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5/isp20260115000295.4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