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263만명 구독자’ 나름, 학폭 피해 고백 “’프듀’ 출신, 탈락 후 다른 그룹으로 데뷔”
- “영화 한 장면 같아”…수지, 박보검·뷔와 흑백 뚫고 나오는 비주얼 [AI 포토컷]
- 샤이니 키, ‘주사이모’ 논란에 활동 중단…‘할명수’ 측 “공개 일정 변경” [공식]
- CBS 김현정 PD, ‘뉴스쇼’ 16년 만에 하차… 후임 박성태 전 JTBC 앵커
- ‘월드컵까지 6개월’ 홍명보 “좋은 결과 내고 최선 다하겠다…많은 성원 부탁한다”
- ‘1박 2일’ 조세호 하차 후 오늘(19일) 첫 촬영…5인 체제 [공식]
- 김재원, 이종석 하차한 ‘나도 반대하는 나의 연애’ 출연할까... "검토 중" [공식]
- 불꽃 파이터즈 vs 한일장신대, 팽팽한 접전…그라운드에 함성 쏟아진 이유는? (‘불꽃야구’)
- SOOP-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역 콘텐츠 경쟁력 강화 '맞손'
- 용인FC, 연령별 대표 출신 MF 김동민 영입
스포츠일반
장벽 없는 태권도, 세계화 성공했다...NYT "메달 어려운 나라들에 희망"
등록2021.07.26 15:35

2020 도쿄올림픽에서 태권도가 한국의 금밭으로 머무르는 대신 세계화·대중화에 성공한 국제 스포츠로서의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6일 “메달 획득이 어려운 나라들에 태권도가 메달을 딸 수 있는 길이다”라고 태권도 세계화의 현황을 전했다.
NYT는 “모든 올림픽 종목 중에서 태권도는 국제 대회 출전이 아슬아슬한 국가의 주머니 사정에 가장 관대할 것이다”라며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이 된 이후 선수단이 작은 국가들에 12개 이상의 메달을 전달했다”라고 설명했다.
코트디부아르와 요르단이 대표적이다. 둘은 지난 2016 리우 올림픽에서 태권도로 사상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니제르, 베트남, 가봉도 태권도로 첫 은메달을 차지했다. 올림픽 역사상 메달이 없었던 아프가니스탄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태권도 동메달이 팀 역사상 유일한 올림픽 수상이다.
값비싼 장비, 복잡한 인프라가 필요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NYT는 “태권도는 체조나 복싱 같은 높은 인지도나 대중적인 시청률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나 수천만 명이, 특히 아프리카, 아시아 등에서 태권도를 하고 있다”라며 “비싼 장비도, 넓은 시설도 필요 없기 때문이다”라고 소개했다. 매체는 니제르 올림픽 위원장의 말을 빌려 “니제르와 같은 빈국에 태권도는 최고다”라며 “한국에서 온 스포츠지만 많은 장비 없이 쉽게 연습할 수 있어 우리 것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전했다.
보급에 앞장선 한국 태권도계의 영향도 크다. NYT는 “태권도는 K팝 이전, 한국 드라마 이전, 김치볶음밥 이전까지 한국이 처음으로 성공한 문화 수출이었다”라며 “태권도는 1950년대 다양한 무술 요소를 융합한 학문으로 발전했다”라고 전했다. 매체는 “베트남 전쟁 때 한국 군인들이 서구 군인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쳤다. 당시 군 복무 중이던 미국 배우 척 노리스가 함께 배우기도 했다”라며 “한국 태권도계가 본격적으로 해외에 전파할 때 한국의 가라데로 알려졌지만, 가라데보다 더 빨리 자리를 잡으면서 현재 세계 태권도 연맹은 210개의 회원국과 난민 대표까지 포함하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매체는 “여전히 한국인 단체들이 국경을 넘어 태권도를 전파하기 위해 노력한다”라며 “2015년 세계태권도연맹은 텐트 사이 먼지투성이인 곳만 있으면 어디든 태권도 공간으로 개조해 난민촌에 태권도를 보급했다. 현재 요르단, 터키, 르완다, 지부티의 난민 캠프에서 태권도 선수들이 훈련받는 중이다”라고 소개했다. 도쿄올림픽에서도 난민 대표팀 소속 태권도 선수로 3명이 출전했다.
다양한 국가의 메달 수상은 2020 도쿄올림픽도 마찬가지다. 종주국 한국은 이대훈이 메달 수상에 실패하는 등 금메달 ‘0’의 위기에 놓인 반면 다양한 국가의 선수들이 메달을 차지했다. 여자 49㎏급에서 파니팍 옹파타나키트(태국)이 첫 금메달을 신고했다. 이어 남자 68㎏급에서 이대훈을 꺾은 울루그벡 라시토프(우즈베키스탄)이 금메달, 여자 58㎏급에서 모하메드 칼릴 젠두비(튀니지)이 은메달, 여자 57㎏급에서 로 차이링(대만)이 동메달을 각각 차지했다.
메달 수상의 영향도 선진국 이상이다. NYT는 “올림픽의 영광이 드문 나라는 메달을 딸 때의 효과가 가장 크다”라고 전했다. 매체는 나세르 마자리 요르단 올림픽 위원회 사무총장의 말을 인용해 “2016 리우 올림픽에서 아흐마드 아부하우시가 태권도 남자 68㎏급에 출전해 요르단 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을 따자 3개월 만에 요르단에서만 태권도복 5만 벌이 팔렸다”라고 소개했다.
단순 격투기에 넘어선 결과물이다. 조청원 세계태권도 회장은 NYT와의 인터뷰를 통해 “매일 새로운 국가에서 메달을 걸고 있다”라며 “태권도는 격투기지만, 올림픽 정신인 다양성에 평화롭게 기여하고 있다”라고 긍정적인 소감을 전했다.
차승윤 인턴기자
당신이 좋아할 만한정보
AD
당신이 좋아할 만한뉴스
지금 뜨고 있는뉴스
행사&비즈니스
많이 본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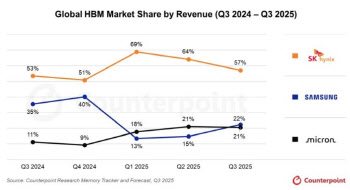











![[포토]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된 故 윤석화 빈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19/isp20251219000086.400x280.0.jpg)
![[포토]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된 故 윤석화 빈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19/isp20251219000084.400x280.0.jpg)
![[포토]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된 故 윤석화 빈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19/isp20251219000085.400x280.0.jpg)
![[포토]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된 故 윤석화 빈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19/isp20251219000087.400x280.0.jpg)
![[포토]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된 故 윤석화 빈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19/isp20251219000081.400x280.0.jpg)
![[포토]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된 故 윤석화 빈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19/isp20251219000083.400x280.0.jpg)
![[포토]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된 故 윤석화 빈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19/isp20251219000082.400x280.0.jpg)
![[포토] 연극 '더 드레서' 선생님 역 정동환·박근형](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19/isp20251219000079.400x280.0.jpg)
![[포토] 연극 '더 드레서' 노먼 역 맡은 오만석·송승환](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19/isp20251219000077.400x280.0.jpg)
![[포토] 연극 '더 드레서' 사모님 역맡은 송옥숙·정재은](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19/isp20251219000076.400x280.0.jpg)
![[포토] 연극 '더 드레서' 화이팅](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19/isp20251219000080.400x280.0.jpg)
![[포토] 연극 '더 드레서' 기대해 주세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19/isp20251219000078.4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