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송성문 다음은 김주원? "내가 잘해야 MLB 문 두드릴 수 있다"
- 최수종, 아들·딸 생일 축하 편지 공개…”가족과 나누는 사랑”
- [TVis] 무진성 “女 지인, 탁재훈에 정신 못 차리겠다고”(‘미우새’)
- [TVis] 유민상母 합류…”결혼 못해 속상, 살 쪄서 자존감 낮아진 듯” (‘미우새’)
- [TVis] 박근형, ‘꽃할배’ 사랑꾼 비하인드…”수술 직후 아내 걱정” (‘미우새’)
- [TVis] 박근형, 故이순재 마지막 만남…”연극계 맡아달라고” (‘미우새’)
- [왓IS] “韓은 개고기 먹어 야만”…’별세’ 브리지트 바르도는 누구
- 佛배우 브리지트 바르도 별세...향년 91세
- ‘황당 평가’ 독일 매체 온라인 투표→김민재, 올해 최악의 선수 5위
- [TVis] “기절할 것 같아”…조세호, 겨울바다 입수→하차 (‘1박 2일’)

여름을 지나는 동안 콩국수는 두어 번 먹어야겠지요. 그리고 콩국수를 먹을 때마다 논쟁을 해야겠지요. 콩국수에 소금이냐 설탕이냐를 두고 한바탕 설전을 벌여야 하지 않겠어요? 대체로 전라도는 설탕, 경상도는 소금입니다. 다른 지역은 집집이 제각각인 듯하고요.
맛있다는 것은 익숙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릴 때 어떤 콩국수를 먹었느냐에 따라 맛있음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어릴 때 설탕콩국수를 먹었으면 평생 설탕콩국수가 맛있고, 어릴 때에 소금콩국수를 먹었으면 평생 소금콩국수가 맛있습니다.
‘저는 소금콩국수입니다’라고 말을 하려다 보니까, 그게 아닌 듯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더듬어도 어릴 적에 먹었던 콩국수가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시원한 콩국물을 먹은 기억은 있는데… 하다가 제 뇌의 저 안쪽에서 끄집어낸 것이 우무콩국입니다.
우무콩국은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우무란 우뭇가사리라는 해초를 끓여서 굳힌 묵입니다. 한천이라고도 하지요. 투명하고 매끌매끌하며 탄력이 있습니다. 큼큼한 바닷내가 붙어 있고요, 가늘게 채 썰어 후루룩 마시면 입술과 혀, 입천장, 그리고 목구멍에 닿는 촉감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우무콩국의 간은 소금으로 합니다. (물론 우무콩국에 설탕을 넣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무는 해초이고, 내 고향 마산은 바닷가 도시이고, 그래서 우뭇가사리가 흔해서 콩국수보다 우무콩국을 더 많이 먹었던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합니다. 여름이 되어 골목에 빙수 깃발이 보일 즈음에 맞추어 우무콩국 좌판이 등장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980년에 서울 올라와 오랫동안 우무콩국을 잊고 있다가 경동시장 좌판에서 우무콩국을 발견하고는 반가운 마음에 한 자리에서 두 그릇을 훌훌훌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콩국수에 대해 글을 쓰는 중이었는데 어쩌다가 우무콩국으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우무콩국을 먹은 지가 언제인지 더듬어보니 10년도 넘은 듯합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우무’를 검색합니다. 있습니다, 세상에! 주문을 넣습니다. 우리 동네에 콩국을 잘 내는 두부집이 있습니다. 내일 저는 우무콩국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한두 달 전에 목포에서 유명한 콩국수집에 갔습니다. 목포에서는 콩국수에 설탕입니다. 식탁에 커다란 설탕통이 뜨아! 저는 무시했습니다. 콩국물이 환상적으로 맛있었습니다. 콩국물은 덜 끓이면 콩 비린내가 나고 너무 끓이면 메주내가 납니다. 약간의 비린내가 붙어 있는 콩국물이었습니다. 여기에 적절하게 굵고 단단한 국수까지 말아져 있었습니다. 저는 소금도 설탕도 넣지 않고 먹었습니다.
한 그릇을 다 비워갈 때에 동행한 후배가 제게 “설탕 넣어 먹어보실래요”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는 마산 출신인데 목포에서 삽니다. 그는 소금콩국수파입니다. 남은 콩국물에 설탕을 퍽퍽 넣고 슬슬 저어서 후루룩~ 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밥에다 설탕을 뿌려서 먹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페북에다 콩국수에 설탕 넣어 먹는 지역에 대한 질문을 올렸습니다.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손혜원 전 의원도 댓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원래 소금인데 목포 와서 설탕 넣어보니 이 또한 별미더군요~ 큰 술 둘! ㅋ”
손 전 의원이 과거에 쓴 페북 글을 보니 목포 이주 3년차에 설탕콩국수에 적응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여행객은 지역 음식에 입맛을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곧 그 지역을 떠나 집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주한 지역에서 아예 눌러 살려면 이전의 입맛을 버리고 이주 지역의 입맛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현지인이 되는 첫걸음이 현지인과 똑같은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소금콩국수에서 설탕콩국수로 바꾸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나이가 들어 평생 이어온 입맛을 바꾸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손 전 의원의 댓글을 보며 속으로 이랬습니다. “이야~ 진짜 목포 사람이네. 멋있어.”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당신이 좋아할 만한정보
AD
당신이 좋아할 만한뉴스
지금 뜨고 있는뉴스
행사&비즈니스
많이 본뉴스







![일라이릴리 밀리던 노보노디스크, 경구용으로 반전 꾀한다[클릭, 글로벌 제약·바이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12/PS25122803583B.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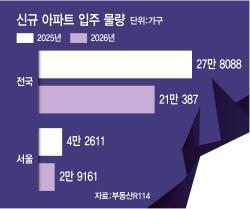









![[포토] 영케이, 귀여운 손인사](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25/isp20251225000212.400x280.0.jpg)
![[포토] SBS 가요대전 3MC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25/isp20251225000213.400x280.0.jpg)
![[포토] 엔시티 드림, 백마 탄 왕자님들 여기 다 모였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25/isp20251225000209.400x280.0.jpg)
![[포토] 엔시티 드림 마크, 귀엽게 팔 흔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25/isp20251225000211.400x280.0.jpg)
![[포토] 아이브 장원영, 눈맞춤에 심쿵](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25/isp20251225000207.400x280.0.jpg)
![[포토] 아이브 장원영, 럭키비키 워킹](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25/isp20251225000206.400x280.0.jpg)
![[포토] 아이브, 산타걸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25/isp20251225000208.400x280.0.jpg)
![[포토] 아이브 안유진, 아름다운 드레스 자태](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25/isp20251225000205.400x280.0.jpg)
![[포토] 스트레이 키즈, 멋진 무대 기대해 주세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25/isp20251225000204.400x280.0.jpg)
![[포토] 스트레이 키즈 필릭스, 왕자님 비주얼](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25/isp20251225000200.400x280.0.jpg)
![[포토] 스트레이 키즈 현진, 시크한 손인사](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25/isp20251225000203.400x280.0.jpg)
![[포토] 에이티즈 산, 멋진 손인사](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25/isp20251225000201.4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