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송가인 美 LA 공연, 비자 문제로 연기됐다…“대관일정 다시 잡는 중” [공식]
- 카리나, 일본 길거리서 칭얼거린 사연…“집에 가기 싫다니까” [AI 포토컷]
- '총리도 지켜봤다' 한국에 밀린 폰타나, 여자 계주 3000m 통산 14번째 메달…이탈리아 동·하계 역대 1위 [2026 밀라노]
- 최준희, 결혼 발표 후 ‘볼록 배’ 근황…“이렇게 나올 수 있냐” [IS하이컷]
-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 한국가이드스타 3년 연속 전 부문 만점
- '세 곳 골절' 뼈 부러진 채 금메달 딴 최가온, 포기할 수도 있었던 순간 부상 투혼으로 '금빛 연기' [2026 밀라노]
- 넷마블 '신의 탑: 새로운 세계', 신규 영웅 '[대사서] 뒤마' 업데이트
- 이다인, ♥이승기와 태교 여행... 첫째 딸도 함께 [IS하이컷]
- ‘신랑수업2’ 3월 컴백…MC 이승철·탁재훈·송해나 확정
- ‘김민희♥’ 홍상수 ‘그녀가 돌아온 날’, 베를린서 첫 공개 “명성·돈 필요없어”

설마 그럴 줄은 몰랐다. 4번 아이언으로 친 공이 캐리로 채165m도 날아가지 못할 줄은. 캐리(Carry)는 공이 순전히 날아서 간 거리만을 말한다. 일단 땅에 튕긴 다음 더 굴러서 간 거리는 런(Run)이라고 부른다.
지난 여름 어느 주말이었다. 뱁새 김 프로와 제자들은 충북 진천 천룡CC에 모였다. 하늘에는 구름이 가득했다. 조금 후텁지근하긴 했다. 그래도 전날까지 기승을 부리던 폭염에 비하면 어머니 품이었다. 모두 날씨를 칭찬했다.
날씨만 좋은 게 아니었다. 뱁새 김 프로의 초반 샷도 순조로웠다. 첫 홀부터 무지막지하게 드라이버 샷을 날렸다. 블랙티에서 쳤는데도 남은 거리는 채 60m가 되지 않았다. 62도 웨지로 핀 옆에 공을 딱 붙였다. 탭 인 하듯 버디를 기록했다. 그리고 다음 몇 홀을 아쉽게 파로 마쳤다. 뱁새가 오랜만에 사부로서 체면을 세우는 듯 했다. 그런데 어디 세상사가 뜻대로 되던가? 특히 골프에서.
뱁새와 일행은 황룡코스 6번홀 파3에 들어섰다. 거리측정기로 재보니 앞 핀까지 거리는 187m. 뱁새는 4번 아이언을 꺼내 들었다. 187m 보다는 조금 더 보내는 클럽이다. 물을 건너서 그린에 올려야 하는 홀이었다. 그래서 조금 더 길게 잡은 것이었다.
그 직전까지 다섯 홀을 멋지게 플레이 한 뱁새는 자신 있게 스윙을 했다. 클럽은 부드럽게 바람을 갈랐다. 공도 핀을 향해 멋지게 날아갔다. 아니 멋지게 날아가는 듯 했다. 그런데 아뿔사! 페널티 구역 거의 끝 부분에서 물이 튀었다. 물을 건너갔는지 아니면 물에 빠졌는지 확실하지 않았다. 두껍게 맞은 것도 아니었는데 그랬다. 티잉 구역에서는 느낄 수 없던 맞바람이 퍼팅 그린 쪽에는 불었던 것일까?
다른 플레이어가 샷을 모두 마친 다음 뱁새는 조마조마하며 퍼팅 그린 쪽으로 갔다. 캐디가 먼저 빠른 걸음으로 뱁새 공이 있음직한 자리로 갔다. 그리고는 손으로 수초 속을 가리켰다. 엑스페론. 뱁새 공이 맞았다.
페널티 구역 안 수초 사이에 놓인 것이 문제였다. 잘 하면 칠 수 있을 것 같았다. 한 발은 페널티 구역 안에 있는 수초를 밟고 말이다. 하필 이런 날 뱁새가 흰 셔츠에 엷은 베이지색 바지를 입고 올게 뭐람. 모자도 흰색 썬캡을 쓰고. 늘 입던 우중충한 옷 차림이라면 차라리 좋을 것을.

뱁새는 잠시 고민했다. 페널티 처리를 하면? 블랙티로 돌아가거나 화이트 티에서 다시 물을 건너오는 샷을 해야 했다. 보기로 마치기란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언플레이어블 볼(Unplayable Ball)도 부를 수 없었다.
언플레이블 볼이 가능하다면 공이 놓인 자리에서 두 클럽 이내에 공을 드롭하고 치면 되는데. 그렇다면 한 벌타만 먹고 일반 구역까지 나와서 세번째 샷을 할 수 있을 것 아닌가? 그러면 보기도 가능할 텐데 말이다. 그러나 페널티 구역에서는 언플레이어블 볼을 부를 수 없다. 현 상황에서 그린에 공을 올려서 파를 노리거나 보기로 막으려면? 어쩔 수 없이 수초에 놓인 공을 쳐야 했다. 그런데 흙탕물이 튀면? 남은 반나절을 꼴불견인 채로 다닐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다.
뱁새는 웃통을 벗고 샷을 해야 하나 망설였다. 캐디에게도 물었다. “웃통 벗고 쳐도 될까요”라고. 캐디는 어이 없어 했다. 친선 라운드에서 한 타라도 줄여보겠다고 웃통까지 벗다니 유난 떠는 것 아니냐는 표정이었다. 뱁새도 그런 생각이 들긴 했다. 그래도 평소에 규칙대로 쳐야 한다고 큰소리 치던 체면을 생각하니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1언더파인 현 상황에서 보기로 막고 이븐 파인 채로 남은 라운드를 하고 싶었다.
마침내 뱁새는 평생 처음으로 필드에서 웃통을 벗었다. 바지도 마음에 걸리긴 했다. 하지만 차마 바지까지 벗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나중에 다른 플레이어가 말해줘서 알았다. 뱁새가 웃통을 벗고 나더니 모자를 다시 쓰더란다. 캐디의 우려 속에 뱁새는 조심스럽게 수초를 밟고 주저하지 않고 샷을 했다.

물에 살짝 떠있다시피 한 공을 어떻게 치는 지는 얘기할 날이 있을 것이다. 공은 TV 중계에서 본 세계적인 선수가 웃통을 벗고 한 것처럼 멋지게 그린으로 날아갔다. 그리고 내리막 경사를 타고 핀 쪽으로 굴러 내려왔다. 생각하지도 못한 행운이었다. 그렇게 다섯 발짝짜리 파 퍼트가 남았다.
뱁새는 캐디가 건네준 수건으로 여기저기 튄 흙탕물을 닦고 셧츠를 입었다. 그런 다음 혼신의 힘을 다해서 브레이크를 읽었다. 그러나 파 퍼트는 홀을 돌아 나오고 말았다. 뱁새는 목표대로 이븐파로 라운드를 이어갔다. 흰색 셔츠도 건졌고. 뱁새는 옆 홀 플레이어들이 수군대는 것도 아랑곳 하지 않고 규칙대로 플레이하자는 신조를 지켰다는 것을 뿌듯해 했다. 그것도 뱁새 말이라면 금과옥조로 여기는 사회인 제자들 앞에서 말이다.
아이고 양심이 찔려서 자백해야겠다. 실은 그날 라운드에 내기가 걸려 있었다. 뱁새는 잘난 척 하느라고 블랙티에서 치면서도 핸디캡을 0으로 놓았다. 뱁새가 청년 투어 프로도 아니고 무슨 수로 맨 뒤 티에서 이븐 파 이하를 친단 말인가! 그런데 제자들이 그날 따라 너무 잘 쳐서 모두 핸디캡 대비 언더파를 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뱁새가 그 홀에서 페널티 처리를 하고 더블을 기록하면 도저히 이기기가 힘들 것 같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웃통을 벗은 것이다.
분명히 로컬 루울이 허락하는 특설 티(흔히 페널티 티라고 부르는 그 티)에서 친다고 하면 구박할 것이 뻔하니까. 프로 골퍼이자 전직 코리안 투어 경기위원이 규칙을 어기면 되냐고! 흑.
‘뱁새’ 김용준 프로와 골프에 관해서 뭐든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메일을 보내기 바란다. 지메일 ‘ironsmithkim이다.
김용준 KPGA 프로
이은경 기자 kyong@edaily.co.kr
당신이 좋아할 만한정보
AD
당신이 좋아할 만한뉴스
지금 뜨고 있는뉴스
행사&비즈니스
많이 본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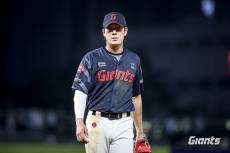














![[포토] 인사말 하는 카리나](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9/isp20260219000178.400x280.0.jpg)
![[포토] 인사말 하는 가비](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9/isp20260219000177.400x280.0.jpg)
![[포토] 인사말 하는 김도훈](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9/isp20260219000173.400x280.0.jpg)
![[포토] 인사말 하는 혜리](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9/isp20260219000174.400x280.0.jpg)
![[포토] 인사말 하는 존박](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9/isp20260219000176.400x280.0.jpg)
![[포토] 인사말 하는 이용진](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9/isp20260219000175.400x280.0.jpg)
![[포토] '미스터리 수사단' 시즌2, 화이팅](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9/isp20260219000167.400x280.0.jpg)
![[포토] '미스터리 수사단' 시즌2, 귀여운 크로스 하트 포즈](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9/isp20260219000166.400x280.0.jpg)
![[포토] '미스터리 수사단' 시즌2, 기대되는 조합](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9/isp20260219000165.400x280.0.jpg)
![[포토] '미스터리 수사단' 시즌2, 놀람의 연속 기대해 주세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9/isp20260219000162.400x280.0.jpg)
![[포토] '미스터리 수사단' 시즌2, 호흡 기대해 주세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9/isp20260219000164.400x280.0.jpg)
![[포토] '미스터리 수사단' 시즌2, 기대되는 포즈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9/isp20260219000160.4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