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강인 향한 ATM의 집착
- “당신을 기릴 것”…LAL 르브론, 경기 없는 날 남긴 ‘경의의 메시지’ 화제
- 카리나, 휴가 중에도 봉사활동…SM 연습생 동료도 응원 (우발라) [TVis]
- 중국은 37%뿐…김상식의 베트남, 결승행 유력 ‘슈퍼 컴퓨터 수치’ 공개
- 261%·130% 폭등…두산 ‘내야 미래’ 오명진·박준순, 연봉 인상률 나란히 팀 내 최상위권
- "불의의 사고, 시간 걸릴 듯" 정관장 자네테, 얼마나 다쳤길래 [IS 장충]
- 김하성 부상→미지의 '유도영' WBC에서 실현? 김도영 "대표팀은 실험 무대 아냐" [IS 인터뷰]
- “눈 찔렸는데 비난하는 건 불공평하다” UFC에 개탄…친구가 답답함 토로했다
- 하나은행이 써 내려가는 2%의 기적
- 윤남노, 여배우에 ♥플러팅 “돼지상男 어때요” (혼자는 못 해) [TVis]

지난 21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한국시리즈(KS) 1차전은 1-0으로 앞선 삼성의 6회 초 무사 1·2루 공격에서 폭우로 서스펜디드(일시정지) 경기가 선언됐다. 그다음 날도 궂은 날씨와 그라운드 사정으로 속개되기 어려워 23일에야 서스펜디드 경기가 열렸다.
사실 21일 KS 1차전 서스펜디드 경기는 예견된 결과에 가깝다. 비로 인해 경기 개시 시간이 66분(오후 6시 30분→오후 7시 36분)이나 밀렸고, 늦은 밤 세찬 비가 내린다는 일기 예보도 있었기 때문이다. 정상적으로 경기 진행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 융통성을 발휘해 식전 행사 등을 크게 생략했다면 어땠을까. 만약 식전 행사를 간소화했다면 1시간 정도는 일찍 경기를 시작할 수 있었을 거다. 그러면 사상 첫 포스트시즌(PS) 서스펜디드 경기도 피할 수 있었다.

필자는 23일 열린 서스펜디드 경기에서도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 서스펜디드 경기는 시즌 중 더블헤더 경기처럼 1차전 관중이 모두 경기장 밖으로 나간 뒤에야 2차전 관중이 입장할 수 있다. 가을이라고 해도 이젠 초겨울에 가까운 기온이라서 2차전에 입장할 팬들은 추위에 오들오들 떨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야구위원회(KBO)나 구단은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았다. 추위를 막아낼 핫팩 등을 제공했다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물론, KS 2차전에 입장한 1만9300명에게 모두 핫팩을 주는 게 금전적인 부담일 수 있다. 하지만 KBO리그가 사상 첫 1000만 관중을 돌파하고 여러 브랜드파워를 높일 수 있었던 건 결국 팬 덕분이다.
각 구단의 굿즈(상품) 등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간 데는 마케팅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응원하는 팀을 위해 지갑을 활짝 연 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 팬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주는 것에 인색해서는 곤란하다. 마케팅은 구단 굿즈를 파는 게 아니라 팬의 마음을 사는 게 밑바탕에 있어야 한다.
사실 서스펜디드 게임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한국의 가을은 더는 예전 같이 야구를 관람하기 좋은 기온이 아니다. PS은 가을 야구가 아닌 초겨울 야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추운 날씨 속에 열린다. 점퍼나 패딩 등이 많이 팔려 수익을 올렸다는 것에 만족해서는 지금의 야구 열기는 오래가기 어렵다. 추위에 떨 팬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날씨에 따라 기업 등과 연계해 핫팩이나 시원한 음료수 등을 나눠주는 프로모션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한국 프로야구는 이제 그만한 힘이 있다. 그 힘은 1000만 관중이라는 팬으로부터 나온다. 야구팬은 크고 거창한 선물을 바라지 않는다. 자신의 팬심을 알아주는 성의가 깃든 것이라면 무엇이든 만족한다. 거기에 깃든 마음에 팬은 즐거워하고 고마움을 느낀다. 그것이 팬심의 본질이다. 지금까지 프로야구 마케팅은 팬에게 무엇인가를 파는 데만 집중했다. 하지만 1000만 관중 시대를 연 KBO리그는 커진 브랜드파워만큼 팬과 함께하는 프로모션을 늘려 나갈 필요가 있다.
몇 년 전, 일본 프로야구(NP) 지바롯데 마린스 구단의 팬 감사회를 지켜본 적이 있다. 여러 행사 중에 코칭스태프와 선수들은 물론이고, 구단 프런트, 구장 관리인(그라운드 키퍼·청소부·식음료 판매원 등), 팬이 모두 함께 필드 위에서 '우리(WE)'라는 글자를 만드는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아 있다. 지바롯데는 '우리'라는 단어를 팀과 관련한 모든 이라고 정의한 것이다. 그에 비해 한국 프로야구에서 우리라는 울타리는 매우 좁다. 선수단, 혹은 조금 더 나아가더라도 구단 프런트에 머문다. 구장 관리에 힘쓰는 이들을 단순히 경기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팬을 구단 수익을 올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함께하는 '우리'라고 인식했을 때 1000만 관중 시대에 걸맞은 KBO리그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랬을 때 브랜드 파워는 더더욱 커질 것이다.
야구 칼럼니스트
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당신이 좋아할 만한정보
AD
당신이 좋아할 만한뉴스
지금 뜨고 있는뉴스
행사&비즈니스
많이 본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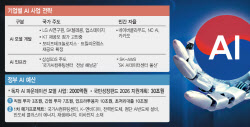
![[크레딧 체크포인트]건설지원 바쁜 호텔롯데, 재무 체력 약화 우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1/PS26012001062T.jpg)








![[포토] NCT 드림 지성, 으 추워라~~](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0/isp20260120000164.400x280.0.jpg)
![[포토] NCT 드림 지성, 귀여운 볼빵빵 손인사](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0/isp20260120000165.400x280.0.jpg)
![[포토] NCT 드림 지성, 남친룩의 정석](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0/isp20260120000166.400x280.0.jpg)
![[포토] NCT 드림 지성, '밥 먹었어?'](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0/isp20260120000163.400x280.0.jpg)
![[포토] NCT 드림 지성, 귀여운 곰돌이 인형 가방에 달고](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0/isp20260120000162.400x280.0.jpg)
![[포토] 스트레이 키즈 현진, 얼굴로 심장 공격](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0/isp20260120000155.400x280.0.jpg)
![[포토] 스트레이 키즈 현진, 데님 패션이 찰떡이야](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0/isp20260120000157.400x280.0.jpg)
![[포토] 스트레이 키즈 현진, 냉동고 추위 대한에도 패션 포기 못해](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0/isp20260120000158.400x280.0.jpg)
![[포토] 스트레이 키즈 현진, 섹시한 남자](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0/isp20260120000154.400x280.0.jpg)
![[포토] 스트레이 키즈 현진, 영화 속 한 장면](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0/isp20260120000156.400x280.0.jpg)
![[포토] 에이티즈 성화, 잘생겨서 줌인](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0/isp20260120000153.400x280.0.jpg)
![[포토] 에이티즈 성화, 귀여운 토끼 귀 포즈](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0/isp20260120000152.4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