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기자의 눈] '관중 감소, 콘텐트 파워 약화' KBO리그, 예비 스타 등장 절실
국민 타자로 불리던 이승엽(43)이 은퇴한 뒤 이어진 2017년 시상식 시즌. 단상에 올라 특별상을 받는 그를 보며 어우홍(88) 백인천(76) 이광환(71) 전 감독 등 야구계 야구 원로들은 입은 모아 "이제 한국 야구는 새로운 스타 발굴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해 이정후(21·키움)가 신인 선수 데뷔 시즌 최다 안타와 득점을 경신하며 신인왕에 올랐고, 이듬해는 강백호(20·KT)가 고졸 신인 한 시즌 최다 홈런 기록을 경신했다. 두 선수는 지난달 폐막한 프미미어12에서도 국제대회 경쟁력을 증명하며 한국 야구의 미래이자 현재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새 얼굴 등장을 향한 갈증은 여전하다. 한국 야구는 현재 위기다. 5년(2013~2017년) 연속 상승세던 리그 총관중 수가 2018년부터 꺾였다. 올 시즌은 728만6008명. 전년 대비 78만7734명이 줄었다. 경기당 관중 수도 1만1214명에서 1만119명으로 줄었다. 유튜브 시대로 콘텐트 경쟁이 심화됐다. 리그는 경기력이 저하됐고, 각종 불미스러운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스타 부재는 악재 가운데서도 단연 심각한 수준이다. 박병호(33·키움), 김현수(31·LG)가 빅리그에 진출한 뒤, 맞이한 2016시즌에는 해외 야구를 포함한 '야구' 콘텐트의 경쟁력이 강화됐다. 국내 리그 흥행 저하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2016시즌에는 인기 구단 두산과 LG가 동반으로 포스트시즌에 진출했다. 2017시즌은 롯데가 5년 만에 가을야구에 참전하며 흥행이 가능했다. 무엇보다 이 시기에는 이승엽, 이병규(현 LG 코치) 등 십 수 년 동안 한국 야구의 선양을 이끈 슈퍼 스타들이 현역을 지켰다. 이런 상황에서 또 관중 동원력이 있는 선수가 리그를 떠난다. SK 에이스던 김광현(31)이 메이저리그 도전을 시작했다. 국제대회에서 등록 일수를 채우고 포스팅 신청 조건을 갖춘 두산 4번 타자 김재환(31)도 같은 선택을 했다. 김광현은 꾸준히 해외 스카우트의 발걸음을 끌어들였고, 김재환도 수요가 있다는 평가다. 여기에 더스틴 니퍼트처럼 장수 용병으로 사랑받은 조쉬 린드블럼도 빅리그 진출을 노리고 있다. 리그 에이스 다른 한 축인 양현종(31·KIA)은 지난 6일 열린 일구상 시상식에서 김광현과 공동 대상을 받은 뒤 "내년에는 남아 있는 내가 (김)광현이 대신 KBO 리그를 잘 지키겠다"고 했다. 양현종의 각오는 곧 향후 한국 야구의 숙제다. 선수 한, 두 명이 이탈한다고 리그의 품격이나 경기력이 저하되는 건 아니다. 그러나 리그 대표 스타의 이탈은 소속팀 팬의 관심을 떨어뜨리고, 흥미를 유도하는 매치업이 소멸하며 개인 타이틀 경쟁 판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고무적인 점은 그 어느 때보다 위기론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다는 것이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조차 부정적인 소식을 전하지 않기 위해 주요 개정안을 받아들이려는 움직임이다. 구단은 일시적인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젊은 스타 등장을 유도하고 있다. 올 시즌도 성과가 있었다. 연말 시상식 신인왕 경쟁이 치열했다. 정우영(20·LG), 이창진(28·KIA), 김태진(24·NC)이 수상자가 됐다. 팬들이 주목할만한 선수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고우석(21·LG), 이영하(22·두산) 등 3~4년 차 젊은 투수들이 리그 정상급 기량을 보여준 점도 의미가 크다. 박세웅(25) 등 종전 리그 대표 유망주도 부상을 딛고 돌아왔다. 이대호(롯데), 정근우(LG) 등 가장 최근까지 한국 야구를 이끌던 1982년생들도 황혼기를 맞이한 상황. 한국 야구가 경쟁력을 갖춘 콘텐트로 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대의 도약이 절실하다. 안희수 기자
2019.12.10 0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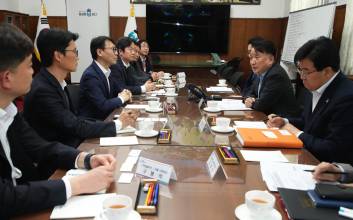









![[속보]산타랠리 제동…뉴욕증시 일제히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12/PS25123000110B.jpg)
![美 관세 뚫은 현대차, 비결은 슈퍼볼 마케팅[only 이데일리]](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12/PS25123000021T.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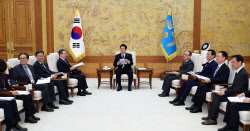






![[포토] 영케이, 귀여운 손인사](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25/isp20251225000212.400x280.0.jpg)
![[포토] SBS 가요대전 3MC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25/isp20251225000213.400x280.0.jpg)
![[포토] 엔시티 드림, 백마 탄 왕자님들 여기 다 모였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25/isp20251225000209.400x280.0.jpg)
![[포토] 엔시티 드림 마크, 귀엽게 팔 흔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25/isp20251225000211.400x280.0.jpg)
![[포토] 아이브 장원영, 눈맞춤에 심쿵](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25/isp20251225000207.400x280.0.jpg)
![[포토] 아이브 장원영, 럭키비키 워킹](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25/isp20251225000206.400x280.0.jpg)
![[포토] 아이브, 산타걸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25/isp20251225000208.400x280.0.jpg)
![[포토] 아이브 안유진, 아름다운 드레스 자태](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25/isp20251225000205.400x280.0.jpg)
![[포토] 스트레이 키즈, 멋진 무대 기대해 주세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25/isp20251225000204.400x280.0.jpg)
![[포토] 스트레이 키즈 필릭스, 왕자님 비주얼](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25/isp20251225000200.400x280.0.jpg)
![[포토] 스트레이 키즈 현진, 시크한 손인사](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25/isp20251225000203.400x280.0.jpg)
![[포토] 에이티즈 산, 멋진 손인사](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25/isp20251225000201.400x28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