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라인업 복붙’ 한국과는 달랐다…5명 바꾸고도 이긴 일본 “23명이 합작한 승리”
- 베트남도 주목한 중국의 ‘안세영 공포’…“中 선수를 이기는 건 흔한 일”
-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강인 향한 ATM의 집착
- “당신을 기릴 것”…LAL 르브론, 경기 없는 날 남긴 ‘경의의 메시지’ 화제
- 카리나, 휴가 중에도 봉사활동…SM 연습생 동료도 응원 (우발라) [TVis]
- 중국은 37%뿐…김상식의 베트남, 결승행 유력 ‘슈퍼 컴퓨터 수치’ 공개
- 261%·130% 폭등…두산 ‘내야 미래’ 오명진·박준순, 연봉 인상률 나란히 팀 내 최상위권
- "불의의 사고, 시간 걸릴 듯" 정관장 자네테, 얼마나 다쳤길래 [IS 장충]
- 김하성 부상→미지의 '유도영' WBC에서 실현? 김도영 "대표팀은 실험 무대 아냐" [IS 인터뷰]
- “눈 찔렸는데 비난하는 건 불공평하다” UFC에 개탄…친구가 답답함 토로했다
야구
인천구장 찾은 재일동포 야구단 1세대 주장 최태길
등록2011.04.08 20:35

"아, 참 많이도 좋아졌다."
재일동포 2세 최태길(75) 옹이 인천 문학구장을 둘러보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그땐 동대문 야구장 하나가 그나마 쓸만했지. 지방을 돌 때면 새끼줄로 외야펜스를 대신한 곳도 있었어. 참…. 감격스럽네." 55년전 기억을 더듬는 사이,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최 옹은 재일동포 야구단(1956~1997년)의 첫번째 주장이었다.
최 옹은 8일 SK와 삼성의 경기가 펼쳐진 인천 문학구장을 찾았다. 그가 한국의 경기장을 찾은 것은 1956년 이후 55년만의 일이다. 최 옹은 "친척들이 있으니 가끔 한국에 오곤 했다. 하지만 야구장을 찾지는 않았다"고 했다. 일본서 초·중·고·대학까지 야구 선수로 지냈던 '야구인 최태길 옹'이지만 한국에서는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꼭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 야구장을 찾지 않았다고.
최 옹은 "지난 해부터는 '한국 야구장에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후배 김성근이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감독이 되고, 일본에서도 명성을 떨치고 있다. 재일동포 신분으로 한국 야구의 명장이 된 그 모습을 꼭 보고싶었다." 소식을 들은 김성근(69) SK 감독은 최 옹에게 "꼭 한번 와 주십시오"라고 연락을 취했다. 김 감독은 1959년 재일동포 야구단 소속으로 한국을 찾았고, 1962년 영주귀국했다. '반쪽발이'라는 험한 말을 들으면서도 야구에 대한 열정을 놓치지 않았고, 한국시리즈 3회 우승에 빛나는 사령탑이 됐다.
최 옹은 "김 감독이 한국에서 야신으로 불린다고 하더라. 그 소식을 일본 신문을 통해 들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대견하고, 고맙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재일동포가 한국 야구 발전에 도움을 준 부분이 분명히 있다. 재일동포 야구단의 역할도 상당했다. 물론 재일동포 야구 선수들에게도 한국은 희망을 안겨줬다"고 떠올렸다.
이제 야구계를 떠난 최 옹의 생각도 같다. "1956년 한국에 처음 왔지.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야구단과 식사를 함께 하기도 했어. 내가 주장이었으니까, 여러분들과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꽃다발을 전해드리고, 받는 역할을 자주했지. 정을 주고 받는 기분이었어. 그렇게 따뜻한 시간을 보냈지." 그런데 왜 그는 한국 야구장을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 기피했을까. 질문을 받은 최 옹은 희미하게 웃기만 했다. 대답 대신 들려온 감격의 두 마디. "한국 야구가 이제 세계 최고 수준 아닌가. 이런 경기장도 있고, 경기력도 상당하고. 한국인이라는 것, 자랑스러워."
인천=하남직 기자 [jiks79@joongang.co.kr]
당신이 좋아할 만한정보
AD
당신이 좋아할 만한뉴스
지금 뜨고 있는뉴스
행사&비즈니스
많이 본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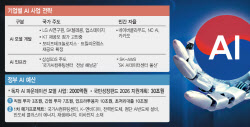
![[크레딧 체크포인트]건설지원 바쁜 호텔롯데, 재무 체력 약화 우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1/PS26012001062T.jpg)








![[포토] NCT 드림 지성, 으 추워라~~](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0/isp20260120000164.400x280.0.jpg)
![[포토] NCT 드림 지성, 귀여운 볼빵빵 손인사](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0/isp20260120000165.400x280.0.jpg)
![[포토] NCT 드림 지성, 남친룩의 정석](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0/isp20260120000166.400x280.0.jpg)
![[포토] NCT 드림 지성, '밥 먹었어?'](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0/isp20260120000163.400x280.0.jpg)
![[포토] NCT 드림 지성, 귀여운 곰돌이 인형 가방에 달고](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0/isp20260120000162.400x280.0.jpg)
![[포토] 스트레이 키즈 현진, 얼굴로 심장 공격](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0/isp20260120000155.400x280.0.jpg)
![[포토] 스트레이 키즈 현진, 데님 패션이 찰떡이야](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0/isp20260120000157.400x280.0.jpg)
![[포토] 스트레이 키즈 현진, 냉동고 추위 대한에도 패션 포기 못해](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0/isp20260120000158.400x280.0.jpg)
![[포토] 스트레이 키즈 현진, 섹시한 남자](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0/isp20260120000154.400x280.0.jpg)
![[포토] 스트레이 키즈 현진, 영화 속 한 장면](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0/isp20260120000156.400x280.0.jpg)
![[포토] 에이티즈 성화, 잘생겨서 줌인](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0/isp20260120000153.400x280.0.jpg)
![[포토] 에이티즈 성화, 귀여운 토끼 귀 포즈](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0/isp20260120000152.4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