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IS 스타] 데뷔 2년 차 ‘달리는 빅맨’ DB 김보배가 돌아본 2025년
- 탑, 솔로 컴백 예고…‘빅뱅 20주년’ 앞두고 “다중관점” [왓IS]
- [신년사] 정몽규 회장 “홍명보 감독이 사상 최고 성적 낼 수 있게 지원 아끼지 않겠다”
- "다른 팀에선 2군" 오승환 돌직구가 기폭제→고등학생에게도 질문하는 원태인, '운명의' 2026년 얼마나 더 성장할까
- ‘톰과제리’·‘싱글벙글쇼’ 성우 송도순 별세…향년 77세
- ‘대상 놓친’ 지석진, 홀대 논란 속 “응원, 모두 보고 있어” [왓IS]
- MLB '최악의 먹튀' 랜던, 결국 에이절스와 작별...2026년 연봉 550억원 꿀꺽
- 2024 김도영→2025 안현민...2026년 슈퍼스타 반열에 진입할 후보는
- ‘케미 퀸’ 김혜윤, 로몬도 구원할까…‘오늘부터 인간입니다만’ 16일 첫방
- ‘미스트롯4’ 마스터 예심 통과한 53팀 합격자 공개
연예
[차길진의 미스터리 Q] 골프사랑
등록2011.04.25 11:33
봄이 왔다. 전국의 산야에 꽃잎이 날리고 너른 들판은 초록으로 설렌다. 이렇게 좋은 봄날이면 나는 종종 씁쓸한 전화를 받는다. "법사님, 골프 치러 가셔야죠?" 물론 나와 아주 가까운 지인들의 반가운 목소리다.
작년만 해도 지인들과 골프 치는 게 인생의 낙이었다. 10여년 가까이 나는 골프에 빠져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1999년경 미국 뉴저지 후암정사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한국에 왔을 때까지만 해도 내게 골프는 그저 사치스런 스포츠였다.
하지만 지인 중 한 분이 내게 적극적으로 골프를 권했다. "법사님이 골프를 오해하시는 겁니다. 제가 잘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그 분의 강권에 나는 인정상 할 수 없이 골프채를 잡았다가 정신없이 골프에 빠져들었다.
골프엔 강력한 마력이 있었다. 바로 골프만이 주는 즐거움이다. 생각하는 즐거움, 자연과 벗하는 즐거움, 막간을 이용해 먹는 즐거움, 좋은 인연과 만나는 즐거움, 여기에 남이 오비 내는 것을 보는 즐거움까지. 이런 즐거움들 때문에 나는 골프를 정말 좋아하게 됐고 골프에 있어서만큼은 원하는 것을 다 얻었다. 모신문사가 주최한 연예인골프대회에서 칼럼리스트 자격으로 출전해 마지막 라운드 직전까지 1위를 지키다 74언더 2오버로 최종성적 2위를 기록해 모두를 놀라게 했고, 사이클 버디 투언더와 이글·홀인원까지 쳐봤다. 딱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알바트로스만은 못해본 것 정도랄까.
골프엔 추억도 많다. 골프칼럼리스트 K씨, 모영상사업단 P상무 등에게 소원이던 홀인원을 선물했고, 미국 LPGA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P선수가 슬럼프에 빠졌다가 나와 함께 빗속에서 라운딩을 돈 뒤 우승컵을 차지하기도 했다. 또 미국 알파인골프장에서는 과거 권력자로 의문사한 영가가 찾아와 함께 라운딩을 돌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골프를 칠 수 없다. 심각한 디스크 때문이다. 나는 의사의 설득에 결국 골프를 접기로 했다. 우선 갖고 있던 모든 클럽을 지인들에게 나눠줬다. 마지막으로 갖고 있던 클럽을 아들이 와서 달라고 했지만 왠지 추억으로 남겨두고 싶어 차마 주지 못했다.
정들었던 골프클럽을 나눠 주고 나니 조용필씨가 부른 '큐'라는 노래가 떠올랐다. 노래는 마치 사랑했던 애인을 떠나보내는 내용이지만 작사가인 양인자씨는 그런 의도로 만든 노래가 아니었다고 한다. 당시 양인자씨의 딸이 드라마 각본을 썼는데 드라마 제작할 때 큐사인을 보내는 것을 보고 '큐'를 작사했다고.
사연이야 어떻든 내게 골프는 영원한 '큐'가 되고 말았다. 너무나 가고 싶지만 더 이상 갈 수 없는 골프장. 18세가 되어야 성년이 되듯, 골프는 18홀을 다 돌아야 1라운드가 끝난다. 이븐 72타는 인간의 활동수명인 72세며 108mm, 10.8cm의 홀컵은 백팔번뇌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인다. 골프의 모든 수가 완전수인 9에서 시작되기에 골프를 잘 친다는 것은 인생을 통달한다는 의미와도 같았다.
이제 골프를 놔줘야 할 때가 왔다. 내게 골프는 담배를 끊듯 단칼에 끊는 매정함이 아니다. 조용필의 '큐'처럼 영원히 그리워하는 뜨거운 연모의 대상이다. 이번 생엔 골프와 이렇게 헤어지지만 다음 생엔 부디 오래오래 골프와 인연을 맺고 싶다. (hooam.com/ 인터넷신문 whoim.kr)
작년만 해도 지인들과 골프 치는 게 인생의 낙이었다. 10여년 가까이 나는 골프에 빠져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1999년경 미국 뉴저지 후암정사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한국에 왔을 때까지만 해도 내게 골프는 그저 사치스런 스포츠였다.
하지만 지인 중 한 분이 내게 적극적으로 골프를 권했다. "법사님이 골프를 오해하시는 겁니다. 제가 잘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그 분의 강권에 나는 인정상 할 수 없이 골프채를 잡았다가 정신없이 골프에 빠져들었다.
골프엔 강력한 마력이 있었다. 바로 골프만이 주는 즐거움이다. 생각하는 즐거움, 자연과 벗하는 즐거움, 막간을 이용해 먹는 즐거움, 좋은 인연과 만나는 즐거움, 여기에 남이 오비 내는 것을 보는 즐거움까지. 이런 즐거움들 때문에 나는 골프를 정말 좋아하게 됐고 골프에 있어서만큼은 원하는 것을 다 얻었다. 모신문사가 주최한 연예인골프대회에서 칼럼리스트 자격으로 출전해 마지막 라운드 직전까지 1위를 지키다 74언더 2오버로 최종성적 2위를 기록해 모두를 놀라게 했고, 사이클 버디 투언더와 이글·홀인원까지 쳐봤다. 딱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알바트로스만은 못해본 것 정도랄까.
골프엔 추억도 많다. 골프칼럼리스트 K씨, 모영상사업단 P상무 등에게 소원이던 홀인원을 선물했고, 미국 LPGA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P선수가 슬럼프에 빠졌다가 나와 함께 빗속에서 라운딩을 돈 뒤 우승컵을 차지하기도 했다. 또 미국 알파인골프장에서는 과거 권력자로 의문사한 영가가 찾아와 함께 라운딩을 돌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골프를 칠 수 없다. 심각한 디스크 때문이다. 나는 의사의 설득에 결국 골프를 접기로 했다. 우선 갖고 있던 모든 클럽을 지인들에게 나눠줬다. 마지막으로 갖고 있던 클럽을 아들이 와서 달라고 했지만 왠지 추억으로 남겨두고 싶어 차마 주지 못했다.
정들었던 골프클럽을 나눠 주고 나니 조용필씨가 부른 '큐'라는 노래가 떠올랐다. 노래는 마치 사랑했던 애인을 떠나보내는 내용이지만 작사가인 양인자씨는 그런 의도로 만든 노래가 아니었다고 한다. 당시 양인자씨의 딸이 드라마 각본을 썼는데 드라마 제작할 때 큐사인을 보내는 것을 보고 '큐'를 작사했다고.
사연이야 어떻든 내게 골프는 영원한 '큐'가 되고 말았다. 너무나 가고 싶지만 더 이상 갈 수 없는 골프장. 18세가 되어야 성년이 되듯, 골프는 18홀을 다 돌아야 1라운드가 끝난다. 이븐 72타는 인간의 활동수명인 72세며 108mm, 10.8cm의 홀컵은 백팔번뇌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인다. 골프의 모든 수가 완전수인 9에서 시작되기에 골프를 잘 친다는 것은 인생을 통달한다는 의미와도 같았다.
이제 골프를 놔줘야 할 때가 왔다. 내게 골프는 담배를 끊듯 단칼에 끊는 매정함이 아니다. 조용필의 '큐'처럼 영원히 그리워하는 뜨거운 연모의 대상이다. 이번 생엔 골프와 이렇게 헤어지지만 다음 생엔 부디 오래오래 골프와 인연을 맺고 싶다. (hooam.com/ 인터넷신문 whoim.kr)
당신이 좋아할 만한정보
AD
당신이 좋아할 만한뉴스
지금 뜨고 있는뉴스
행사&비즈니스
많이 본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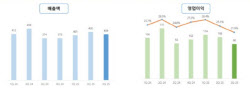








![[포토] 정소민, 파격적인 드레스 뒤태](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31/isp20251231000268.400x280.0.jpg)
![[포토] 정소민, 우아한 걸음걸이로 퇴장](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31/isp20251231000266.400x280.0.jpg)
![[포토] 정소민, 아름다움에 홀릭](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31/isp20251231000267.400x280.0.jpg)
![[포토] 김지훈, 카리스마 눈빛](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31/isp20251231000264.400x280.0.jpg)
![[포토] 김지훈, 걸음걸이도 완벽한 테리우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31/isp20251231000263.400x280.0.jpg)
![[포토] 김지훈, 턱시도 핏이 이렇게 잘 어울릴 일?](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31/isp20251231000265.400x280.0.jpg)
![[포토] 정소민, 아름다운 순백의 여신](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31/isp20251231000262.400x280.0.jpg)
![[포토] 정소민, 여신의 걸음걸이](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31/isp20251231000260.400x280.0.jpg)
![[포토] 전여빈, 러블리한 볼하트](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31/isp20251231000257.400x280.0.jpg)
![[포토] 정소민, 우아함 종결자](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31/isp20251231000261.400x280.0.jpg)
![[포토] 전여빈, 우아한 블랙 드레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31/isp20251231000259.400x280.0.jpg)
![[포토] 윤계상, 완벽한 슈트핏](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31/isp20251231000258.4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