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임성준, ‘우주를 줄게’ 캐스팅…노정의·배인혁 이웃으로 극 활력소 예고
- LG 캠프 찾은 '잠실 예수'의 진심 "그리운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
- ‘14G 공격포인트 20개 달성’ 손흥민, 첫 풀시즌 MLS 득점왕까지 가능할까
- '아직도 노골드' 쇼트트랙, 여자 계주로 막힌 금맥 캔다[2026 밀라노]
- 日 언론 "불운이 쌓인다, 한국 WBC 대표팀에 또 슬픈 소식"
- 2경기 연속 20점 넣고도 수비부터 말한 루키 문유현, "수비에 대한 열정 가지려 한다" [IS 안양]
- BTS 진, 설원 위 조각 비주얼…“우리 아미 즐설” [IS하이컷]
- BTS 진, 설원도 녹이는 ‘월드와이드 핸섬’ [AI포토컷]
- 대한항공, 호주 국대 출신 이든 활약에 드디어 웃다
- 조Pd ‘초코 라 파밀리아’ 안판&윤지 합류…예찬&태조와 시너지 기대
X
가장 많이 본 뉴스
야구
공석 중인 KBO 총재, 언제쯤 선임되나
등록2011.06.14 09:52

공석 중인 한국야구위원회(KBO) 새 총재는 언제쯤 선임될까.
유영구 전 총재의 사퇴로 KBO는 지난달 17일부터 이용일 총재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초대 KBO 사무총장이자 야구계 원로인 이 대행의 영입은 후임 총재 인선 과정에 대한 '관리 체제'라는 성격이다. 이 대행도 "유능한 총재를 모시는 게 내가 힐 일"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 대행은 최근까지 "이달 안에 후임 총재 인선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물밑 배경도 있었다. 이 대행 체제 발족 뒤 8개 구단 사장들은 한 가지 합의를 했다. 구단주 가운데 한 사람을 총재로 뽑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전임 유영구 총재에 대한 비판이 작용했다. 유 전 총재는 제9구단 창단을 둘러싸고 기존 구단들과 갈등을 빚었다. 표면적으로는 롯데 한 구단만 공식적으로 반대했지만 타 구단들도 KBO의 창단 드라이브에 불편함을 느꼈다는 전언이다. 제9구단에 대한 선수 지원에 기존 구단들이 적극 협조할 뜻을 비치지 않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KBO 이사회에서 총재가 직설적으로 공격받기도 했다.
결국 권위를 살리면서도, 구단 간 이해 관계를 조정하는 데는 외부 인사보다 내부 인사, 그것도 사장보다 '한 급' 높은 구단주 총재가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오너 구단주는 겸임이 어려우니, 비오너 구단주 가운데 한 명을 총회에 추천하자는 데 공감대가 이뤄졌다.
지난 주초까지만 해도 구체적인 후보가 거론됐다. 큰 이견도 없었다. 그러나 당사자인 A씨가 고사 뜻을 밝히면서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사장단은 지난 10일 골프 회동을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다시 적극적으로 설득해보자'라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
한 야구계 관계자는 "KBO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모양새를 갖춘 추대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후보들이 고사의 뜻을 굽히지 않는다면 후임 총재 인선은 6월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한 구단 사장은 "구단주 총재라는 합의는 허물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총재 추천은 이사회 75%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구단주 총재' 외 다른 대안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리라는 의미다.
최민규 기자 [didofido@joongang.co.kr]
당신이 좋아할 만한정보
AD
당신이 좋아할 만한뉴스
지금 뜨고 있는뉴스
행사&비즈니스
많이 본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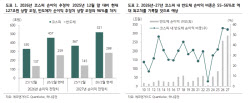









![[포토] 티파니 영, 미소에 홀릭](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35.400x280.0.jpg)
![[포토] 티파니 영-이찬원, 한터뮤직어워즈 MC 맡았어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37.400x280.0.jpg)
![[포토] 티파니 영, 우아함 종결자](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34.400x280.0.jpg)
![[포토] 티파니 영, 아름다운 드레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32.400x280.0.jpg)
![[포토] 티파니 영, 사뿐사뿐](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36.400x280.0.jpg)
![[포토] 티파니 영, 공주님 들어가십니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33.400x280.0.jpg)
![[포토] 이찬원, 팬분들 사랑해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30.400x280.0.jpg)
![[포토] 이찬원, 멋진 슈트핏](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31.400x280.0.jpg)
![[포토] 이찬원, 여유로운 MC의 입장](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29.400x280.0.jpg)
![[포토] 윤종신, 18년 만에 내는 정규앨범 기대해 주세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27.400x280.0.jpg)
![[포토] 윤종신, 인자한 손인사](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28.400x280.0.jpg)
![[포토] 이창섭, 감기투혼 포즈](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25.4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