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홍현희 “둘째 낳고 싶지만… 내년 마흔다섯, 쉽지 않다” (장공장장윤정)
- [TVis] 필릭스, 2억 기부부터 ‘이용복’ 흑역사(?)까지… ‘유퀴즈’서 솔직 고백
- 신지 “설렘보단 걱정”… ♥문원과 결혼 앞두고 ‘찐’ 고민
- [TVis] 스키즈 필릭스, 마마서 대상 받고 ‘뿌앵’… “옛날 생각나서” (유퀴즈)
- “박진영이 순금 20돈씩”… 필릭스, ‘유퀴즈’서 밝힌 역대급 선물 [TVis]
- 현빈, 손예진과 청룡 시상식 후일담… “각자 팀에서 회식” 폭소
- 제니, 대상 가수의 위엄… “너무 고마운 블링크” [IS하이컷]
- [TVis] 영화관·라운지바까지… 랄랄, 브라이언 대저택에 “진짜 변태” 경악 (슈돌)
- [TVis] 랄랄, 서빈이 첫 크리스마스에 식은땀… “돌잔치 다시 하는 줄” (슈돌)
- 선우용여 “아들, 고3 때 개밥 먹으며 버텨... 지금도 미안해”
스포츠일반
프로농구 외국인선수 “35만 달러? 웃돈 챙겨줘야 한국행”
등록2011.07.06 10:27

그들은 35만 달러 벌려고 한국에 오지 않는다."
프로농구 외국인선수 이면계약 실태가 드러나고 있다. 농구계에서는 외국인 선수를 결정한 7개 구단 대부분이 연봉 상한선 35만달러(약 3억7600만원)를 넘겼다는 게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외국인 선수 선발 방식이 드래프트에서 자유계약으로 바뀌었고, 팀당 두 명 보유에서 한 명 보유가 되면서 씀씀이가 더 커졌다. 외국인 선수 한 명으로 시즌 성적이 좌우되기에 각 구단이 규칙을 어기면서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의심을 받고 있는 A구단은 "인센티브 5만달러를 포함해 총 40만달러에 계약을 했다.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플레이오프·챔피언결정전 진출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는 별도 규정이 없다"고 여지를 남겼다. 추가 인센티브를 통해 얼마든지 연봉을 높일 수 있다는 뜻이다. 다른 구단도 대동소이하다. 대기업을 모기업으로 하는 일부 구단은 웃돈을 합쳐 100만달러(약 10억6000만원)를 넘는 거액을 쓴 것으로 보인다.
한국프로농구연맹(KBL)도 조사에 착수했다. KBL은 얼마 전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복수의 구단이 연봉 상한선을 넘겨 외국인 선수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편지를 받았다. 이에 각 팀에 8일까지 계약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장재홍 KBL 홍보팀장은 "제보자를 밝힐 수는 없지만 2팀 이상을 거론한 건 사실이다. 제출된 서류를 검토해 필요하다면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형식적인 조사 절차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한 구단 관계자는 "에이전트와 외국인 선수 본인만 입을 닫으면 절대 알 수 없는 사실이다. 또 추가 인센티브 조항은 밝힐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연봉을 파악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런 분위기면 10개 구단 모두 연봉 상한선을 넘길 것 같다. 외국인 선수 제도다 유명무실해졌다. 차라리 출신 리그 제한을 철저히 하는 게 더 낫다"고 주장했다.
이면계약이 적발되면 해당 외국인선수는 퇴출 되며 해당 팀은 다음 시즌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빼앗긴다. 또 제재금(최대 한도 10억원)이 부과된다.
김환 기자 [hwan2@joongang.co.kr]
당신이 좋아할 만한정보
AD
당신이 좋아할 만한뉴스
지금 뜨고 있는뉴스
행사&비즈니스
많이 본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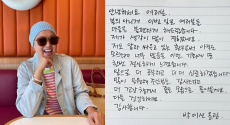














![[포토] 인사말 하는 김주영 작가](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23/isp20251223000265.400x280.0.jpg)
![[포토] 인사말 하는 작곡가 박병준](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23/isp20251223000266.400x280.0.jpg)
![[포토] 인사말 하는 김주연](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23/isp20251223000264.400x280.0.jpg)
![[포토] 인사말 하는 루나](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23/isp20251223000262.400x280.0.jpg)
![[포토] 인사말 하는 박수빈](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23/isp20251223000263.400x280.0.jpg)
![[포토] 인사말 하는 김선재 연출](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23/isp20251223000259.400x280.0.jpg)
![[포토] 말리들의 귀여운 하트 포즈](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23/isp20251223000261.400x280.0.jpg)
![[포토] 김주연-루나-박수빈, 말리들의 상큼함](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23/isp20251223000258.400x280.0.jpg)
![[포토] 김소율-김아진-박세윤, 어린 말리 역 맡았어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23/isp20251223000255.400x280.0.jpg)
![[포토] 조용히-조성필, '말리' 레비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23/isp20251223000254.400x280.0.jpg)
![[포토] '말리', 화이팅](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23/isp20251223000253.400x280.0.jpg)
![[포토] '말리', 많이 보러 오세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23/isp20251223000257.4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