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장상용 기자의 무대풍경] ‘햄릿’의 메탈과 털실
등록2013.12.23 19:25

메탈과 털실.
29일까지 명동예술극장에서 열리는 연극 '햄릿'을 읽는 두 가지의 코드다. 이번 버전은 배우 정보석이 햄릿 역을 처음으로 맡았기도 하지만 현대적으로 꾸민 무대라는 점에서 흥미로웠다.
오경택이 연출한 연극 '햄릿'의 무대는 온통 메탈이었다. 네모 형태의 메탈 조각들을 엮어 직조한 듯한 무대세트가 배경을 이루었고, 배우들이 드나들 때마다 금속 문은 휘어지며 기괴한 울음소리를 토해냈다.
"아, 너무나도 더럽고 질긴 육신이여! 녹고 또 녹아 차라리 이슬이 되어 버려라. 아니면 하늘의 태양아, 모든 것을 혼돈에 빠뜨려버려라!"라는 대사가 아니더라도, 햄릿의 육체는 이 무대에서 뭉개지고 으깨질 운명이었다. 거울과 메탈·금속액자가 지배하는 세상과 충돌해서 멀쩡할 수 있는 인간은 없을 테니까.
'햄릿' 전체에서 메탈의 프레임 밖에 있는 유일한 인물은 오필리어(전경수)였다. 햄릿이 "우린 모두 끔찍한 악당들이야. 아무도 믿지마.수녀원으로 가, 가버려!"라고 소리친 것은 그녀를 메탈의 프레임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시도일 지 모른다. 이 버전에서 오필리어는 털실을 잣다가 국왕 클로디어스의 경호원에서 납치된 후 물에 던져져 살해된다. 이 부분이 셰익스피어의 원작과 다른 해석의 포인트다. 원작은 미친 오필리어가 그냥 물에 빠져 죽은 것으로 돼있다. 오경택 연출은 이 사건을 햄릿과 레어티스를 이간질하려는 클로디어스의 계략으로 봤다.
클로디어스의 경호원이 오필리어를 납치할 때, 푸른색 조명을 받은 무대 뒤편은 물로 변한다. 오필리어가 끌려가는 방향으로 털실 한 가닥이 늘어지고, 무대에는 빨간 털실 뭉치만 남는다. 아름답고, 창의적인 무대 전환이었다. 오필리어의 털실은 테세우스가 미로를 빠져 나올 수 있도록 도운 미노스의 딸 아드리아네의 실을 연상케했다. 폴로니어스의 시체를 보려는 오필리어와 이를 막으려는 햄릿의 동작을 격렬한 춤으로 전환한 장면도 관객의 마음을 끌었다.
메탈의 무대에서 빨간 털실 한 뭉치는 사막에 핀 한 송이 꽃과 같은 역할을 한다. 만약 오필리어의 털실이 없었다면 오경택 연출의 '햄릿'은 관객을 짓누르는 강압적인 연극이 됐을지도 모르겠다. 이 포인트로 인해 '햄릿'은 구원받았다.
당신이 좋아할 만한정보
AD
당신이 좋아할 만한뉴스
지금 뜨고 있는뉴스
행사&비즈니스
많이 본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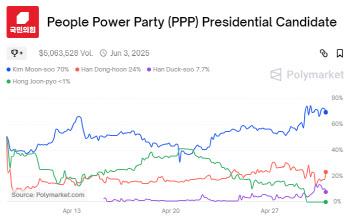











![[포토] 김태형 감독, 맹타 레이예스와 하이파이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4/30/isp20250430000303.400x280.0.jpg)
![[포토] 박세웅, 승리를 축하해](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4/30/isp20250430000302.400x280.0.jpg)
![[포토] 롯데, 키움에 진땀승](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4/30/isp20250430000300.400x280.0.jpg)
![[포토] 김원중-정보근, 이겼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4/30/isp20250430000298.400x280.0.jpg)
![[포토] 송성문 3점포, 1점만 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4/30/isp20250430000297.400x280.0.jpg)
![[포토] 송성문 3점포, 1점차 추격](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4/30/isp20250430000296.400x280.0.jpg)
![[포토] 송성문, 턱밑 추격 3점포](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4/30/isp20250430000295.400x280.0.jpg)
![[포토] 송성문, 9회말 터진 3점포](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4/30/isp20250430000294.400x280.0.jpg)
![[포토] 김원중, '내가 끝낸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4/30/isp20250430000292.400x280.0.jpg)
![[포토] 마무리 등판한 김원중](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4/30/isp20250430000291.400x280.0.jpg)
![[포토] 마무리 등판한 박시영](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4/30/isp20250430000290.400x280.0.jpg)
![[포토] 박시영, 9회 등판](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4/30/isp20250430000289.4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