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트롯 가수 황기동 결혼…영탁 사회·김장훈 축가에 화기애애 현장
- '구자욱표' 사이판 러닝크루, 괌에서 해체한 이유는? "러닝 훈련 엄청 많아" 땀범벅 옷에 선수들 만족도도 UP
- 정회린 “정경호 촬영장서 친근했던 선배... 섬세한 조언들 감사해” [인터뷰 ①]
- 이번엔 '기업 담합' 제동 걸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 포수 출신 나균안이 말하는 엘빈·비즐리..."스트레일리보다 더 낫다고 하더라" [IS 타이난]
- 정회린 “가수 우즈와 첫 영화 작품… 든든한 친누나 역할” [인터뷰 ②]
- 11일간 5연전 전승…KB ‘허강박’의 박지수가 있기에
- 로맥·니퍼트·오스틴도 못했던 '이것' 해낸 외국인 선수, 오타니급 메시지 화제
- [단독] “K팝 이끄는 주인공 모두 자랑스러웠죠”…비투비가 떠올린 KGMA 현장 [IS인터뷰]
- [IS포커스] 솔로 역량 총집합…‘완전체’ 아이브·블랙핑크, K팝 신 달군다
야구
트레이드를 자청한 선수, 누가 있었나
등록2016.05.12 06:00

프로야구 선수는 자유계약 신분이 아닌 이상 원하는 팀에서 뛸 권리가 없다.
신인 드래프트부터 구단의 선택에 따라 소속팀에 결정된다. 트레이드도 마찬가지다. 드물게 구단에 트레이드를 요청하는 선수도 있다. 원래 자리에서 밀려나는 베테랑, 혹은 같은 포지션에 쟁쟁한 라이벌이 너무 많아 좀처럼 자리를 잡지 못하는 선수의 경우다.
LG 김재박은 1992 시즌을 앞두고 구단에 트레이드를 요청했다. LG는 38세가 된 베테랑 김재박이 은퇴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김재박은 300도루(당시 -26개)와 1000안타(당시 -89개) 기록에 미련이 남았다.

구단에 선수 생활을 더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LG는 김재박을 조건 없이 태평양으로 보내주는 '아름다운 이별'을 택했다. 왕년의 슈퍼스타 김재박을 이적시켰지만, 선수나 현금을 대가로 받지 않았다. 김재박은 1년 더 현역 선수로 뛰며 별다른 활약 없이 은퇴했다.
그러나 태평양에서 코치로 자리 잡은 뒤 후신인 현대의 초대 감독으로 부임했다. 감독 김재박은 현대를 네 번 한국시리즈 우승으로 이끌었다.
해태 조계현은 1996년 한국시리즈 우승 이후 트레이드를 요구해 파문을 일으켰다. 8년간 팀 간판 투수로 활약했지만, 구단 재정난 속에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했다. 게다가 트레이드 루머가 흘러 나오면서 동료들과 불화까지 생겼다.
결국 스스로 "팀을 떠나는 게 낫겠다"고 나섰다. 그 해에는 일단 팀에 남았다. 구단 수뇌부와의 면담을 통해 마음을 가라 앉혔다. 그러나 1년 뒤이 1997년 말에 결국 삼성으로 현금트레이드됐다.
한화 조인성도 SK 시절이던 2014년 4월, 구단에 트레이드를 요청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와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 당시 SK는 소문을 강력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두 달 후 조인성은 한화로 이적했다.

두산 김재호도 좀처럼 팀에서 자리를 잡지 못했던 2012년 구단에 트레이드를 부탁한 적이 있다. 당시 김재호는 여러 팀에서 탐내는 백업 내야수였다. 그러나 트레이드는 결국 불발됐다. 지금은 전화위복이 돼 두산의 주전 유격수로 자리 잡았다.
반대로 다른 팀으로 트레이드되면 은퇴하겠다고 반발한 선수도 있었다. 천재 2루수로 명성을 날렸던 삼성 강기웅이 그 예다. 현대는 1996년 말 이희성과 최광훈을 삼성으로 보내고 베테랑 내야수 강기웅을 영입하는 트레이드를 진행했다.
그러나 대구고와 영남대를 나온 강기웅은 "삼성이 아닌 다른 팀에서 뛰지 않겠다"며 돌연 은퇴를 선언했다. 현대는 졸지에 선수 두 명을 그냥 삼성으로 보내고 먼 산을 바라봐야 했다.
배영은 기자
당신이 좋아할 만한정보
AD
당신이 좋아할 만한뉴스
지금 뜨고 있는뉴스
행사&비즈니스
많이 본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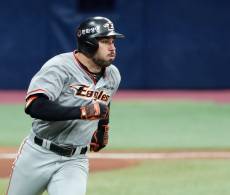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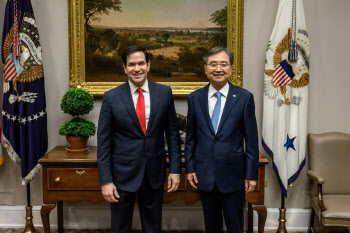
![뉴욕증시 일제히 하락…앤스로픽 공포에 소프트웨어株 흔들[월스트리트in]](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0400185T.jpg)










![[포토] 나빌레라, 화려한 엔딩](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3/isp20260203000232.400x280.0.jpg)
![[포토] 나빌레라, 우아하게 날아오르는 나비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3/isp20260203000231.400x280.0.jpg)
![[포토] 나빌레라 릴라, 치명적인 엔딩 포즈](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3/isp20260203000230.400x280.0.jpg)
![[포토] 나빌레라 릴라, 치명적인 분위기](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3/isp20260203000229.400x280.0.jpg)
![[포토] 나빌레라 애니, 우아한 나비 무브먼트](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3/isp20260203000228.400x280.0.jpg)
![[포토] 나빌레라 사야, 귀여운 똑단발](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3/isp20260203000227.400x280.0.jpg)
![[포토] 나빌레라, 멋진 나비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3/isp20260203000226.400x280.0.jpg)
![[포토] 나빌레라, 뛰어~](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3/isp20260203000225.400x280.0.jpg)
![[포토] 나빌레라, 신나는 '노리미트' 무대](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3/isp20260203000224.400x280.0.jpg)
![[포토] 나빌레라, 우아한 나비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3/isp20260203000223.400x280.0.jpg)
![[포토] 나빌레라, 군무 착착](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3/isp20260203000222.400x280.0.jpg)
![[포토] 나빌레라, 쿵짝쿵짝](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3/isp20260203000218.4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