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TVis] “예비 시댁서 1년 동거” 며느리 평가 요구…12살 연상과 결혼 고민 (‘물어보살’)
- [TVis] ‘땡벌’ 강진 “라면 씻어 먹어…김밥도 시금치, 당근만” (‘물어보살’)
- 신동엽, “첫사랑과 결혼” 황재균 위로 “이혼은 죄 아냐” (‘짠한형’)
- 李 대통령, ‘골든’ K팝 최초 그래미 수상에 “값진 성과, 뜨거운 축하”
- '허웅 51점 대폭발' KCC, SK에 대승...허웅은 신기록 잔치 [IS잠실]
- 박지수 23점 17R…KB, BNK 격파하고 5연승
- “죽도록 보고싶어” 그리움 절절…故서희원 1주기, 구준엽 친필 편지+조각상 제작 [종합]
- 구준엽, 故서희원 1주기 절절한 그리움…”한없이 눈물, 죽도록 보고싶어” [전문]
- 류현진, ♥배지현에 적극 플러팅…”美서 쉬지 않고 연락” (‘짠한형’)
- “계속 바뀌는데 무슨 사랑이냐”…황재균, ‘아나운서 킬러’ 시절 소환 ‘당황’ (‘짠한형’)
야구
'6년 947⅔이닝' 윤성환이 말하는 이닝이터의 금기
등록2016.09.06 07:00

삼성 윤성환(35)은 2011년 이후 KBO리그에서 가장 많은 이닝을 던진 투수다.
최근 6시즌 동안 총 947⅔이닝을 던졌다. 이 기간 동안 900이닝을 넘긴 투수는 윤성환 외에 외국인 투수 더스틴 니퍼트(두산·910⅔이닝) 밖에 없다. 그 뒤로 3위 헨리 소사(LG)가 800⅓이닝, 4위 송승준(롯데)이 791⅓이닝, 5위 양현종(KIA)이 779이닝을 각각 기록했다. 다른 투수들과 격차가 크다.
그 누구보다 견고했던 여섯 시즌이었다. 6년 내내 경기 평균 6이닝을 버텼다. 총 투구수도 1만5025개에 달한다. 그동안 니퍼트가 1만4985구, 송승준이 1만3928구, 소사가 1만3199구, 양현종은 1만3167구를 뿌렸다. 투구수 역시 윤성환이 1위다. 나이가 30대 중반인 점을 고려하면 더 놀라운 수치다.
삼성 마운드는 올해 부침이 심했다. 여러 투수가 부상과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윤성환은 변함없이 자리를 지켰다. 올 시즌 팀에서 유일하게 규정이닝을 넘겼다. 올해 1군 엔트리에서 단 한 번도 제외되지 않은 삼성 투수도 윤성환과 백정현뿐이다. 지난 6시즌 동안 꾸준히 로테이션을 지키면서 경기 평균 98.8개의 공을 던졌다.
여러 비결이 있다. 루틴을 엄격하게 지켰고, 몸관리는 더 엄격하게 했다. 윤성환은 여기에 또 하나를 강조했다. "책임감이나 욕심 때문에 무리하면 안 좋다"는 것이다.
그는 스스로 "한 경기에서 투구수 100개 정도를 던지는 게 나에게는 여러 면에서 가장 좋은 것 같다"고 했다. "똑같은 바깥쪽 커브를 던져도 30개 이내에서 던지는 것과 80구, 90구를 넘겨서 던지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내가 얼만큼 던져야 잘 할 수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잘 지켜야 꾸준히 유지를 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장점이 약점으로 둔갑하는 것은 순식간이다. 한 타자에게 잘 통했던 공을 그 다음 타석에서 똑같은 코스로 다시 던진다고 해서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베테랑 선발 투수인 윤성환도 매 경기 "그래서 야구는 어렵다"고 느낀다.

윤성환은 7이닝 2실점으로 호투하고도 승리 투수가 되지 못했던 3일 잠실 두산전을 예로 들었다. 그는 "6회까지 100개를 채웠다. 원래 내 페이스대로라면 7회에 안 나가는 게 맞다. 그러나 경기가 동점 상황이었고, 팀이 이기려면 내가 한 이닝을 더 던져아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7회에도 나갔다"며 "그런 마음이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나중에 후회하는 순간도 온다"고 설명했다. 윤성환은 그 경기에서 투구수 111개를 기록했다.
에이스의 숙명이기도 하다. 이기고 싶다는 승부욕, 팀 승리를 이끌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이닝 이터들의 어깨를 움직인다. '한 타자만 더', '한 이닝만 더'를 다짐하다 남들보다 투구 이닝이 늘어난다. 윤성환은 그 연장선상에서 KIA의 왼손 에이스 양현종 얘기를 꺼냈다.
"가끔 보면 투구수가 좀 많게 느껴져서 걱정될 때도 있다. 사실 그 마음이 뭔지 나도 잘 안다. 현종이가 에이스로서 책임감도 있고, 승부가 타이트할 때는 내가 더 던져야 한다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라고 했다. 올해 양현종은 선발 등판 경기 평균 투구수가 105.4개로 전체 4위다. 총 171⅓이닝을 던졌다. 한 경기 최다 투구수는 121개(7월 30일 문학 SK전)다.
윤성환은 "경험상 내가 내 상태보다 많이 던졌다 싶으면 후유증이 온다. 그 후유증은 당장이 아니라 내년이 될 수도 있고, 내후년이 될 수도 있다. 결국 그런 게 쌓이는 것 같다"며 다시 한번 "당장 이기고 싶은 마음보다 무리하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했다.
6년 투구 이닝이 1000이닝에 육박하는 베테랑 투수의 경험담이다.
배영은 기자
당신이 좋아할 만한정보
AD
당신이 좋아할 만한뉴스
지금 뜨고 있는뉴스
행사&비즈니스
많이 본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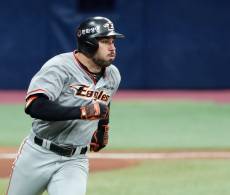





![[마켓인] 바이아웃만으론 부족…글로벌 PE, 사모대출 역량 다지기 박차](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0201731T.jpg)










![[포토]채수빈, 호기심 발동!](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1/isp20260201000212.400x280.0.jpg)
![[포토]채수빈, 작은 얼굴에 '도대체 몇등신이야?"](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1/isp20260201000211.400x280.0.jpg)
![[포토]채수빈, 미소로 주위를 밝히는 마법 시전](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1/isp20260201000207.400x280.0.jpg)
![[포토]채수빈, 수줍은 미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1/isp20260201000206.400x280.0.jpg)
![[포토]채수빈, 눈빛만으로 '분위기 여신'](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1/isp20260201000204.400x280.0.jpg)
![[포토]채수빈, 현실감 떨어지는 비율](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1/isp20260201000203.400x280.0.jpg)
![[포토]채수빈, 청순함 가득 담아 '하트'](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1/isp20260201000202.400x280.0.jpg)
![[포토]채수빈, 오늘은 하트 요정](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1/isp20260201000201.400x280.0.jpg)
![[포토]채수빈, 하트 더하기 애교](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1/isp20260201000200.400x280.0.jpg)
![[포토]채수빈, 팬들 선물에 함박미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1/isp20260201000199.400x280.0.jpg)
![[포토]채수빈, 청순 하트](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1/isp20260201000198.400x280.0.jpg)
![[포토]이주빈, 날씨만큼 화사한 출국길](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1/isp20260201000182.4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