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화장실에 비데를…" 무라카미 마음 사로잡은 화이트삭스의 비결
- ‘이혼 8년차’ 송영길 “첫째, ‘엄마 생겼으면 좋겠다’고…쉽지 않다” (니맘내맘)
- 박진희X남상지→최재성X김희정…‘붉은 진주’ 압도적 카리스마 7인 포스터 공개
- 연우X김현진, ‘러브포비아’ 상극 케미스트리 메인 포스터 공개
- 뉴진스와 이별한 민희진 “커밍 순”…모레(5일) 깜짝 발표 예고
- 150㎞ 던지는 1m70㎝ 최단신 NC 토다...포수 김형준 "작은 키 안 느껴져"
- [영상] 오메가엑스 재한-예찬, “안구정화 타임”… 비주얼도 오메가급
- [영상] LUCY 조원상-신예찬, ’찐친 케미 가득’…웃음꽃 피운 패션위크 나들이
- [영상] 로켓펀치 수윤, ‘여전한 요정 비주얼’….패션위크 수놓은 반가운 발걸음
- [영상] 펜타곤 후이, 훈훈함 한도 초과… '오늘도 입덕 유발 중'
연예
[차길진의 갓모닝] 538. 도둑을 쫓는 법
등록2016.10.20 07:00
자유당 정권 때 한 유명한 철학자가 기자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다. 기자는 그 당시 논쟁이 됐던 법에 대해서 철학자에게 물었다. “이 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철학자는 즉답은 피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행복한 나라에는 행복한 법이 있고, 불행한 나라에는 불행한 법이 있습니다.”
지난 달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된 뒤 사회분위기가 바뀌었다.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더치페이 앱이 애용되고 있다. 식당에서는 함께 먹어도 계산은 따로 하는 더치페이가 점차 생활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저녁시간 회식이 줄어든 직장인들은 영화관이나 헬스장을 찾는 등 자기개발에 몰두하게 됐다.
학교 풍경도 달라졌다. 교문 경비실 앞에는 커다한 보관함이 비치됐다. 혹시라도 김영란법을 잘 모르고 있던 학부모가 교직원들에게 가져온 선물이 있다면 보관함에 보관했다가 돌아가는 길에 찾아가라는 의미다. 가을 소풍 때도 학부모가 선생님들에게 간식과 도시락을 줄 수 없다. 그러다보니 소풍·운동회·학부모 면담처럼 민감한 시기가 오면 선생님도 학부모도 서로 조심하게 됐다.
아직 시행된 지 한 달이 되지 않았기에 김영란법이 좋다, 나쁘다를 거론할 시기는 아니다. 다만 변화된 풍경이 사뭇 예사롭지 않다. 일선에서는 김영란법을 칭찬하는 사람들도 많다. 불편한 선물공세에 시달렸던 실무자들은 이제야 자신의 뜻대로 일할 수 있게 됐다며 기뻐하고 있다. 또 상관들로부터 압력을 행사하는 전화도 걸려오지 않아 신세계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한다.
반면 김영란법으로 힘들어진 사람들도 많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예전과 달라진 매출에 한숨을 쉬고 있다. 식당·꽃가게·주류취급점 등 소위 ‘접대문화’ ‘선물문화’로 매출을 확보했던 업체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또한 외국 바이어들도 김영란법으로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는 소문이다. 과거 한국과 거래할 때를 생각하고 찾아온 바이어들은 180도 달라진 접대문화에 계약서의 사인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졌다.
도둑을 잡는 기계를 만들면 망하고, 도둑을 쫓는 기계를 만들면 흥한다는 말이 있다. 바꿔 말하면 도둑을 잡는 기계는 마치 이 세상 도둑 전부가 사라질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다. 도둑을 잡는 기계가 처음에는 잘 팔리는 것 같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더 이상 팔리지 않는다. 직접 잡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반면 도둑을 쫓는 기계는 그런 부담이 없으니 판매량은 늘어난다. 즉 사실과 현실은 다르다는 것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사회를 청렴하게 만드는 법이다. 하지만 도둑을 잡는 법은 오래가지 못한다. 도둑들은 법망을 피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기 마련이다. 좋은 법을 만들기보다는 국민의 교양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다.
김영란법은 법이 없어서 만든 법이 아니다.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싶지만 중요한 것은 법을 지키려는 사회구성원들의 도덕심과 의식수준이다. 김영란법으로 잔뜩 움츠러진 사회를 바라보며 문득 자유당 때 ‘행복한 법, 불행한 법’을 얘기했던 철학자의 촌철살인 한 마디가 떠오른다.
(hooam.com/ 인터넷신문 whoim.kr)
지난 달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된 뒤 사회분위기가 바뀌었다.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더치페이 앱이 애용되고 있다. 식당에서는 함께 먹어도 계산은 따로 하는 더치페이가 점차 생활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저녁시간 회식이 줄어든 직장인들은 영화관이나 헬스장을 찾는 등 자기개발에 몰두하게 됐다.
학교 풍경도 달라졌다. 교문 경비실 앞에는 커다한 보관함이 비치됐다. 혹시라도 김영란법을 잘 모르고 있던 학부모가 교직원들에게 가져온 선물이 있다면 보관함에 보관했다가 돌아가는 길에 찾아가라는 의미다. 가을 소풍 때도 학부모가 선생님들에게 간식과 도시락을 줄 수 없다. 그러다보니 소풍·운동회·학부모 면담처럼 민감한 시기가 오면 선생님도 학부모도 서로 조심하게 됐다.
아직 시행된 지 한 달이 되지 않았기에 김영란법이 좋다, 나쁘다를 거론할 시기는 아니다. 다만 변화된 풍경이 사뭇 예사롭지 않다. 일선에서는 김영란법을 칭찬하는 사람들도 많다. 불편한 선물공세에 시달렸던 실무자들은 이제야 자신의 뜻대로 일할 수 있게 됐다며 기뻐하고 있다. 또 상관들로부터 압력을 행사하는 전화도 걸려오지 않아 신세계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한다.
반면 김영란법으로 힘들어진 사람들도 많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예전과 달라진 매출에 한숨을 쉬고 있다. 식당·꽃가게·주류취급점 등 소위 ‘접대문화’ ‘선물문화’로 매출을 확보했던 업체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또한 외국 바이어들도 김영란법으로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는 소문이다. 과거 한국과 거래할 때를 생각하고 찾아온 바이어들은 180도 달라진 접대문화에 계약서의 사인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졌다.
도둑을 잡는 기계를 만들면 망하고, 도둑을 쫓는 기계를 만들면 흥한다는 말이 있다. 바꿔 말하면 도둑을 잡는 기계는 마치 이 세상 도둑 전부가 사라질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다. 도둑을 잡는 기계가 처음에는 잘 팔리는 것 같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더 이상 팔리지 않는다. 직접 잡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반면 도둑을 쫓는 기계는 그런 부담이 없으니 판매량은 늘어난다. 즉 사실과 현실은 다르다는 것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사회를 청렴하게 만드는 법이다. 하지만 도둑을 잡는 법은 오래가지 못한다. 도둑들은 법망을 피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기 마련이다. 좋은 법을 만들기보다는 국민의 교양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다.
김영란법은 법이 없어서 만든 법이 아니다.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싶지만 중요한 것은 법을 지키려는 사회구성원들의 도덕심과 의식수준이다. 김영란법으로 잔뜩 움츠러진 사회를 바라보며 문득 자유당 때 ‘행복한 법, 불행한 법’을 얘기했던 철학자의 촌철살인 한 마디가 떠오른다.
(hooam.com/ 인터넷신문 whoim.kr)
당신이 좋아할 만한정보
AD
당신이 좋아할 만한뉴스
지금 뜨고 있는뉴스
행사&비즈니스
많이 본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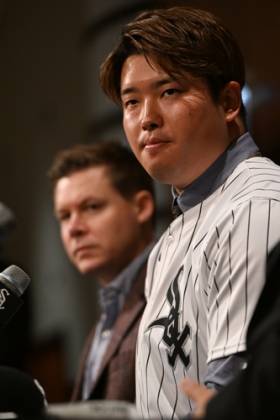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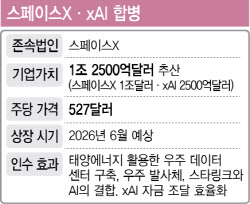








![[포토] 나빌레라, 화려한 엔딩](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3/isp20260203000232.400x280.0.jpg)
![[포토] 나빌레라, 우아하게 날아오르는 나비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3/isp20260203000231.400x280.0.jpg)
![[포토] 나빌레라 릴라, 치명적인 엔딩 포즈](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3/isp20260203000230.400x280.0.jpg)
![[포토] 나빌레라 릴라, 치명적인 분위기](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3/isp20260203000229.400x280.0.jpg)
![[포토] 나빌레라 애니, 우아한 나비 무브먼트](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3/isp20260203000228.400x280.0.jpg)
![[포토] 나빌레라 사야, 귀여운 똑단발](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3/isp20260203000227.400x280.0.jpg)
![[포토] 나빌레라, 멋진 나비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3/isp20260203000226.400x280.0.jpg)
![[포토] 나빌레라, 뛰어~](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3/isp20260203000225.400x280.0.jpg)
![[포토] 나빌레라, 신나는 '노리미트' 무대](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3/isp20260203000224.400x280.0.jpg)
![[포토] 나빌레라, 우아한 나비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3/isp20260203000223.400x280.0.jpg)
![[포토] 나빌레라, 군무 착착](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3/isp20260203000222.400x280.0.jpg)
![[포토] 나빌레라, 쿵짝쿵짝](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3/isp20260203000218.4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