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UFC 전설’ 42세 스완슨, 최두호와 명예의 전당→그때 기량 아닌데…“멋진 싸움 해보자” 24세 신예의 가혹한 콜아웃
- PSG 동료들 껑충 뛰었는데…‘2008년생 유망주와 동급’ 이강인 몸값은 2500만 유로 ‘유지’
- “4강은 가야죠” 2026년 韓 축구 스타트 끊는 이민성호
- ‘♥김지민’ 김준호, 신혼 ‘굴욕’…‘돌싱포맨’ 종영 걱정만 [TVis]
- ‘연 광고매출 100억’ 야노시호 “♥추성훈, TV 보고 반해…연락처 수소문” (돌싱포맨) [TVis]
- 이혜정 “‘♥이희준’ 베드신에 알레르기까지…나랑 연습하고 가라고” (돌싱포맨) [TVis]
- 이혜정, ‘♥이희준’과 첫만남에 선뽀뽀 “짜릿했다” (돌싱포맨) [TVis]
- 야노시호 “♥추성훈, 통장 각자 관리…나한테 월세 줘”(돌싱포맨) [TVis]
- [IS리뷰] ‘아바타: 불과 재’ 시리즈의 정수, 시리즈의 정점 [무비로그①]
- 4조 신화 이어간다…‘아바타: 불과 재’, 전세계 흥행 1위 ‘아바타’에 도전장 [무비로그②]
야구
[김인식의 클래식]단장과 감독, 서로 의논하며 함께 가야 한다
등록2016.11.30 11:00

우리 프로야구 역사가 35년이다. 최근 들어 야구단 단장의 중요성이 화제에 오르고 있다. 진작부터 나왔어야 했다. 오히려 조금 늦은 감이 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제너럴 매니저(General Manager·단장)가 선수를 사고 팔고 트레이드하는 부문을 모두 총괄하고 있다. 단장은 팀에 어느 포지션이 필요한지, 약점을 메우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프로야구단 운영에서 중요한 역할이다.
일본은 우리보다 프로야구 역사가 훨씬 오래됐다. 하지만 단장 역할이 어느 정도 정착되기까지 70년 가까이 걸렸다. 아직까지도 완성된 상황은 아니다. 단장 직함이 없는 구단도 있다.
1993년과 1994년 다이에 호크스(소프트뱅크의 전신) 감독을 맡았던 네모토 리쿠오씨는 세이부 전성기 시절 관리부장으로 일했던 인물이다. 뛰어난 행정 능력으로 다이에에서 프로야구 사령탑까지 맡았다. 오 사다하루에게 지휘봉을 넘긴 뒤에는 다시 다이에 사장 자리까지 오르는 능력을 발휘했다.
네모토 뒤로는 나와 친분이 있는 야마나카 마사타케씨가 획기적인 사례를 남겼다. 야마나카는 호세이대학을 나온 투수였다. 체격이 왜소해 프로 선수는 되지 못했다. 그러나 대학 시절 아마추어에서 여러 기록을 세웠다. 프로선수 출신이 아닌 데도 일본 야구계에서 인정을 받았고, 일본 올림픽 대표팀 감독까지 역임했다. 그 야마나카씨가 2004년 요코하마 단장으로 취임했다. 일본로야구에서 최초로 배출된 선수 출신 단장이었다. 일본프로야구도 70년 동안 이런 저런 시도를 하면서 차차 시스템을 정립해온 것이다.
우리도 요즘 단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내 생각엔 미국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가장 중요한 게 팀워크라고 본다. 감독과 단장이 잘 융합해 팀을 끌고 가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다. 감독도 너무 권위의식을 가져서는 안 되고, 단장도 야구를 잘 모르면서 아는 척을 하면 안 된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떠오르는 단장이 한 명 있다. 한화 감독 시절에 만났던 송규수씨다. 그분이 내게 와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 "나는 야구를 잘 모른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선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 그 분이 어떻게 야구를 전혀 모르겠는가. 그러나 "현장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모른다"고 먼저 인정을 한 것이다.
그 분은 몇 년 뒤 한화 단장을 그만 두고 프로축구 대전 시티즌 사장으로 옮겨 갔다. 처음에는 빈 자리가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 조금 지나니까 코치들과 선수들이 "그 단장님이 참 잘 하셨다"고들 했다. 말이야 "야구 모른다"고 했지만, 알고 보면 가장 좋은 단장이었던 것이다. 오히려 야구를 모르면서 아는 척을 하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서로가 권위의식을 버려야 한다. 단장과 감독이 팀을 위해 합심하고, 지속적으로 의논을 해야만 팀을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다.
물론 미국과 한국의 프로야구에는 차이가 분명히 있다. 미국은 야구단이 그 자체로 하나의 회사다. 그러나 한국은 넥센 한 팀만 빼놓고는 모두 대기업 산하다. 그러니 모그룹에서 내려오는 단장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럴 땐 다른 게 없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때로는 현장에 맡기기도 하면서, 꾸준히 의논을 하는 것이다. 현장에 있는 감독보다 야구를 더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서로 상의를 해서 잡음 없이 함께 가는 게 진짜 '팀워크'다.
프런트 사람들은 회사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 없다. 반대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회사라는 조직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런 게 쌓이면 오해를 하게 되고 자꾸 의견 충돌이 생긴다. 그런 차이점을 서로 이해하려고 해야 서로 모르는 부분을 알 수 있다. 서로 마음이 맞추고 양보를 해야 한다는 얘기다.

최근에는 야구를 하던 사람이 단장을 맡기도 한다. 그런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다. 두산과 SK가 그렇게 해왔고, 최근에 한화도 현장 출신 단장을 임명했다. 야구인들은 그런 인물들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현장 출신 단장이 많이 나오는 건 좋은 현상이라고 본다. '바람직한 방향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잡음이 나오면 더 곤란해질 것 같다. 서로 의논을 해야 팀이 제대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해 본다. 구단의 사장과 단장은 적어도 10년씩은 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일도 겪어 보고, 저런 일도 겪어 봐야 제대로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 '내가 실수했다'고 느낄 새도 없이, 야구단 운영에 대해 조금 알 만 하면 사장과 단장이 바뀌는 구단도 많다. 그렇게 되면 사장이 열성팬들보다 야구를 더 모르는 상황에 놓이는 것이다. 잘 하든, 못 하든 10년을 지켜보며 기다리는 것도 제대로 야구단을 운영하는 방법인 것 같다.
김인식 KBO 규칙위원장
정리=배영은 기자
당신이 좋아할 만한정보
AD
당신이 좋아할 만한뉴스
지금 뜨고 있는뉴스
행사&비즈니스
많이 본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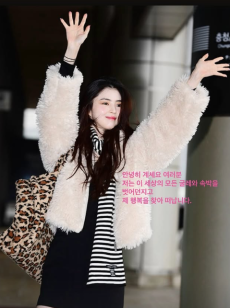





![[마켓인] IPO 앞둔 무신사…10조 몸값 ‘격차 메우기’ 관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12/PS25121601191T.jpg)
![[마켓인]‘美 백기사’ 확보한 고려아연…법적 공방 쟁점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12/PS25121601184T.jpg)









![[포토] 프로젝트 Y, 화이팅!](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16/isp20251216000263.400x280.0.jpg)
![[포토] 프로젝트 Y, 기대되는 라인업](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16/isp20251216000261.400x280.0.jpg)
![[포토] 프로젝트 Y, 주역들의 귀여운 Y 포즈](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16/isp20251216000262.400x280.0.jpg)
![[포토] 프로젝트 Y, 빛나는 주역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16/isp20251216000260.400x280.0.jpg)
![[포토] 한소희, 귀엽게 'Y' 포즈~](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16/isp20251216000257.400x280.0.jpg)
![[포토] 한소희-전종서, 둘의 케미 기대해 주세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16/isp20251216000259.400x280.0.jpg)
![[포토] 한소희, 아름다운 여신](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16/isp20251216000258.400x280.0.jpg)
![[포토] 전종서, '프로젝트 Y' 기대해 주세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16/isp20251216000256.400x280.0.jpg)
![[포토] 전종서, 아름다운 자태](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16/isp20251216000253.400x280.0.jpg)
![[포토] 김신록, 사랑스러운 미소 머금고](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16/isp20251216000254.400x280.0.jpg)
![[포토] 김신록, 젠틀한 분위기](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16/isp20251216000255.400x280.0.jpg)
![[포토] 정영주, 카리스마 넘치는 패션](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16/isp20251216000252.4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