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최대한 빨리 돌아오고 싶다" 전 LG 클로저, 6개월 만의 실전 최고 148㎞...다음 주에 오나
- '초크 2.0' '붕괴' 1994년 밀러의 악몽을 소환한 할리버튼, 뉴욕 언론도 놀랐다
- 거짓말 같던 만루포의 순간, 임종성은 "다리가 너무 떨렸다"며 웃었다 [IS 스타]
- 자이언트스텝 vs 원평스톰 vs 늘가을…1600m 최강 가리자
- 이영애X김성령, 남다른 우정 과시…‘헤다 가블러’ 응원 인증샷 ‘훈훈’
- [TVis] 고향 오사카 방문한 추성훈 “야쿠자 된 친구들 몇 명은 죽어” (홈즈)
- [TVis] 추성훈, 오사카 임장 떠나 무릎 꿇은 이유…“아버지 기일” (홈즈)
- 이정현 “20대 때부터 꾼 꿈, 드디어 데뷔” (편스토랑)
- ‘언슬전’ 강유석, 하이보이즈로 ‘엠카’ 출격…신시아·한예지 응원 포착
- '흐름 바꾼 내야안타' 역전 발판 오명진 "전력질주 당연...임종성 만루포, 내 것만큼 짜릿" [IS 스타]
야구
모두 공감하는 'FA 등급제', 실행되지 않는 이유
등록2016.12.19 06:00

KBO와 구단·선수 모두 'FA(프리에이전트) 등급제'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왜 실행되지 않을까.
늘 그렇지만 올해는 FA 시장에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심해졌다. 최형우가 KIA 유니폼을 입으면서 공식 발표액 기준으로 사상 첫 '100억원(4년 총액)' 선수가 됐다. 'LG맨'이 된 차우찬은 4년 95억원에 도장을 찍어 투수 최고 계약 기록(종전 KIA 윤석민 90억원)을 갈아 치웠다. 그러나 30대 중반이 넘은 베테랑 FA들의 겨울은 춥다. 정성훈과 봉중근, 이진영, 조영훈은 아직 계약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다. 용덕한은 현역 은퇴를 선언하고 지도자의 길을 택했다.
원소속 구단에 보상금과 보상선수를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현 FA 보상 제도가 장애물로 꼽힌다. 원 소속 구단은 '보상선수(보호 선수 20인 외 1명)+전년도 연봉의 200%' 또는 '전년도 연봉의 300%'를 선택할 수 있다. 선수 1명이 아쉬운 리그 사정상 대개 전자를 택한다. 수도권 구단의 A 코치는 "B급 FA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유망주를 내주는 건 아깝다"고 말했다.
이러니 A급 FA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반면 그 이하급 선수들은 아예 오퍼를 받지도 못한다. FA 제도의 취지 중 하나는 선수들이 프로야구 제도상 박탈당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일정 기간이 지난 뒤 회복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과도한 보상 제도는 이 취지를 근본부터 흔들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뿐 아니라 언론에서도 꾸준히 FA 등급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현실적으로 '보상'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선수 평가에 따라 보상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요지다.
KBO도 오래전부터 등급제 시행을 검토해 왔다. 최근엔 일부 구단들도 등급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KBO 리그 FA 시장은 만성 공급과소 상황이다. 보상 제도는 시장에 나온 선수들의 이적을 가로막아 공급과소 현상을 더욱 부추긴다. FA 몸값 상승의 이유기도 하다. 한 구단 단장은 "FA 등급제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KBO와 선수협회는 이번 오프시즌에 등급제 도입을 두고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몇 가지 벽이 있다.
첫 번째는 기준이다. KBO는 지난 2014년 실행위원회(단장 회의)에서 'FA 등급제' 도입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KBO 관계자는 "등급을 나눌 객관적인 기준에 대한 합의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호준 선수협회 회장은 "일본프로야구처럼 연봉으로 A·B·C 등급을 나누는 게 가장 깔끔하다"는 입장이다. 일본프로야구(NPB)는 2008년부터 전년도 연봉을 기반으로 한 FA 등급제를 시행 중이다.
두 번째는 구단들의 반대급부 요구다. '등급제가 선수를 위한 제도인 만큼 구단도 반대급부를 얻어야 한다'는 논리다. FA 계약금에 상한선을 두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메이저리그와 달리 KBO 리그 FA들은 총액에서 계약금 비중이 높다. 삼성과 계약한 우규민은 계약금이 37억원으로 전체 금액(65억원)의 57%나 된다. 선수 입장에선 2군 강등 시 연봉 감액을 피하기 위해 계약금을 높여 줄 것을 요구한다. 구단 입장에선 보장 금액인 계약금을 낮추는 것이 유리하다. 계약금 분할 지급 횟수도 구단은 많을수록 좋다는 입장이다.
선수협회는 구단 측 요구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김선웅 협회 사무총장은 "계약금 분할지급은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그러나 상한선까지 받아들이려면 등급제를 포함해 현안을 더 논의해야 한다. 부상자명단(DL) 제도를 도입해야 하고, 연봉 감액 규정도 손을 봐야 한다. KBO, 구단과 함께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병민 기자

당신이 좋아할 만한정보
AD
당신이 좋아할 만한뉴스
지금 뜨고 있는뉴스
행사&비즈니스
많이 본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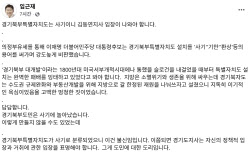








![[포토] 양현종, 승리투수 하이파이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5/22/isp20250522000457.400x280.0.jpg)
![[포토]이호성, 3연전 스윕을 마무리한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5/22/isp20250522000456.400x280.0.jpg)
![[포토] KIA, 2연패 탈출](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5/22/isp20250522000454.400x280.0.jpg)
![[포토]카디네스, 무기력한 3구 삼진](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5/22/isp20250522000455.400x280.0.jpg)
![[포토]홍원기 감독, 찬스를 놓쳤어](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5/22/isp20250522000453.400x280.0.jpg)
![[포토]이호성, 끝낸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5/22/isp20250522000452.400x280.0.jpg)
![[포토]이호성, 9회 마무리 등판](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5/22/isp20250522000451.400x280.0.jpg)
![[포토]강민호, 그래도 잘 막았어!](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5/22/isp20250522000450.400x280.0.jpg)
![[포토]삼성, 레예스 호투와 구자욱 투런포 앞세워 키움 3연전 싹쓸이](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5/22/isp20250522000449.400x280.0.jpg)
![[포토]박진만 감독, 함박웃음으로 구자욱 맞이](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5/22/isp20250522000447.400x280.0.jpg)
![[포토] 역투하는 정해영](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5/22/isp20250522000446.400x280.0.jpg)
![[포토] 정해영,승리 매조지 한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5/22/isp20250522000445.4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