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6만 명 지켜보는 가운데서 '홈런·무실점' 쾅쾅, KT 이강철 감독도 흐뭇 "어린 선수들 빠르게 성장 중"
- [IS포커스] ‘젠지美’ 키키, 대중성 확장으로 완성한 커리어 하이
- “토푸리아, 백악관서 마카체프와 싸워야…수십억 명이 시청할 것” UFC 전 챔프 비스핑 단언
- [2026 밀라노] 피겨 신지아, 쇼트프로그램서 65.66점…1차례 점프 실수는 아쉬움
- '1280억원 수입→돈 벌 때만 중국인' 조롱에도 금·금·은·은·은, "최다 메달 5개, 멋지지 않나요" [2026 밀라노]
- '오브라이언 너마저' WBC 대표팀 초대형 악재, 종아리 부상 의심→류지현호 합류 불투명
- 20년 전 대회에도 출전한 '스무살' 선수가 있다, "엄마 배 속에서 한 번, 어엿한 올림피언으로 두 번" [2026 밀라노]
- 올림픽 신기록으로 우승한 ‘제이크 폴’ 여친→스포츠 브라 노출로 14억 효과…IOC도 인정 [2026 밀라노]
- 한화와 재계약 실패했던 터크먼, 방출 후 '이곳'에서 복귀 재도전 임박
- [2026 밀라노] 여자 컬링, ‘세계 1위’ 스위스에 5-7로 무릎…공동 4위 추락
경제
'낡은 규제'에 속 터지는 저축은행
등록2019.02.22 07:00

올해도 예금보험료(예보료)는 저축은행들 사이에서 빅 이슈다. 관(官) 출신의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이 선출되면서, 저축은행들의 기대심리는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새해 목표고, 저축은행 업계의 숙원 사업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예보료율 인하는 저축은행중앙회장의 임기 내 과제가 됐다.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은 당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규제 완화 첫째는 예금보험료”라며 “저축은행들이 제일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문제인 만큼, 해결은 쉽지 않겠지만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 회장이 당선 전 저축은행 관계자들과 만나 요구사항을 들었는데, 10곳 중 9곳이 ‘예보료 인하’를 입 모아 이야기했다는 후문이다.
아울러 저축은행은 ‘규제 완화’에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저축은행 대표들은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에게 앞다퉈 "규제 완화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현재 저축은행들은 대손충당금·부동산 대출 규제, 예대율 규제, 지배구조 관련 규제 등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중은행보다 5배 높은 예보료, 왜?
저축은행은 예보료가 너무 높다고 주장한다. 2017년부터 예금보험공사에 요율을 인하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다.
예보료는 금융사가 지급 불능 상태에 이르면 예금을 환불해 주기 위해 일정 비율로 예보가 징수하는 보혐료를 말하는 것으로, 금융권마다 다른 예보료율이 적용된다. 이는 고객 보호를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다. 이 때문에 금융사의 부실률이 예보료율에 적용된다. 부실률이 높을수록 예보료는 증가한다.
현재 적용 예보료율은 시중은행이 0.08%다. 이에 비해 저축은행은 5배 높은 0.4%를 징수한다. 금융투자회사와 보험사·종합금융회사의 예보료율(0.15%)보다 2.7배나 높은 수준이다. 저축은행들이 예보료 인하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여기에 개별 금융사들의 평가등급이 추가로 반영된다. 평가등급은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부여되며, 2등급을 받게 되면 정해진 표준 예보료율만큼 예보료를 내고 1등급이면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3등급이면 5% 할증되면서 더 많은 예보료를 내야 한다.
예컨대 A저축은행이 1조원의 수신을 달성하고 3등급을 받았다면, 최종 예보료는 1조원의 0.4%인 40억원에 5% 할증된 42억원을 내는 계산법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소비자를 보호하자는 목적은 같은데, 예금 규모가 시중은행보다 훨씬 적은 저축은행이 이에 5배를 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여기에는 ‘저축은행 신뢰도’를 이유로 꼽는다. 아직도 2011년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니고 있다.
여전히 당시에 사용한 비용을 타 금융사들이 메우고 있고, 아직 절반도 채 상환되지 않았다. 예보에 따르면 저축은행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은 27조2000억원이었고, 현재까지 상환 금액은 11조4000억원이다.
정부는 이렇게 쏟아부은 공적자금을 저축은행은 물론이고 은행·보험 등 다른 금융회사 고객들이 모아 놓은 예금보험료 계정을 헐어 매년 조금씩 갚아 나가도록 했다. 8년이 지난 현재도 저축은행에서 거둔 예보료는 매년 전액이 2026년까지 운용되는 예보료 상환 특별계정에 적립된다.
문제는 당시 문제가 된 저축은행들은 전부 문을 닫았다는 것이다. 문제를 일으킨 곳들은 사라졌는데, 살아남은 저축은행들이 후폭풍을 고스란히 견디고 있다는 이야기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부실 이미지가 생겼으나, 그때와 지금은 건전성 면에서 많이 달라졌다”고 했다.
저축은행이 풀어 달라는 ‘규제’들
최근 저축은행 업계가 해외 송금업과 관련된 규제 완화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허탈해했다. 당국은 카드사와 증권사의 해외 송금 참여는 허용했다.
저축은행 업계는 그동안 기획재정부에 수신기관의 이점을 살려 해외 송금업과 기존 사업 간 시너지를 내겠다는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해 왔다. 여신 금융기관인 카드사도 해외 송금이 가능해지는데 수신 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이 안 된다는 것은 ‘차별’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금융 당국은 저축은행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 능력이 다른 업권에 비해 다소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이를 거절했다.
사업 수익성을 제쳐 두더라도, 규제 때문에 서비스 다양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 저축은행 측의 입장이다. 사실 인터넷은행 등까지 해외 송금 업무를 해 수수료 경쟁력이 떨어져 사업성에 의문점이 있지만, 고객들에게 서비스 다양성 측면으로도 어필할 수 없도록 막혀 있다는 이야기다.
영업 구역 제한 역시 저축은행의 역할을 막고 있다고 주장한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서울, 인천·경기, 대구·경북·강원,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전북·제주, 대전·충남·충북 등 6개 영업 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구역별 저축은행은 지역 내 대출 비중을 유지해야 한다. 서울과 인천·경기는 50%, 그 외 권역은 40% 유지 의무가 있다. 영업점과 비대면 채널 모두 규제 대상이다.
일부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권이 넓은 편이다. SBI저축은행은 서울과 인천·경기, 충청권, 전라권, 강원·경북권 등 영업이 가능하고, 웰컴저축은행은 서울과 인천·경기, 충청권, 경남권 영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문제는 저축은행 역시 비대면 채널 비중이 커지면서 구역 내 대출 확보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앱이나 인터넷 등 비대면 채널을 활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고객을 모을 수 있으니, 구역 내 대출을 채우지 못해 영업에 제한이 걸린 곳이 많다는 이야기다.
구역 제한 규제는 1973년 처음으로 저축은행(당시 상호신용금고)이 설립되면서 ‘지역 서민 중심의 금융기관’이라는 취지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는 2011년 대규모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터지면서 낮아진 구역 내 영업 제한이 금융 소비자의 피해로 돌아왔다. 서울권의 대형 저축은행에서 부실이 발생하자 자회사로 가지고 있던 지역의 저축은행까지 부실이 전이된 것이다. 이후 금융 당국은 저축은행의 영업 구역과 M&A 등 규제의 고삐를 단단히 틀어쥐게 된 것이다.
저축은행 업계는 시대가 변한 만큼 규제 완화도 고려해 주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부업체 등도 전국에서 영업하는데 저축은행만 수십 년 된 규제에 갇혀 있는 것은 타당성에 어긋난다”며 “중금리대출은 150%로 인정해 주는 인센티브가 있지만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영업 구역 규제가 완화돼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며 “40%로 유지 의무가 낮춰진 것도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박 회장은 최근 저축은행 정책과 감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 국·과장을 동시에 면담하는 등 접촉을 늘려 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회장이 취임하고 이제 규제를 풀어 가기 시작하는 단계로, 각각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일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재 79개 저축은행을 규모로 나눠 투 트랙으로 규제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

<사설>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들이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왼쪽 둘째)과 만난 자리에서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당신이 좋아할 만한정보
AD
당신이 좋아할 만한뉴스
지금 뜨고 있는뉴스
행사&비즈니스
많이 본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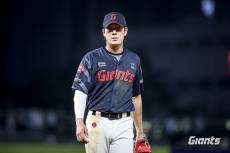














![[포토] 티파니 영, 미소에 홀릭](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35.400x280.0.jpg)
![[포토] 티파니 영-이찬원, 한터뮤직어워즈 MC 맡았어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37.400x280.0.jpg)
![[포토] 티파니 영, 우아함 종결자](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34.400x280.0.jpg)
![[포토] 티파니 영, 아름다운 드레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32.400x280.0.jpg)
![[포토] 티파니 영, 사뿐사뿐](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36.400x280.0.jpg)
![[포토] 티파니 영, 공주님 들어가십니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33.400x280.0.jpg)
![[포토] 이찬원, 팬분들 사랑해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30.400x280.0.jpg)
![[포토] 이찬원, 멋진 슈트핏](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31.400x280.0.jpg)
![[포토] 이찬원, 여유로운 MC의 입장](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29.400x280.0.jpg)
![[포토] 윤종신, 18년 만에 내는 정규앨범 기대해 주세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27.400x280.0.jpg)
![[포토] 윤종신, 인자한 손인사](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28.400x280.0.jpg)
![[포토] 이창섭, 감기투혼 포즈](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25.4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