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대전, 2026시즌 유니폼 공개…구단 스토리 담았다
- “차량서 남성과 특정 행위”…박나래 전 매니저들, ‘직장 내 괴롭힘’ 노동청 진정
- 수원 이끄는 이정효 감독 “지금도 내가 안되길 바라는 이들 많아…능력 있는 지도자가 꿈 키웠으면” [IS 수원]
- 강원FC, ‘구단 역대 최고 규모’ 애플라인드스포츠와 공식 용품 후원 협약 체결
- 강혁 감독, 기자회견 불참→제재금 50만원
- 이정현 “母 떠난 지 5년, 명절에 생각 많이 나”…강수정 결국 눈물 (‘편스토랑’)
- ‘흑백요리사2’ 임성근 측 “콘텐츠 무단 짜깁기…모든 금액 기부 NO” [전문]
- 타쿠야, 가정사 첫 고백 ‘눈물’…외국인 최초 ‘살림남’ 합류
- ‘승격의 해’ 그리는 서울 이랜드, 양동현 코치 합류했다…코치진 구성 완료
- 강은비 “조기양막파열로 양수 ‘0’, 절망과 고통 속…기도해달라” [전문]
연예
‘아스달 연대기’와 고조선 이전의 시대!-‘아스달 연대기’와 고조선 역사 속 이야기 ②
등록2019.06.18 15:03

[다음은 ‘고조선 논쟁’으로 유명한 유정희(남, 37, 역사학자/고고학자 : 『18세기 프랑스 지식인이 쓴 고조선, 고구려의 역사』, 『하왕조, 신화의 장막을 걷고 역사의 무대로』, 『드래곤볼, 일본 제국주의를 말하다』, 『그레이스 켈리와 유럽 모나코 왕국 이야기』, 『18세기 프랑스 지식인이 본 조선왕조』 등 저/감수) 선생이 직접 쓴 ‘특별기획 칼럼②부’이다.]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가 한창 방영중이다. 처음의 우려와는 다르게 갈수록 흥미가 더해진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저번 칼럼에서도 필자가 분명 말했지만,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드라마를 성급히 좋지 않게 평가하는 것은 다소 자제해야 할 것이다.
저번 칼럼에서 필자는 드라마 속의 성(城)에 대해 얘기하였었다. 그러나 이러한 다소 지엽적인 부분을 떠나 전체적인 큰 시야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무언가가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이 드라마의 배경이 되는 ‘고조선 성립 이전의 시대(pre-Old Joseon era)’이다. 드라마에서는 확실히 얘기하고 있진 않지만, 결국 이는 고조선 성립 이전의 이야기인데 실제로 사료에는 고조선 성립 이전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고, 그런 기록이 있는 사료 자체가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 이에 대해 위서(僞書)를 제외한 신빙성 있는 사료는 사실상 거의 없다. 중국 오제(五帝)시대, 하(夏) 시대의 기록을 적은 2차 사료도 많이 없는 상황에 전통적으로 중국보다 사료가 적은 우리 측 기록이 많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기록이 아주 없지는 않다. 곧, 20세기 초 명문가 출신 독립운동가이신 김교헌(金敎獻) 선생이 쓰신 『신단민사』에 보면 단군의 고조선 성립 이전 기록이 소략하나마 보인다. 참고로 필자는 작년 <레지 고조선 사료 - regis’s historical records on old joseon: rhroj> 를 해제하고 이를 우리 ‘국학역사학자(國學歷史學者)’들인 김교헌 선생 등의 저서인 『신단민사/실기』 등과 사료 교차검증(cross-examination) 하고, 또한 『후한서 동이열전』 등의 기록과는 사료 상호보완(reciprocal complementation)을 하였는데, 이리저리 봤을 때 그만큼 『신단민사』는 우리에게 소중한 책이다. 또한 <레지 사료> 는 오리엔탈리즘 출현 이전 ‘서구의 원조 동양학’에 가깝기에 이 또한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 『신단민사』의 고조선 성립 이전 기록을 보면, “신인(神人)이 흩어진 사람들을 한데 모아 부락을 만들고 그 수가 3천명 이었다. 신인이 집과 정자를 만들고 소를 타고 다스렸다. 신인(神人)이 백성을 통치하였고 백성들은 신의 교화에 감화되어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신인이 나타난 이후부터 단군의 건국 전까지를 124년인데 이를 신시시대(神市時代)라 한다.”라고 서술돼 있다.
또한 “이후 백성들이 신인을 추대하여 군주(君主: monarch 또는 prince)로 삼았다.” 라고 되어 있다. 드라마에서는 ‘아라문 해슬라’라는 인물이 바로 ‘신인(삼국유사에서는 환웅)’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며, 도시국가 아스달은 ‘신시’의 드라마적 해석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라문 해슬라가 아스달을 세운 것이 200년이 채 되지 않았다는 설정도 『신단민사』의 신시 124년 역사와 유사하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를 학술적으로 해석하면, 이는 아마 초기국가(early state) 성립 이전 어느 하나의 도시국가가 성립되는 단계를 나타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도시국가가 성립되고, 자연스럽게 강한 도시국가가 다소 세력이 약한 도시국가들을 복속시키거나 연합(union), 연맹(confederation)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리하여 성립된 것을 바로 ‘초기국가’라고 한다. 이러한 초기국가들은 세계 4대 문명에 으레 보이는데, 가령 이집트 고왕국(Old Kingdom of Egypt) 이전 상, 하 이집트 각각과 이집트 초기 1~2 왕조(Early Dynastic Period)들이 그렇고, 메소포타미아의 우르(Ur) 등 도시국가들, 또한 우리 동아시아 쪽에서는 요(堯), 순(舜) 임금 때부터 넓게 봐서 하왕조(夏王朝: Xia dynasty) 초중기까지 해당된다.
필자는 아주 오래전 하왕조 관련 책을 쓰면서, 하(夏)가 황하 일대에 흩어진 도시국가들을 다소 완만하게 통치한 첫 번째 중국 왕조라고 말한 적이 있다.1) 사실 우리 동아시아 쪽은 아무래도 그 문명의 발전도나 출현 시기가 중동이나 이집트는 물론 인도보다도 다소 뒤쳐짐이 없지 않은데, 완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과서에서 배우고 숙지한 것보다는 실상 그 발전도가 낫다고 확신한다.
그간 교과서 등의 동아시아 문명이 많이 뒤처지게 그려진 것은 사실 19세기 이후 오리엔탈리즘에 빠진 서구 학자들과 그에 아부, 수긍하여 동양학을 서구 오리엔탈리즘의 기준에 무리하게 맞춰 연구한 일본학자들의 영향이 적지 않다.2) 문제는 이러한 오리엔탈리즘이 ‘서구의 원조 동양학’도 아니라는 점이다.
섬서성 스마오 유적을 보듯이 우리 동아시아 쪽도 찾아보면 중동처럼 초기국가 성립 전후 이미 상당히 완숙한 도시국가들을 이미 만들 수 있었다. 참고로 스마오는 대략 기원전 2300년부터 4~5백년간 이어진 섬서성의 성(城) 유적인데, 아직 제대로 발굴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좀 더 조사,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어쩌면 하초(夏初)의 거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따라서 우리 고조선 관련 문제로 돌아오면, 아직 신시시대에 비정할 수 있는 유적이나 이러한 것들이 아직 확실하게 발굴되지는 않았지만, 저 정도의 도시국가 정도는 중국도 당시 이미 가능하니, 고조선의 주 무대인 현재 요서, 요동이나 한반도 일부 지역에서도 이미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본다.
혹자는 그 유명한 요하 문명이 이러한 선(先)고조선 문명의 편린을 보여준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다. 요하 문명은 일단 증명할 수 있는 해독 가능한 확실한 문자발굴이 아직 없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것이 과연 state 단계인지, 아니면 어떤 단계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그러나 김교헌 선생 등의 글에 이미 신시시대가 보이고 『신단민사』 등의 책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우리 구전 역사나 국학 역사의 한 일면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책이기에 이러한 『신단민사』 등의 사료와 선고조선 문명으로 유추되는 일부 요하 문명 유적과 비교해 보는 것도 재미있는 연구이자 흥미롭고 충분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는 그 무엇 같다.
<주석>
1) 유정희, 『하왕조, 신화의 장막을 걷고 역사의 무대로』, 아이네아스, 2016, p.165.
2)오리엔탈리즘과 서구제국주의의 관계를 정립한 대표적인 학자는 잘 알려진 것처럼 에드워드 사이드이다. 하지만 그의 오리엔탈리즘은 근동(중동)과 서구의 관계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등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역사연구에 있어 오리엔탈리즘이 어떻게 작동해왔는가에 대한 연구를 더 진행해야 할 것이다. 오리엔탈리즘의 선구적 연구는 Edward W. Said, Orientalism (New York: Pantheon Books, 1978)를 보길 바란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아시아의 역사서술에서의 오리엔탈리즘의 영향과 에드워드 사이드에 대한 비판은 Michael Dusche, Identity Politics in India and Europe (London & New York: Sage Publication, 2010), 7-9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당신이 좋아할 만한정보
AD
당신이 좋아할 만한뉴스
지금 뜨고 있는뉴스
행사&비즈니스
많이 본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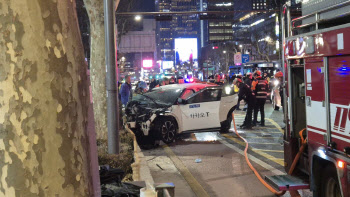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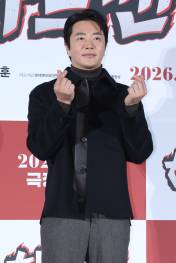







![[포토]서강준, 비주얼로 이미 대상 인정!](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02/isp20260102000059.400x280.0.jpg)
![[포토]서강준, 새해 벽두부터 눈호강 비주얼](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02/isp20260102000058.400x280.0.jpg)
![[포토]서강준, 탄성을 부르는 멋짐](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02/isp20260102000057.400x280.0.jpg)
![[포토]서강준, 연기대상 수상자의 아우라](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02/isp20260102000056.400x280.0.jpg)
![[포토]서강준, 치명적 눈맞춤에 설렘 경보 발령](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02/isp20260102000055.400x280.0.jpg)
![[포토]서강준, 완벽 슈트핏에 감탄이 절로](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02/isp20260102000054.400x280.0.jpg)
![[포토]서강준, 백화점 오픈런 부른 명품 비주얼](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02/isp20260102000053.400x280.0.jpg)
![[포토]서강준, 비현실적 비주얼](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02/isp20260102000052.400x280.0.jpg)
![[포토]서강준, 새해 한파를 녹이는 훈훈한 미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02/isp20260102000050.400x280.0.jpg)
![[포토]서강준, 연기대상 수상자의 치명적인 윙크](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02/isp20260102000049.400x280.0.jpg)
![[포토]서강준, 새해 벽두부터 여심 장악](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02/isp20260102000046.400x280.0.jpg)
![[포토] 최자, 고급스러운 복분자주 '신라 금관 에디션'](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02/isp20260102000042.4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