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IS하이컷] 독보적 비주얼 여전…설현, 슬립 드레스vs퍼 재킷 ‘극과 극 무드’
- 삼성SDI, '유증' 아닌 삼성D 지분 매각으로 투자재원 확보 나서
- 피겨 페어 최초 금메달에 일본뿐 아니라 세계도 열광 [2026 밀라노]
- 카카오게임즈, SM 아티스트 IP 기반 '슴미니즈' 2월 25일 글로벌 출시
- 한계 없는 비주얼 퀸…설현, 블랙 드레스로 고혹미 [AI 포토컷]
- 넥슨 '메이플스토리 월드' 크리에이터 연간 수익 502억원 달성
- 한화오션, '60조 잠수함 수주전' 겨냥...캐나다 전략적 협력 강화
- 육준서, 코뼈 골절 복구 성공 “두 번은 못해” [IS하이컷]
- KBS, 설 연휴 특집 시청률 1위... 명불 허전 ‘트롯’
- "선수들의 뜨거운 열기가 팬들에게 잘 전달되길" KIA, 오키나와 연습경기 생중계 예고
무비위크
[인터뷰①] '지푸라기' 짐승같은 전도연, 괴물같은 연기력
등록2020.02.23 15:29

'전도연은 전도연'이고, '역시 전도연'이라는 추임새는 이번에도 여지없이 터졌다. 기대를 하면 기대를 하는대로, 우려가 슬며시 고개를 들라 치면 보란듯이 '전도연스럽게' 배우 전도연의 가치를 증명해내는 전도연이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존재감의 정석이다.
약 1년 여 만에 선보이게 된 영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김용훈 감독)'에서 전도연은 짐승같은 촉으로 또 한번 괴물같은 연기력을 뽐냈다. 묵언수행을 하듯 대사 한마디가 없었더라도 관객들을 충분히 홀려냈을 매력이다. 대사 한마디, 움직임 하나로 관객들의 시선을 이끄는 내공. 감질나는 초반 분량은 '일부러 저러나' 싶을 정도로 여우같은 활용도를 자랑한다.
인터뷰 내내 '나 진짜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라며 꺄르르 웃기 바빴던 전도연은 어느 때보다 높은 텐션으로 '50분 순삭'을 경험하게 만들었다. 전도연은 "사실 내가 이렇게 유쾌한 사람인데 늘 작품에 가둬뒀다"고 토로하며 "무거운 장르 혹은 기본 예의를 차려야 하는 영화를 홍보하면서 '하하호호' 할 수는 없지 않냐. 날 그렇밖에 써먹을 수 없는 감독들이 안타깝다"는 너스레로 분위기를 쥐락펴락했다.
그런 의미에서 야심차게 택한 차기작은 전도연에게도 새로운 도전이자 기분좋은 설레임을 동반하는 작품. 송강호·이병헌과 손잡고 역대급 대작을 준비 중이다. "저도 1000만 영화 해보고 싶어요"라며 마지막까지 거침없는 '솔직함'을 내비친 전도연은 "'기생충'을 보면서 오스카라는 새 꿈이 생겼다. 가능성이 열렸으니 꿈도 꿔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지금의 난, 신인의 마음으로 최고를 꿈꾸는 여배우다. 닥치는대로 일하고 싶다"며 한결같이 빛나는 열정을 어필했다.

-꽤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나게 된 작품이다.
"개봉일까지 미뤄지면서 조금은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 그래도 개봉하게 됐으니 축하해 달라.(웃음)"
-영화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가.
"가편집본을 보고, 언론시사회 때 최종본을 봤다. 솔직하게 말하면 가편집본을 봤을 땐 좀 놀랐다. '내가 이런 영화를 찍었나?' 싶더라. 예상했던 영화가 아니었다. 그래서 겁이 나기도 했다. '영화가 진짜 싫으면 홍보 어떻게 해야 돼'라는 걱정을 했을 정도다. 근데 언론시사회 때 보고는 다른 의미로 놀랐다. 생각보다 잘 나와 안심했다."
-예상했던 영화는 어떤 영화였나.
"난 시나리오를 읽을 때부터 '블랙코미디'로 봤다. 가편집본은 블랙코미디와는 조금 거리가 있었다. 장르적 이견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최종본은 감독님의 노력과 고생이 느껴졌다. 내가 출연한 영화를 보면서 울고 웃기가 진짜 민망한데 이번엔 많이 웃었다.(웃음)"
-시나리오는 어떤 점에 끌렸나.
"인물 하나하나가 좋았다. 감독님도 그 인물 요소요소를 사랑한다는게 느껴져서 더 좋았다."
-시간이 뒤죽박죽 섞여있는 막구조다.
"나조차도 헷갈린 부분이 있었다.(웃음) 하지만 그게 영화를 이해하거나 몰입하는데 방해될 정도는 아니라 생각한다. 관객들이 볼 때도 불편함은 없었으면 싶다. 편하게 해석되길 바란다."

-영화 시작 약 50분 만에 등장한다.
"촬영도 연희처럼 중간에 들어갔다. 나에게는 첫 촬영이었지만, 현장은 이미 초반부를 다 찍고 한창 적응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빨리 영화의 톤을 찾고 녹아들어야 했다."
-전도연이 등장했다는 것을 알리면서, 극에는 자연스레 합류했다.
"첫 등장신은 당연히 임팩트가 있을 줄 알았다. 그게 '전도연 때문이다'는 말들을 해주시는데 사실 시나리오 자체가 강렬했고 파격적일 수 밖에 없었다. 가만히 있어도 무언가 하고, 할 것처럼 보이는 인물이었다. 일부러 더 힘을 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처럼 하자'는 마음으로 임했다. 그래도 때리는 신은 겁났다.(웃음)"
-NG 없이 한번에 끝냈나.
"완전히. 너무. 잘. 하하. 굉장히 신경쓰고 걱정했던 신이다. 설탕으로 만든 소품이라고 해도 차라리 맞는게 낫지, 누군가를 때리는 신은 부담스럽다. 제대로 때리려 했고, 한번에 끝내고 싶었다. 진짜 한번에 끝낼 수 있어 후련했다."
-첫 촬영은 어떤 장면이었나.
"미란(신현빈)의 사고 현장을 찾아가는 신. 꼭 남의 현장 같았다.(웃음) 장소도 되게 산 속 같은 곳이어서 너무 낯설었다. 신현빈 배우는 감정적으로 격양이 돼 있었고, 감독님은 스모그에 신경 쓰느라 정신이 없었다. '이 현장에 어떻게 적응하지' 싶더라. 첫 촬영치고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사이는 좋았다. 하하."
-마지막 대사는 시원하면서도 연희스러웠다.
"재미있었다. 사실 아무것도 안 해도 연희스러웠을 것이고, 아무 말이나 내뱉어도 연희스러웠을 것이다. 연희는 이미 그 자체만으로 캐릭터화 돼 있는 인물이었다. 그 대사는 시나리오부터 있었고 처음엔 '이 말을 왜 해야하는거야?' 의아하기도 했다. 근데 막상 촬영에 들어가니까 아무렇지 않게 그 말이 툭 나오더라. '네 까짓게'라는 속내도 있었을 것이고, 무엇보다 그동안 연희는 태영(정우성) 같은 남자를 보면서 살지 않았나. 어쩌면 너무 자연스러운 말인거지.(웃음)"

〉〉 ②에서 이어집니다.
조연경 기자 cho.yeongyeong@jtbc.co.kr
사진=메가박스중앙(주)플러스엠
당신이 좋아할 만한정보
AD
당신이 좋아할 만한뉴스
지금 뜨고 있는뉴스
행사&비즈니스
많이 본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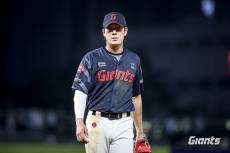


![수십억 쏟아붓고 하루 70건도 안 쓰는 AI제조플랫폼[only 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1901057B.jpg)
![[속보]法 "비상계엄 목적, 헌법기관 마비라면 내란죄 성립 가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1901016T.jpg)
![[속보]코스피, 3.09% 오른 5677.25 마감…코스닥 4.9%↑](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1901001T.jpg)
![[속보]법원 "尹사건 사실관계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1900982T.jpg)








![[포토]이미숙, 등장부터 근사하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9/isp20260219000305.400x280.0.jpg)
![[포토]이미숙, 반가워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9/isp20260219000304.400x280.0.jpg)
![[포토]강석우, 꽃할배의 러블리하트](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9/isp20260219000303.400x280.0.jpg)
![[포토]강석우, 첫 하트포즈입니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9/isp20260219000302.400x280.0.jpg)
![[포토]한지현, 둘째딸도 사랑해주세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9/isp20260219000300.400x280.0.jpg)
![[포토]오예주, 막내의 사랑스러운 포즈](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9/isp20260219000299.400x280.0.jpg)
![[포토]오예주, 발랄하고 풋풋하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9/isp20260219000296.400x280.0.jpg)
![[포토]'찬란한 너의 계절에' 화기애애한 제작발표회 현장](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9/isp20260219000295.400x280.0.jpg)
![[포토]강석우, 따뜻함 묻어나는 미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9/isp20260219000294.400x280.0.jpg)
![[포토]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미숙](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9/isp20260219000293.400x280.0.jpg)
![[포토]채종협, 찬에겐 멜로라기보단 성장드라마](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9/isp20260219000291.400x280.0.jpg)
![[포토]이성경-채종협, 여러분의 봄을 책임질게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9/isp20260219000290.4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