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포토] '미스터리 수사단' 시즌2, 화이팅
- [포토] '미스터리 수사단' 시즌2, 귀여운 크로스 하트 포즈
- [포토] '미스터리 수사단' 시즌2, 기대되는 조합
- [포토] '미스터리 수사단' 시즌2, 놀람의 연속 기대해 주세요
- [포토] '미스터리 수사단' 시즌2, 호흡 기대해 주세요
- [포토] '미스터리 수사단' 시즌2, 기대되는 포즈들
- [포토] '미스터리 수사단' 시즌2, 활약 기대해도 좋아요
- [포토] '미스터리 수사단' 시즌2, 빛나는 주역들
- '캐나다-미국에 영국까지' 女 컬링 4강 경우의 수, 복잡해 보이지만 단순하다…캐나다전 이겨야 올라간다 [2026 밀라노]
- ‘미스터리 수사단2’ 가비 합류→김도훈·카리나 각오 “이번엔 더 강렬”
축구
“어서와요 명보 형, K리그는 처음이죠”
등록2021.02.15 08:26

“저 보기와는 다르게 눈물 많아요. 그땐 선수들과 함께 고생한 시간이 영화 필름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죠.”
프로축구 성남FC 김남일(44) 감독은 지난해 10월 K리그1(1부리그) 최종전에서 극적으로 1부 잔류를 확정한 뒤 눈물을 펑펑 쏟았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카리스마 넘치던 모습과 사뭇 다른 장면이었다. 최근 부산의 전지훈련지에서 만난 김 감독은 “제 인생이 순탄치 않다. 2010년 톰 톰스크(러시아)에 입단한 이후 줄곧 눈만 보며 살았다. 지난해는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말했다.
감독 데뷔 시즌이던 지난해, 출발은 좋았다. 개막 직후 4경기 무패(2승 2무)를 이어가며 K리그 ‘5월의 감독’으로 뽑혔다. 이후 급격한 내리막이 시작됐다. 순위가 10위까지 떨어졌고, 가까스로 1부에 잔류했다. 김 감독은 “의욕과 자신감이 넘쳤지만, 현실은 달랐다. 다행히 마지막 경기에서 ‘원 팀의 힘’을 보여줘 버틸 수 있었다”며 웃었다.
지난해 김 감독은 2001년생 고졸 무명 공격수 홍시후(20)를 ‘깜짝 스타’로 키워냈다. 김 감독은 “신인선수 상견례 자리에서 (홍시후가) 고개를 똑바로 들고 내 눈을 쳐다봤다. ‘뭐 이렇게 건방진 놈이 다 있나’ 싶었다. ‘기가 세다’는 소리를 듣던 나도 선수 때 그 정도는 아니었다. 마커스 래시포드(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비슷한 구석이 많다”고 말했다. 홍시후는 지난해 부산 아이파크와 최종전에서 1골·1도움을 기록, 성남을 2부리그 강등 위기에서 구해냈다.
성남 팬들은 김 감독을 ‘남메오네’라 부른다. 디에고 시메오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스페인) 감독과 느낌이 비슷해서다. 카리스마 넘치는 표정과 동작은 물론, 검정 수트에 와이셔츠까지 ‘올블랙’ 패션을 선보이는 것도 공통점이다. 김 감독은 “시메오네는 단단한 두 줄 수비를 앞세운 4-4-2포메이션을 구사한다. 나는 중원에서 디테일하게 하는 축구를 선호한다. 올해는 ‘남메오네’보다는 ‘홈 승률 높은 감독’으로 불리고 싶다. 2년 차가 됐으니 이젠 옷도 편하게 입을까 싶다”고 말했다. 성남은 지난해 홈에서 2승(3무 9패)에 그쳤다.

올해 선수단 변동의 폭이 크다. 주포 나상호가 FC서울로 떠났고, 연제운과 유인수가 입대했다. 대신 2m3cm 공격수 뮬리치(세르비아), 부시(루마니아), 울산에서 뛴 수비수 빈트비흘러(오스트리아), 박용지 등이 합류했다. 시민구단의 빡빡한 재정 속에서도 알짜를 보강했다는 평가다. 김 감독은 “새 얼굴이 많아 팀 분위기를 다지는데 주력하고 있다. 나름 열심히 웃어주고 있는데, 내 인상이 좋진 않은 모양이다. 가끔 쓴소리도 하지만, 농담도 섞어가며 심리적으로 편하게 하려고 애쓴다”고 덧붙였다.
올해 K리그에는 2002년 월드컵 4강 주역들이 대거 가세했다. 홍명보(52) 울산 현대 감독, 이영표(44) 강원FC 대표이사, 박지성(40) 전북 현대 어드바이저 등이다. 김 감독은 “이 대표는 김병수 감독님과 소통하며 선수단 구성을 잘 하고 있는 것 같다. (박)지성이까지 가세해 K리그 퀄리티가 올라갔고, 주목도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홍 감독님은 축구 선배를 넘어 남자로서도 닮고 싶은 분이다. 지난해 힘들 때 종종 고민을 털어놓으며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 올해 홍 감독님이 어떤 축구를 보여줄지 기대되는 한편, 멋지게 한 판 붙어보고도 싶다. 물론, 절대 지지 않겠다”고 말했다.
부산=박린 기자 rpark7@joongang.co.kr
당신이 좋아할 만한정보
AD
당신이 좋아할 만한뉴스
지금 뜨고 있는뉴스
행사&비즈니스
많이 본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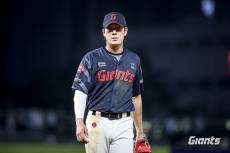














![[포토] '미스터리 수사단' 시즌2, 화이팅](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9/isp20260219000167.400x280.0.jpg)
![[포토] '미스터리 수사단' 시즌2, 귀여운 크로스 하트 포즈](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9/isp20260219000166.400x280.0.jpg)
![[포토] '미스터리 수사단' 시즌2, 기대되는 조합](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9/isp20260219000165.400x280.0.jpg)
![[포토] '미스터리 수사단' 시즌2, 놀람의 연속 기대해 주세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9/isp20260219000162.400x280.0.jpg)
![[포토] '미스터리 수사단' 시즌2, 호흡 기대해 주세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9/isp20260219000164.400x280.0.jpg)
![[포토] '미스터리 수사단' 시즌2, 기대되는 포즈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9/isp20260219000160.400x280.0.jpg)
![[포토] '미스터리 수사단' 시즌2, 활약 기대해도 좋아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9/isp20260219000163.400x280.0.jpg)
![[포토] '미스터리 수사단' 시즌2, 빛나는 주역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9/isp20260219000161.400x280.0.jpg)
![[포토] 가비, 제 활약 기대해 주세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9/isp20260219000156.400x280.0.jpg)
![[포토] 가비, '미스터리 수사단' 시즌2 새로운 멤버](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9/isp20260219000157.400x280.0.jpg)
![[포토] 가비, 반가워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9/isp20260219000158.400x280.0.jpg)
![[포토] 카리나, 앙](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9/isp20260219000154.4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