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리버풀, 프리시즌 첫 홈 경기서도 조타 추모식…“결코 혼자가 아냐”
- 바다, 허위 광고 의혹 사과 “혼란과 불신 드려 죄송”
- NK 주춤할 때 넷마블 "지나갈게요~"…'뱀피르'로 흥행 레이스 잇나
- 정태우, 故 송영규 추모 “사랑하는 영규형”
- 그날 고양 히어로즈에 무슨 일이...안우진 어깨 부상 두 가지 의혹
- 유틸리티 플레이어로 헌신하는 '올스타 2루수' 고승민 [IS 피플]
- 최고령·도루왕·전경기, 박해민 통산 450도루는 특별하다 [IS 피플]
- 장용호, ‘SK온 해법’ 첫 카드 ‘영업익 1조 알짜’ 직접 수혈
- ‘좀비딸’ 최유리 “뉴진스·베몬 노래로 댄스 연습” [IS인터뷰]
- [IS포커스] 나홀로 춤을…키키, 젠지美 대표 방점 찍을까
야구
조정은 없지만, 갈등은 여전한 '연봉 협상'
등록2022.01.12 06:30

연봉 조정(중재) 신청은 없었다. 하지만 물밑에선 갈등이 여전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 10일 "올해 연봉 조정은 신청 없이 마감됐다"고 발표했다. KBO 규약 제75조 [조정신청]에는 '조정을 신청하는 구단 또는 선수는 매년 1월 10일 18:00까지 조정신청서를 총재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조정 신청이 없다는 건 연봉 협상이 원활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SSG 랜더스는 2년 연속 해가 바뀌기 전 일사천리로 연봉 협상을 끝냈다. 그러나 몇몇 구단은 상황이 180도 다르다. 연봉 협상에서 꽤 큰 진통을 겪고 있다.
지방 A 구단만 하더라도 선발 투수와 마무리 투수의 협상 파열음이 밖으로 새어 나오고 있다. 두 선수 모두 지난해 좋은 성적을 거둬 큰 폭의 연봉 인상을 바라지만 하위권에 머문 구단은 소폭 인상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구계 안팎에선 A 구단의 연봉 조정 신청을 유력하게 바라봤다. 하지만 미계약 상태로 조정 신청 마감일을 지났다.
지방 B 구단도 상황이 비슷하다. 지난해 선발 로테이션을 소화한 투수와 협상이 난항이다. 구단은 40% 정도 인상된 금액을 제시했지만, 선수는 더 달라며 버티고 있다. B 구단은 A 구단과 마찬가지로 팀 성적이 하위권이었다.
연봉 조정은 한동안 사문화된 규정에 가까웠다. 2002년 류지현(당시 LG 트윈스)이 사상 처음으로 선수 요구액을 받아냈지만 2010년 타격 7관왕에 오른 이대호(롯데 자이언츠)가 연봉 조정에서 패했다. 2012년 LG 이대형이 연봉 조정을 신청한 뒤 취소했고,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조정 신청 사례가 아예 없었다. 연봉 조정이라는 것 자체가 구단과 대립각을 세우는 거라서 이에 따른 부담이 컸다. 대부분의 선수가 구단 제시액에 불만이 있어도 울며 겨자 먹기로 사인했다.
하지만 지난해 KT 위즈 불펜 투수 주권이 역대 두 번째 연봉 조정에서 승리, 분위기를 전환했다. 구단 제시액(2억2000만원)과 선수 요구액(2억5000만원)이 팽팽하게 맞서 투수로는 2010년 조정훈(당시 롯데 자이언츠) 이후 11년 만에 연봉 조정 권리를 행사했고 조정위원회는 주권의 손을 들어뒀다.
결과 발표 이후 한 공인 대리인은 "연봉 조정을 해달라는 선수가 (리그 전체에 해마다) 3~4명 정도 나올 것 같다. 전쟁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2018년부터 대리인 제도가 도입돼 선수가 느끼는 부담이 줄었다. 구단과 얼굴을 맞대고 협상하지 않아도 되고 조정 자료를 직접 챙길 필요가 없어졌다.
관심이 쏠린 올 시즌 '제2의 주권'은 없었다. 구단과 선수 모두 조정 신청 대신 마라톤협상을 선택했다. 한 구단 관계자는 "아직은 구단과 선수 모두 부담이 있어서 조정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중현 기자 bae.junghyune@joongang.co.kr
당신이 좋아할 만한정보
AD
당신이 좋아할 만한뉴스
지금 뜨고 있는뉴스
행사&비즈니스
많이 본뉴스








!['고용쇼크'서 나스닥 2% 반등…월가, 단기 조정 경고[월스트리트in]](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8/PS25080500082T.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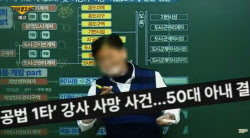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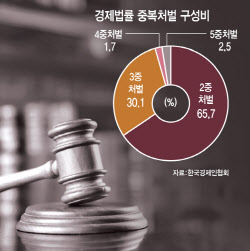








![[포토]양민혁, 손흥민처럼](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8/03/isp20250803000353.400x280.0.jpg)
![[포토]'굿바이 토트넘' 손흥민, 새롭게 다시 만나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8/03/isp20250803000351.400x280.0.jpg)
![[포토]손흥민, 토트넘 유니폼 입고 마지막 인사](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8/03/isp20250803000350.400x280.0.jpg)
![[포토]한국팬들에게 인사하는 뉴캐슬](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8/03/isp20250803000349.400x280.0.jpg)
![[포토]히샬리숑-양민혁, 마지막까지 승리를 위해](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8/03/isp20250803000348.400x280.0.jpg)
![[포토]토트넘-뉴캐슬 경기, 마지막은 손흥민과의 작별 무대](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8/03/isp20250803000347.400x280.0.jpg)
![[포토]프랭크 감독, 다음에 또 만나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8/03/isp20250803000346.400x280.0.jpg)
![[포토]양민혁, 앞으로도 토트넘 응원해주세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8/03/isp20250803000345.400x280.0.jpg)
![[포토]손흥민, 레전드의 마지막 경기는 헹가래로](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8/03/isp20250803000344.400x280.0.jpg)
![[포토]'굿바이 캡틴', 헹가래 받는 손흥민](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8/03/isp20250803000343.400x280.0.jpg)
![[포토]헹가래 받는 캡틴 손흥민](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8/03/isp20250803000342.400x280.0.jpg)
![[포토]양민혁, 캡틴의 빈자리를 채운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8/03/isp20250803000339.4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