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오마이걸, 상반기 6인 완전체 컴백... 콘서트 및 앨범 발매 [공식]
- ‘사직’ 충주맨, 유튜브서 마지막 인사...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 황정음, 前 소속사에 이태원 고급주택 가압류당해 [왓IS]
- ‘음주운전 논란’ 임성근, 한 달 만에 “식당 오픈 준비 중” 근황 공개 [IS하이컷]
- 박소영, 결혼 2년만 경사... 시험관 시술 중 자연 임신 [공식]
- 대기업 '8.1조원 규모' 설 전 협력사 물품대금 조기 지급
- “빨리 1000m 타고 싶어요” 메달 불발에도 좌절 없는 김길리 [2026 밀라노]
- 황정음, 장난감 ‘무나’ 올렸다가 갑론을박... “쓰레기장 신경 쓰여”vs“좋은 의도” [왓IS]
- 마이클 코어스(MICHAEL KORS), 45주년 기념 2026 가을/겨울 컬렉션 런웨이 쇼 공개
- ‘뷰민라 2026’ 1차 라인업... 카더가든·엔플라잉·로이킴 등 16팀

"(학교) 선생님께서 평소에 칭찬을 아끼시는데 '용기가 대단하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며칠 전 용감한 초등학생들 이야기가 뉴스에 났습니다. 신체 부위를 노출한 '바바리맨'을 뒤쫓아 경찰에 신고한 어린 친구들입니다. 앞에 인용한 코멘트는 신고 학생 중 한 명의 말인데, 한겨레 신문 기사의 리드에 나옵니다. 마음 공부를 하는 제 입장에선 몹쓸 사건 대신 어린 학생의 솔직한 표현에 시선이 꽂힙니다. 여러분은 이 인터뷰에서 무엇이 느껴지나요?
용기있는 행동에 대한 자부심, 칭찬받아 뿌듯한 학생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평소 칭찬을 아끼신다고 말하는 당돌함도, 그 이면에는 자주, 더 많이 칭찬받고 싶은 바람까지 전해집니다. 정말 발랄하지 않습니까? 범인을 쫓느라 놀란 숨을 고르며 기자와 경찰관 앞에서 자랑스럽게 말하는 친구들의 반짝이는 눈빛, 상기된 얼굴이 떠오르는듯 합니다. 만약 그 친구들이 제 앞에 있다면 "와~ 대단한데"하면서 큰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학생의 코멘트 앞 부분이 제 안에서 계속 맴돕니다. 선생님께선 무엇 때문에 그동안 칭찬을 아끼셨을까요? 괄호 안에 선생님 대신, 부모-임원-팀장-코치-리더-선배로 바꾸면 또 어떤가요?
별로 어색하진 않네요. 안타깝습니다. 집에서 회사에서, 조직에서, 학교에서, 우리는 상대를 인정하고, 지지하고, 칭찬하는데 인색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많은 순간 칭찬에 목말라 합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거포' 김동엽 선수의 시즌 초 인터뷰 (연합뉴스 4월5일자)에 이런 부분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몇년째 이어진 슬럼프를 벗어나려 고군분투 합니다. 송구 이슈를 해결하려고 오른손 대신 왼손으로 던지기도 했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고민과 부담이 지나쳐 멘탈 이슈로까지 이어졌던 김 선수. 그런데 올초 그의 아버지 (김상국 전 천안북일고 야구부 감독)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 마음을 추스렸다고 합니다. "매우 엄격하신 아버지였다. 어릴 때부터 칭찬보다 꾸중을 많이 들었다. 그런데 최근 즐겁고 편하게 해보라는 따뜻한 말씀을 해주시더라. 그런 말씀 해주는 분이 아닌데 많이 울컥했다"고 고백합니다. 엄하기만 한 아버지로부터 마침내 인정받은 그 마음! 김 선수는 기복의 굴곡을 벗어나 시즌 중반을 향하는 지금도 쏠쏠한 활약을 이어갑니다.
저는 최근 대학생 여러 명을 코칭 프로그램에서 만났습니다. 1:1로 각각 세 차례 저와 코칭 대화를 했는데 이들에게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모두 정말 열심히 산다는 것, 그러나 자신의 강점이 정작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 그 두가지였습니다. 어느 학생은 학업, 과제, 팀 플레이, 자격증 도전, 그리고 2~3개 '알바'까지 시간을 아껴쓰고 있었습니다. 스케줄 관리에서 다른 친구나 동료를 배려하는 태도가 돋보였습니다. 그런 세심함과 다양한 옵션을 마련하는 준비성을 알게 돼 그러한 진면목을 칭찬했더니 "이런 걸로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받은 적이 없다"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다른 학생은 자신이나 타인의 감정을 교류하는데 부정적이었습니다. 주위 사람과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소극적이었고요. 그런데 최근 건강이 나빠지자 일에 과몰입한 자신을 제어하지 못했다며 후회합니다.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런 관계를 만들어지길 사실은 원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자기의 취약성을 먼저 드러내야 남이 자신을 신뢰하기 시작한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자신과 상대의 힘든 마음을 꺼내고 읽어 주기로 그는 코치에게 약속합니다. 오래된 자신만의 틀을 깨기 시작한 겁니다. 내면을 주도하던 큰 목소리가 아닌, 오히려 반대편에 조용히 눌려 있던 감정과 의도를 직면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의 솔직함과 용기에 대해 말해주자 "그런가요"라며 놀라던 학생의 목소리가 기억납니다.
'이런 면이 있군요' '그런 부분이 정말 좋네요'라고 충분히, 구체적으로 말해 주세요. 이런 표현이 낯설고 어색하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인정과 지지, 칭찬은 그걸 받는 사람의 성장을 자극합니다.
한국코치협회 인증코치 김종문
김종문은 중앙일보 기자 출신으로, 2011~2021년 NC 다이노스 야구단 프런트로 활동했다. 2018년 말 '꼴찌'팀 단장을 맡아 2년 뒤 창단 첫 우승팀으로 이끌었다. 현재 한국코치협회 인증코치(KPC)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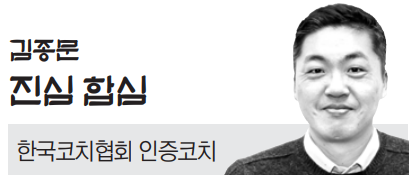
차승윤 기자 chasy99@edaily.co.kr
당신이 좋아할 만한정보
AD
당신이 좋아할 만한뉴스
지금 뜨고 있는뉴스
행사&비즈니스
많이 본뉴스








![[인사] 셀트리온](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1301304T.jpg)










![[포토] SMTR25, 나란히 횡단보도 건너기](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3/isp20260213000154.400x280.0.jpg)
![[포토] 승한, 멋진 분위기](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3/isp20260213000153.400x280.0.jpg)
![[포토] 라이즈 원빈, 가만히 서 있어도 화보](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3/isp20260213000152.400x280.0.jpg)
![[포토] 라이즈 원빈, 빛이 나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3/isp20260213000151.400x280.0.jpg)
![[포토] 에스파 카리나, 에?](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3/isp20260213000147.400x280.0.jpg)
![[포토] 에스파 카리나, 요정 그 자체](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3/isp20260213000146.400x280.0.jpg)
![[포토] 에스파 지젤, 당당한 횡단보도 런웨이](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3/isp20260213000148.400x280.0.jpg)
![[포토] 에스파 닝닝, 물오른 미모](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3/isp20260213000145.400x280.0.jpg)
![[포토] 에스파, 우리의 거리는 이정도야...](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3/isp20260213000149.400x280.0.jpg)
![[포토] 에스파 윈터, 사랑스러운 분위기](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3/isp20260213000144.400x280.0.jpg)
![[포토] 에스파 닝닝, 걸어오는 모습도 아름다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3/isp20260213000143.400x280.0.jpg)
![[포토] 엑소 수호, 엄지척](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3/isp20260213000142.4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