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천이슬, 오랜만에 전한 근황... tvN ‘우주를 줄게’ 출연
- ‘젝스키스 출신’ 고지용, 볼 패일 정도로 수척... 건강 이상설 또 제기
- '세리머니→황당 부상' 악몽 이겨냈다…디아즈, 3년 만에 WBC 대표팀 복귀
- KT→LG 천성호 "본혁이 형 덕분에 적응, 마지막 기회로 여겨"
- 한국관광공사, LG전자와 손잡고 스페인서 ‘K굿즈’ 알린다
- 아이들 민니, 태닝 피부에 탄탄 복근…힙한 데님룩 [IS하이컷]
- ‘믿보배’ 하윤경, 차가운데 따뜻해... 매력적인 고복희役 (언더커버 미쓰홍)
- 아이들 민니, 브라톱+데님으로 터진 건강미 [AI 포토컷]
- [단독] 임성근 셰프 “파주 식당, 예정대로 오픈…매매 현수막은 옆건물 것” [직격인터뷰]
- ‘쇼미12’ 지코→박재범, 프로듀서들 활약... 지옥의 송캠프 포문

뉴스공장 금요미식회에 가끔 먹을거리를 가져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빵이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변상욱 대기자가 빵을 들고 프랑스의 명언을 날렸습니다. “빵만 있다면 웬만한 슬픔은 견딜 수 있다.” 이 말에 다들 한순간의 머뭇거림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빵은 생명이지요.
프랑스인의 빵에 해당하는 우리 것은 밥입니다. ‘빵’의 자리에 ‘밥’을 넣어보면 어떨까요. “밥만 있다면 웬만한 슬픔은 견딜 수 있다.” 어색합니다. 빵이나 밥이나 생명인데 말입니다. 우리는 밥만 있으면 안 됩니다. 반찬도 있어야 하고 국도 있어야 합니다.
“빵만 있다면 웬만한 슬픔은 견딜 수 있다”는 프랑스 명언에 대비될 수 있는 한국의 명언으로 해월 선생의 말씀인 “밥이 하늘이다”가 있습니다. 인간은 먹어야 삽니다. 먹을거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인간은 없을 것입니다.
마침 변상욱 대기자가 포르투갈을 간다고 하여 제가 “빵의 나라에 가시네요” 했습니다. 빵이라는 말이 포르투갈어 pão에서 왔으니 “빵의 나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제 곁에 있던 젊은 분이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빵이 우리말 아니었어요?”
빵은 곡물을 가루 내어 반죽을 하고 이를 부풀려서 굽는 음식이지요. 이런 음식이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우리 조상이 빵을 싫어해서 안 만들었던 것은 아니고요, 한반도의 자연 조건이 빵을 구워 먹기보다는 밥을 지어 먹는 게 효율적이었던 것이지요. 조선 말기에 ‘곡물을 가루 내어 반죽을 하고 이를 부풀려서 굽는 음식’이 우리 땅에 들어왔고, 이를 이르는 명칭으로 포루투갈어인 pão이 선택된 것이지요.
빵은 분명히 근래에 이식된 외래어인데 이를 외래어라고 느끼는 일은 거의 없는 듯합니다. 저도 그냥 우리말인 듯이 쓰다가 별스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나 빵이 외래어임을 강조해서 말하곤 합니다.
빵은 한 음절로 된 단어입니다. 우리말 중에 한 음절로 된 단어를 입에 올려 소리를 내어보십시오. 해·달·별·땅·물·논·밭·몸·손·발·입·코·귀·눈·벼·쌀·콩·팥·밥·국·술·똥… 느낌이 오십니까. 우리말에서 한 음절의 단어는 자연과 몸, 그리고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주 먼먼 옛날에 탄생한 단어라고 보아야 합니다.
빵. 외래어인데 한 음절입니다. 그리고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외래어인 빵은 한 음절의 우리말이 주는 느낌을 자연스레 공유하고 있습니다.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자와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등 빵과 관련한 서양의 속담이나 명언이 우리의 오랜 속담이나 명언인 것처럼 받아들여져서 우리의 가슴을 흔드는 것이 그 이유이지 않나 추측을 하게 됩니다.
아침으로 빵을 먹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밥을 차려서 먹는 것보다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빵집이 가장 핫한 이슈입니다. 유명 빵집 앞에 줄을 섭니다.
밥의 시대는 가고 빵의 시대가 왔습니다. 한국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농림수산식품부도 빵의 시대에 맞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민이 밥을 안 먹으니 쌀로 빵가루를 만드는 사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한국인의 주식이 밥이 아니라 빵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밥의 시대가 끝날 수도 있다는 말에 한민족이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민족이 밥의 시대를 연 것은 고려 중기입니다. 벼 재배는 그 이전부터이지만 밥을 지을 정도의 도정 기술과 무쇠솥의 보급 등을 고려하면 고려 중기에 밥을 주식으로 삼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밥의 시대 이전에는 떡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곡물을 가루 내어 시루에 쪄서 먹었습니다. 떡의 시대 이전에는 죽의 시대가 있었고요. 서양에서 최초 곡물 음식으로 오트밀(귀리죽)을 꼽는데, 한민족 최초 곡물 음식으로는 콩죽 정도를 상상하는 게 적당합니다.
한반도에서의 큰 흐름으로 보자면 빵의 시대가 온다고 해도 크게 어색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밥의 시대가 저물면서 한반도의 농민은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밥이 하늘이고 빵은 하늘이 아닙니다. 하늘을 지키는 농민을 잘 보듬어야 합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당신이 좋아할 만한정보
AD
당신이 좋아할 만한뉴스
지금 뜨고 있는뉴스
행사&비즈니스
많이 본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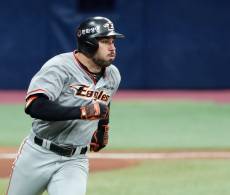

















![[포토]채수빈, 호기심 발동!](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1/isp20260201000212.400x280.0.jpg)
![[포토]채수빈, 작은 얼굴에 '도대체 몇등신이야?"](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1/isp20260201000211.400x280.0.jpg)
![[포토]채수빈, 미소로 주위를 밝히는 마법 시전](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1/isp20260201000207.400x280.0.jpg)
![[포토]채수빈, 수줍은 미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1/isp20260201000206.400x280.0.jpg)
![[포토]채수빈, 눈빛만으로 '분위기 여신'](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1/isp20260201000204.400x280.0.jpg)
![[포토]채수빈, 현실감 떨어지는 비율](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1/isp20260201000203.400x280.0.jpg)
![[포토]채수빈, 청순함 가득 담아 '하트'](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1/isp20260201000202.400x280.0.jpg)
![[포토]채수빈, 오늘은 하트 요정](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1/isp20260201000201.400x280.0.jpg)
![[포토]채수빈, 하트 더하기 애교](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1/isp20260201000200.400x280.0.jpg)
![[포토]채수빈, 팬들 선물에 함박미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1/isp20260201000199.400x280.0.jpg)
![[포토]채수빈, 청순 하트](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1/isp20260201000198.400x280.0.jpg)
![[포토]이주빈, 날씨만큼 화사한 출국길](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1/isp20260201000182.4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