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문동주·김도영부터 박영현·안현민까지, '03즈'에 대표팀 미래 달렸다 [IS 사이판]
- [김지욱 저작권썰.zip]㉕ 저작권, 결론은 있지만 기록될 수 없는 이야기
- UFC 토푸리아 이길 뻔한 허버트, ‘가장 힘든 상대’로 의외의 파이터 꼽았다
- 돈보다 의리, '낭만 야구' LG 박해민-임찬규 "리스펙트 한다" [IS 인터뷰]
- '담장 넘어 펑펑' 돌아온 김도영의 자신감, "남들은 못 믿어도, 난 믿어요" [IS 사이판]
- ‘한산’ 감독 “故안성기, 혈액암 투병 내색하지 않아” (‘국민배우, 안성기’)
- “故안성기, 은퇴 아닌 ‘정년 연장’ 의미 전하겠다고” (‘국민배우, 안성기’)
- 박보검, 미담 추가요…日서 한국 팬 분실폰 찾은 ‘영향력’ [왓IS]
- 경희대, 3전 전승 퍼펙트 16강 진출
- 권상우, 430억 건물주 비결 “재태크, 내가 다 관리…♥손태영 생활비 줘”

매해 7월 31일은 KBO리그 트레이드 마감일이다. 야구규약 제86조에는 '선수계약의 양도가 허용되는 기간은 KBO 포스트시즌 종료 후 다음 날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라고 명시돼 있다. 데드라인이 다가오면서 물밑에선 여러 이적설이 나돌았지만, 최종적으로 성사된 대형 트레이드는 마감 이틀 전 이뤄진 최원태 이적뿐이었다. 항간에는 지방 한 구단을 중심으로 외국인 트레이드 가능성까지 제기됐으나, 모두 불발에 그쳤다.
눈치만 보다 끝났다. 전력 보강을 노린 팀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섣불리 이적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중위권 순위 경쟁이 워낙 치열한 것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트레이드 마감일 기준 3위 두산 베어스와 7위 롯데 자이언츠의 승차가 3.5경기에 불과했다. 최하위 삼성 라이온즈마저 트레이드 마감일 직전 3연승을 질주, 가을야구 희망을 놓지 않았다. 2위 SSG 랜더스까지 시장에서 빈손으로 철수하니 결국 요란했던 빈 수레가 멈췄다.
트레이드 문이 굳게 닫히자 '최원태 이적'이 재조명받고 있다. 토종 에이스를 판매한 키움 히어로즈의 결단도 놀랍지만, 그만큼 LG의 적극성도 돋보였다. 선발 투수진이 약하다고 판단한 차명석 LG 단장은 미국에서 진행된 단장 워크숍 기간, 고형욱 키움 단장을 만나 협상의 물꼬를 텄다. 이후 트레이드 카드를 조율한 끝에 지난달 29일 이적이 공식 발표됐다. 즉시 전력감을 내주는 대신 키움에서 원한 '유망주 패키지'를 꾸렸다.

물밑에서 진행된 대부분의 트레이드 협상이 출혈의 수준을 고민하다가 깨진다. LG는 최원태의 대가로 애지중지 키운 군필 내야 유망주 이주형(22), 2023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2라운드 전체 17순위로 지명한 투수 김동규(19), 2024년 신인 1라운드 전체 8순위 지명권을 키움에 넘겼다. 다른 구단에선 꺼릴 만한 '유망주 패키지'를 과감하게 만들었다.
차명석 단장은 "이주형은 정말 아까운 선수다. 워낙 신경을 썼던 선수지만, 이주형을 주지 않으면 (트레이드가) 성사가 되지 않았다"며 "멀리 보는 것도 생각하지만 기회가 왔으면 현실에서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고심의 흔적을 내비쳤다. 전반기를 1위로 마친 올해가 1994년 이후 멈춘 한국시리즈 우승 시계를 돌릴 적기라고 판단했다.
트레이드 마감일 기준 리그 상위 5개 팀 중 LG만 움직였다. 약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하나같이 외부 수혈을 꺼렸다. 공교롭게도 리그 1위 LG만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A 구단 관계자는 "LG가 이번 트레이드를 잘했다고 본다. 절실함의 승리"라며 "경쟁하는 구단이지만 칭찬하고 싶다. 최원태가 갑자기 못 던지지 않고서는 (우승) 가능성이 커진 건 맞다"고 말했다. LG의 과감한 선택이 해묵은 우승 갈증을 풀어낼 비책으로 작용할지 지켜볼 일이다.
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당신이 좋아할 만한정보
AD
당신이 좋아할 만한뉴스
지금 뜨고 있는뉴스
행사&비즈니스
많이 본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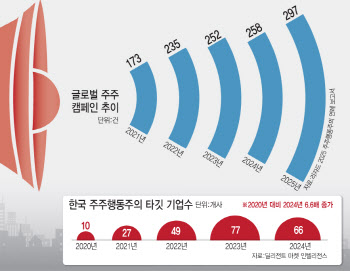


![전통 고집하다간 연 300억 적자…여대 공학 전환은 '생존'의 문제[ony 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1/PS26011200024T.jpg)








![[포토] 아이브 장원영, 안 보이게 꽁꽁 싸매고 골든디스크 행](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09/isp20260109000088.400x280.0.jpg)
![[포토] 아이브 레이, 콩순이 손인사](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09/isp20260109000087.400x280.0.jpg)
![[포토] 아이브 장원영, 꽁꽁 싸매도 장원영](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09/isp20260109000086.400x280.0.jpg)
![[포토] 아이브 안유진, 추워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09/isp20260109000084.400x280.0.jpg)
![[포토] 아이브 리즈, 치명적인 눈빛으로 '메롱'](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09/isp20260109000085.400x280.0.jpg)
![[포토] 아이브, 골든디스크 잘 다녀오겠습니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09/isp20260109000083.400x280.0.jpg)
![[포토] 아이브 리즈, 눈 효과 '예쁜 눈빛'](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09/isp20260109000078.400x280.0.jpg)
![[포토] 아이브 레이, 지켜주고 싶은 분위기](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09/isp20260109000079.400x280.0.jpg)
![[포토] 아이브 리즈, 사랑스러운 손인사](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09/isp20260109000076.400x280.0.jpg)
![[포토] 아이브 이서, 핑크 공주](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09/isp20260109000081.400x280.0.jpg)
![[포토] 아이브 레이, 여리여리 여신 분위기](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09/isp20260109000080.400x280.0.jpg)
![[포토] 아이브 안유진, 마스크 속 앳된 얼굴](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09/isp20260109000077.4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