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다 끝났다고 했는데 증명했다"...김진성 "통산 홀드 1위가 목표"
- 미국 뒤흔들 손흥민…2주 앞으로 다가온 개막, 첫 풀시즌 기대감 커진다
- '159km' 일본인 투수, 삼성 마무리 투수 도전장…미야지 "불펜도 마무리도 문제 없습니다"
- [TVis] 허가윤 “갑작스런 오빠의 죽음에 부모님 ‘따라가고 싶다’고” 눈물(‘유퀴즈’)
- ‘케데헌’ 이재, K팝 최초 그래미 수상 감격 “불가능이 현실로”
- [TVis] 전수경 父, 97세 믿기 힘든 건강 과시 “딸이 효녀” (‘아빠하고 나하고’)
- [TVis] 전수경 “5성급 호텔 스위트룸서 신혼 보내” (‘아빠하고 나하고’)
- [TVis] 그리, 해병대 전역 당일 녹화서 父 김구라에 전역 신고…조혜련·유세윤 울컥(‘라스’)
- [TVis] 유재석 “♥나경은에 옷때문에 맨날 혼나”…이덕화와 공감대 (‘유퀴즈’)
- ‘봄 농구’ 희망 살린 손창환 감독 “우리 농구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 [IS 승장]

치열한 경쟁과 도처에 위험이 도사린 사회가 주는 불안 탓일까. 최근 드라마들이 관심을 갖는 건 정신적인 문제들이다. ‘멘붕’이라는 신조어가 유행처럼 사용되고, ‘멘털 갑’, ‘멘털 관리’, ‘강철 멘털’ 나아가 ‘멘털 리셋’이라는 표현들이 나올 정도로 멘털은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올랐다. 그래서인지 외과의사들 중심으로 그려지곤 하던 의학드라마들이 정신과를 소재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영혼수선공’이나 ‘조선정신과의사 유세풍’,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같은 드라마들이 그 사례다. 그런데 멘털에 대한 관심은 비단 의학드라마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웰컴투 삼달리’ 같은 작품을 보면 경쟁적인 도시의 삶에서 상처입은 주인공이 제주도에 내려와 그 곳 사람들과 지내며 사랑을 이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그건 일종의 멘털 치유 과정 그 자체다. JTBC 토일드라마 ‘닥터 슬럼프’도 마찬가지다.
물론 ‘닥터 슬럼프’에는 성형외과 의사 여정우(박형식)와 마취과 의사 남하늘(박신혜)이 등장하고 그들이 병원에서 겪는 일들이 그려지지만 그렇다고 의학드라마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드라마에서 의사라는 직업이나 병원이라는 공간은 하나의 배경에 가깝다. 드라마가 실제로 다루는 건 그것들이 아니라, 그 곳에서 상처받은 이들이 그간 잃었던 일상을 되찾으며 치유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굳이 이들이 의사라는 직업으로 등장하는 건, 다소 반어법적인 강조의 뉘앙스가 더해져 있다. 누군가를 치료하고 치유하는 의사들도 아플 수 있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멘털의 문제는 이제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다는 걸 에둘러 알려주고 있다고나 할까. 이것은 또한 성공이라는 잣대로 선호하는 직업 1순위로서의 ‘의사’라는 직업의 허망함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진짜 인술에 뜻을 갖고 이 직업을 택하는 이들도 많지만, 성공하고 싶어 의사가 되는 이들도 적지 않은 세태가 아닌가. 학창시절부터 오로지 의대를 가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결국 의사가 되지만 그 곳에서의 경쟁 속에서 무너지고 난 후에야 비로소 잃어버린 것을 되돌아보는 ‘닥터 슬럼프’의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도 낯설지 않은 서사다.
잘 나가던 성형외과이자 인플루언서였던 여정우의 삶이 한 순간의 누명에 의해 망가지는 모습은 우리가 애써 성취했다고 여긴 것들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를 말해준다. 또 선배의사들에 의해 이용만 당하다 결국 우울증까지 갖게 된 남하늘은 경쟁적인 현실이 우리를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이들은 모두가 의심 없이 달려가는 막연한 성공을 향해 질주하게 되면서 오히려 일상의 행복들을 잃어가는 현대인들을 대변한다.
이런 전제를 깔아놓고 있어서인지 ‘닥터 슬럼프’는 사실상 액면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맨틱 코미디의 요소요소들이 새로운 의미로 그려진다. 공부만 하는 모범생으로만 살아와 바다 한 번 가보지 못한 이들이 보는 바다가 남다르게 다가오고 연애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한 이들의 연애가 특별하게 느껴지며 나아가 떡볶이를 사먹고 노래방이나 오락실을 가는 이른바 ‘노는’ 일상조차 새로운 가치로 다가온다.
이들은 생존경쟁과 각자도생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오던 삶에서 튕겨 나가 바깥에 놓이게 된 후에야, 자신들이 그토록 ‘노오력’해왔던 것들이 행복을 가져다주기는커녕 ‘우울증’으로 돌아오는 현실을 깨닫게 된다. 동시에 바깥으로 나오게 된 남하늘과 여정우가 동병상련으로 서로를 공감하다 사랑하게 되는 그 달달한 이야기는 그저 멜로의 차원을 넘어 우리 모두를 응원하고 위로하는 이야기로 다가온다. “잘못 산 것 같다”는 말에 “네 잘못 아니야”라고 해주는 말이 마치 아픈 이를 치유해주는 처방약처럼 예사롭지 않게 들린다.
한때 멜로가 대중의 시선을 끌지 못했던 건 그저 사적인 사랑타령에 대한 현실과의 괴리감 때문이었다. 그래서 멜로는 언젠가부터 그 사랑의 이면에 놓인 사회적 맥락들을 가져오기 시작했다. 결국 우리 시대의 사랑은 더 이상 낭만적일 수만은 없고 사회적 현실과 더 밀접해졌다는 반증이다. 그 언제든 ‘슬럼프’의 덫이 곳곳에 놓여 있는 사회가 야기하는 불안과 상처들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점점 더 위로와 응원에 가까워지고 있다.

정덕현 대중문화 평론가
[일간스포츠 김은구 기자]
당신이 좋아할 만한정보
AD
당신이 좋아할 만한뉴스
지금 뜨고 있는뉴스
행사&비즈니스
많이 본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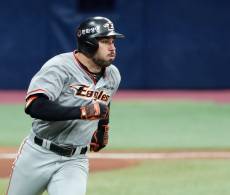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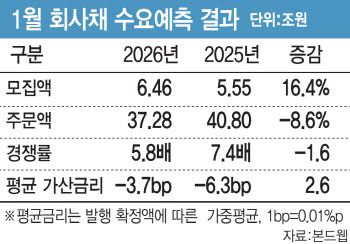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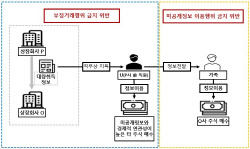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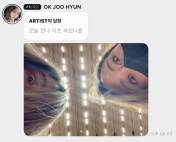






![[포토] 조인성, 조과장 하트에 심쿵](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4/isp20260204000345.400x280.0.jpg)
![[포토] 조인성, 멋진 조과장](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4/isp20260204000346.400x280.0.jpg)
![[포토] 박정민, 어색한 손가락 하트](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4/isp20260204000344.400x280.0.jpg)
![[포토] 박정민, 청청 패션 어때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4/isp20260204000341.400x280.0.jpg)
![[포토] 박해준, 수줍은 하트](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4/isp20260204000340.400x280.0.jpg)
![[포토] 박해준, 부드러운 카리스마](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4/isp20260204000342.400x280.0.jpg)
![[포토] 신세경, 미모에 홀릭](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4/isp20260204000339.400x280.0.jpg)
![[포토] 신세경, 아름다운 분위기](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4/isp20260204000343.400x280.0.jpg)
![[포토] '휴민트', 기대해도 좋아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4/isp20260204000350.400x280.0.jpg)
![[포토] '휴민트', 여러분들 하트 받으세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4/isp20260204000349.400x280.0.jpg)
![[포토] '휴민트', 멋진 주역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4/isp20260204000348.400x280.0.jpg)
![[포토] '휴민트' 화이팅](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4/isp20260204000336.4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