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트레이드 요청? 전혀 사실 아냐" LAC 떠나는 하든, "이건 비즈니스, 모두가 만족"
- QWER, 3월 20~22일 서울서 앙코르 콘서트 개최
- [영상] 스테이씨 수민-재이, ‘토끼멍즈’의 패션위크 나들이… 리더와 막내의 찰떡 케미
- [영상] EXID 엘리, ‘시크한 카리스마’…눈빛만으로 분위기 압도
- “허웅 대표팀 탈락? 희망이 컸으면 모르겠는데…” 이상민 감독이 본 명단 제외 [IS 고양]
- [영상] 케플러 휴닝바히에-히카루,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요정 아우라’
- [영상] 러블리즈 정예인, 시간이 멈춘 듯한 미모… ‘사랑스러움의 결정체’
- [영상] 오메가엑스 세빈-제현-케빈-예찬, ‘비주얼 어벤져스’…입덕 유발하는 4인 4색 매력
- [영상] AB6IX 박우진-위아이 김동한, “시크함 속 숨겨진 하트”… 무대 장인들의 패션위크 나들이
- [영상] 박유나-정지소, 패션위크 뒤흔든 우아한 자태… ‘여배우들의 시크 롱부츠’

“신선하고 재밌었어요. 다른 관점에서 영화를 찍는 법을 많이 배웠거든요.”
6년 만에 한국 영화 ‘더 킬러스’로 돌아온 심은경은 성숙한 분위기를 풍겼다. 생의 절반 이상을 배우로 살며 갖춘 내공에, 첫 일본 영화 ‘신문기자’로 지난 2020년 일본 아카데미 최우수 주연 수상자다운 관록도 붙었다. 금의환향이지만 내내 겸손했다. 오히려 이번 작품으로 새로 얻은 것이 많다고 힘줘 말했다.
지난 23일 개봉한 영화는 동명의 헤밍웨이 단편소설을 김종관 감독, 노덕 감독, 장항준 감독, 이명세 감독이 각기 다른 시선으로 해석하고 탄생시킨 4편의 살인극을 담은 시네마 앤솔로지다. 심은경은 이를 관통하는 뮤즈로서 각 작품에 주·조연으로 출연했다.
근래 흔치 않은 옴니버스 영화에 출연한 소감을 두고 그는 “배역을 바꿔 촬영하는 게 힘들지 않은지 많이 묻는데, 부담은 없었다. 그 어려움을 혼자가 아닌 감독님들과 함께하며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생각이 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소 작업해보고 싶던 감독님들 집합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고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총괄한 이명세 감독의 러브콜에 응한 까닭을 밝혔다.
“존경하는 이명세 감독님이 제게 제안을 주셨다니 믿기지 않았죠. 그렇지만 이야기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감독님께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이해할 필요는 없어. 그냥 이렇게 언젠간 알게 돼. 하던 대로 하면 된다’라고 하셨죠.”
영화의 피날레를 장식한 이명세 감독의 ‘무성영화’는 그 ‘하던 대로’ 이상의 과제를 심은경에게 안겨줬다. 화자인 ‘선샤인’이라는 웨이트리스 역을 맡아 과거 우리나라 사회상을 은유하는 메시지를 내레이션으로 읊는 동시에, 고전 무선영화처럼 움직임에 특화된 연기까지 도전했다.
“이명세 감독님이 리허설은 필수라고 강조하셨는데 정말 크게 공헌했어요. 매일 틈틈이 대본리딩하고, 동선을 맞추다 보니 제가 20년 연기를 했지만 간과했던 부분이 확실히 있더군요. 반복 연습으로 체화하면서 현장에 가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기도 하고, 그렇게 발전시키는 게 연기라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더 킬러스’의 다른 에피소드 또한 연기를 대하는 시각에 변화를 줬다. 그는 “굉장히 퇴폐적이고, 위험한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었기에 제가 욕심을 많이 냈다”며 김종관 감독의 ‘변신’을 돌아봤다. 뱀파이어 바텐더 주은을 연구하며 영화 ‘샤이닝’에서 레퍼런스를 찾거나, 바에서 흘러나오는 음악도 직접 선곡해 제안했고 그것이 채택되기도 했다. 잘못 납치된 피해자로 나온 노덕 감독의 ‘업자들’을 두고 그는 “짧은 시간 안에 수많은 연기 변화를 펼쳤다. 살려달라고 하다가 광기에 가까운 감정 증폭이 매력적이고 도전해 볼 만했다”고 돌아봤다. 사진 속 모델로만 등장한 장항준 감독의 ‘모두가 그를 기다린다’도 신선했다고 덧붙였다.
“연기가 쉽지 않다고 뼈저리게 느껴요. ‘더 킬러스’로도 반성했어요. 끊임없이 반복해 내 것으로 만드는 것도 일의 일부구나, 혹시 그간 놓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 연기를 이 작품의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2003년 드라마 ‘대장금’에 아역으로 데뷔해 대중성과 평단 양쪽을 사로잡은 필모그래피를 쌓고 있는 심은경이지만, 스스로는 만족보다는 부족을 실감하고 있다. “점점 연기를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평생 답을 못 찾을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계속하는 건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고, 그런 작품이 이번처럼 제게 와주기 때문이에요.”
이번 작품을 시작으로 ‘낮과 밤은 서로에게’를 비롯한 한국 차기작들이 공개를 기다리고 있다. 일본 활동과도 병행하는 동시에, 다른 나라의 좋은 작품에도 출연하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더 킬러스’는 제게 많은 용기를 준 작품이에요. 제 연기적인 실험이면서 이런 다양한 장르의 집합소를 대중에 선보이며 지속가능한 창작의 영감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전환점입니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당신이 좋아할 만한정보
AD
당신이 좋아할 만한뉴스
지금 뜨고 있는뉴스
행사&비즈니스
많이 본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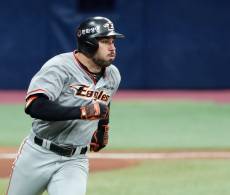






!['차기 연준 의장' 케빈 워시, 트럼프가 점찍은 이유[주톡피아]](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0401470T.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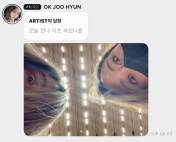






![[포토] 조인성, 조과장 하트에 심쿵](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4/isp20260204000345.400x280.0.jpg)
![[포토] 조인성, 멋진 조과장](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4/isp20260204000346.400x280.0.jpg)
![[포토] 박정민, 어색한 손가락 하트](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4/isp20260204000344.400x280.0.jpg)
![[포토] 박정민, 청청 패션 어때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4/isp20260204000341.400x280.0.jpg)
![[포토] 박해준, 수줍은 하트](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4/isp20260204000340.400x280.0.jpg)
![[포토] 박해준, 부드러운 카리스마](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4/isp20260204000342.400x280.0.jpg)
![[포토] 신세경, 미모에 홀릭](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4/isp20260204000339.400x280.0.jpg)
![[포토] 신세경, 아름다운 분위기](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4/isp20260204000343.400x280.0.jpg)
![[포토] '휴민트', 기대해도 좋아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4/isp20260204000350.400x280.0.jpg)
![[포토] '휴민트', 여러분들 하트 받으세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4/isp20260204000349.400x280.0.jpg)
![[포토] '휴민트', 멋진 주역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4/isp20260204000348.400x280.0.jpg)
![[포토] '휴민트' 화이팅](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4/isp20260204000336.4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