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오타니는 충분히 잡는다” WS 동료에서 WBC 라이벌로…커쇼 은퇴 마음 돌린 이유
- [TVis] 서범준·리정, 박나래·키 빈자리 채웠다…구성환→바자회 에피소드 공개 (나혼산)
- 김수미 “개코 수입 몰라, 아이 낳고 ‘내 삶 뭘까’ 생각”…과거 발언 재조명
- ‘단국대 vs 경희대’ 챔피언 더비 성사…대학축구 8강 대진 완성
- ‘사상 초유’ 경기 지연…KB, 강이슬 32점 앞세워 2연승→신한은행은 9연패
- [TVis] 김혜윤, 첫방부터 속사포 막말…상처받은 로몬 “미친 여자 아니야” (인간입니다만)
- [TVis] 손태진母, 둘째 딸 떠나보낸 슬픈 가정사…“숨만 쉬어도 감사” (편스토랑)
- ‘임짱’ 임성근 셰프, 학폭 의혹 해명…“학교를 안 다녔다”
- 현빈 ‘메이드 인 코리아’, 2025년 디플 공개작 중 최다 시청작
- [TVis] 손태진, 입 떡 벌어지는 스펙…“서울대 출신→6개 국어 능력자” (편스토랑)

한반도는 작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작습니다. 어느 곳에 살든지 간에 하루 만에 어느 곳이든 다녀올 수 있는 1일 생활권의 대한민국입니다. 요즘은 지역적 특색도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전국이 똑같은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가득합니다. 다양성이 없으면 재미도 없습니다. 전국이 똑같으면 굳이 여행을 다닐 필요가 없지 않겠는지요.
자연조건으로 보자면, 한반도는 참 넓습니다. 동으로는 산골이고, 서로는 평야입니다. 여름은 몬순인데 겨울은 대륙성 기후여서 극적인 계절 변화를 보입니다. 게다가 동해 남해 서해의 바다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한반도는 실로 다양한 먹을거리를 내어놓습니다. 계절을 따져 지역의 먹을거리를 챙겨 먹다 보면 한반도가 참 넓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사는 경기 북부는 진작에 영하로 떨어지고 눈도 왔지만, 저 먼먼 남녘의 섬에는 아직 겨울이 왔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12월에도 바람 없는 날에는 ‘반소매’를 입고 다니는 동네입니다. 요즘 제가 하는 일은 일기예보를 보며 남녘의 섬들이 언제 영하로 떨어지나 살피는 것입니다. 시금치를 사야 할 타이밍을 보는 것이지요.
지난여름에 시금치가 비싸다고 난리가 났었지요. 정부의 물가 관리에도 문제가 있지만, 원래 여름 시금치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고온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시금치는 겨울에 재배하는 작물이고 이때에 싸고, 또 무엇보다도 이때의 시금치가 맛있습니다.
여름에 시금치가 비싸다가 난리가 난 것은 시금치나물이 우리 식탁에 반드시 올려야 하는 음식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시금치는 비빔밥과 김밥에도 꼭 들어갑니다. 저는 겨울이 아니면 시금치나물에 젓가락을 잘 대지 않습니다. 맛이 없기 때문이다. 물컹한 식감에 비릿한 물맛까지 나는 시금치나물은 그 상에 놓인 다른 음식을 즐기는 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시금치는, 옛날에는 10월부터 3월까지 시장에 나왔었습니다. 맛있기로는, 겨울에서 이른 봄까지입니다. 그때에는 다들 시금치를 겨울에 먹는 푸성귀로 여겼습니다. 대한민국이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시금치는 1년 내내 재배하고, 먹는 푸성귀가 되었습니다.
시금치를 1년 내내 재배하고 1년 내내 먹는 일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철이 아니더라도 적절한 가격에 팔리면 자본주의적으로 올바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제철이 아닌 푸성귀를 비싸게 사 먹는 일은 피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금치를 사기 위해 남녘의 섬들이 영하로 떨어지는 날을 기다리는 이유는 그날 이후부터 시금치가 극도로 달아지기 때문입니다. 날씨가 영하로 떨어지면 시금치가 얼어 죽지 않으려고 몸에 당을 올리고 수분을 날립니다. 시금치가 추위에 잘 견딘다고 해도 하루 종일 영하의 온도에 있으면 제대로 자라지를 못합니다. 남녘의 섬들은 아무리 추워도 낮에는 햇살을 받아서 땅이 녹습니다. 낮에 광합성을 하여 모은 영양분을 밤이 되면 당으로 만들어서 잎사귀로 보낸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런 시금치는 웬만한 과일보다도 더 답니다.
시금치도 여느 작물과 똑같이 품종에 따라 맛 차이가 납니다. 토종 시금치를 만나는 행운은 바라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제가 다년간 맛을 본 바에 의하면, 또 지역 생산자 여러분의 품평을 검토해 보면 사계절 또는 사계절플러스 품종의 시금치가 맛있습니다. 생산 지역은 남해안 섬들이면 다 맛있습니다.
현명한 소비자는 겨울 시금치를 산지 직거래로 상자째 삽니다. 묶은 거 말고, 이른바 ‘벌크’로 담긴 것을 삽니다. 한나절 마루에 앉아 다듬어서 데치고 한 봉지씩 담아 냉동합니다. 이렇게 하면 싸고 맛있는 겨울 시금치를 장기간 먹을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대체로 비싼 것이 맛있습니다. 돈만 많으면 ‘자본주의적 미식가’ 대열에 끼일 수 있습니다. 비싼데 맛없는 것도 있습니다. 자연의 이치를 알고 그에 맞추어 살면 적어도 비싸고 맛없는 음식은 피할 수가 있습니다. 싸고 맛있을 때를 아는 사람이 진정한 미식가입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당신이 좋아할 만한정보
AD
당신이 좋아할 만한뉴스
지금 뜨고 있는뉴스
행사&비즈니스
많이 본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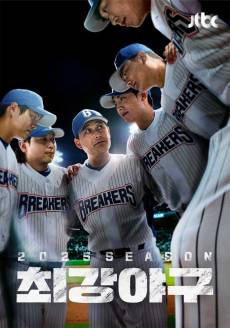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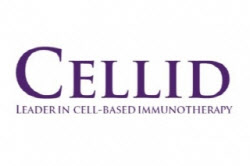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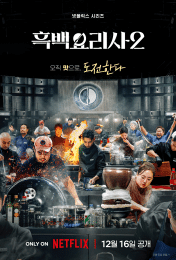



![[포토] '슈가' 화이팅](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5/isp20260115000302.400x280.0.jpg)
![[포토] '슈가' 주역들의 아름다운 가족사진](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5/isp20260115000301.400x280.0.jpg)
![[포토] '슈가' 재미있게 봐주세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5/isp20260115000303.400x280.0.jpg)
![[포토] '슈가' 빛나는 주역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5/isp20260115000299.400x280.0.jpg)
![[포토] 최지우, 비타민 손인사](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5/isp20260115000298.400x280.0.jpg)
![[포토] 최지우, 아름다운 분위기](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5/isp20260115000300.400x280.0.jpg)
![[포토] 고동하, 귀여운 손인사](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5/isp20260115000296.400x280.0.jpg)
![[포토] 훌쩍 커버린 '슈가' 고동하](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5/isp20260115000297.400x280.0.jpg)
![[포토] 민진웅, 완벽 올블랙 슈트핏](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5/isp20260115000292.400x280.0.jpg)
![[포토] 민진웅, 멋진 손인사](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5/isp20260115000294.400x280.0.jpg)
![[포토] 최신춘 감독, '슈가' 화이팅](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5/isp20260115000293.400x280.0.jpg)
![[포토] 포즈 취하는 최신춘 감독](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5/isp20260115000295.4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