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승엽 전 두산 감독, 저소득층 환아 수술비 6000만원 기부
- 폰세급? 제2의 감보아? 롯데 외국인 투수 듀오 향한 두 가지 시선
- ‘흑백요리사2’ 오늘(13일) 최종회 공개…대망의 우승자는?
- ‘이범수와 이혼’ 이윤진, 리조트 한국 대표 됐다… “새출발” [IS하이컷]
- '김호 QC 코치' KT 2026 코치진 구성 완료, 주형광·이영수 등 육성군 합류
- ‘이범수와 이혼’ 이윤진, 기쁜 소식 전했다… “새출발” [AI 포토컷]
- '올해도 괌→오키나와' 삼성, 후라도·구자욱·원태인·배찬승은 WBC 스케줄 맞춰 합류
- “심판은 형편없었다” BOS 브라운, 5100만원 벌금 징계
- 진세연 → 김승수, 파란만장 가족 라이프... 오는 31일 첫 방송 (사랑을 처방해 드립니다)
- ‘케데헌’ 이재, 美 골든글로브 수상에 “23년 시련 끝에…약혼자에 감사”
[인터뷰②] 양익준 "익숙함? 창작자에겐 혐오 DNA"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말이 딱이다. 평생 따라붙을 대표작 '똥파리' 한 편은 이미 챙겼다. 감독으로서 컴백은 막연히 미뤄두고 배우 양익준으로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누빈 그는 올해만 영화 '시인의 사랑', 일본 영화 '아, 황야' 그리고 12월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 OCN '나쁜 녀석들'까지 줄줄이 선보이고 있다. 시인이 됐다, 복싱 선수가 됐다, 또라이 형사 옷도 입은 양익준이다. 비슷한 듯 다르게 본인 특유의 매력까지 살려내는 찰떡같은 소화력은 양익준을 계속 보고싶고 궁금하게 만드는 배우로 성장시켰다.
꽁꽁 감추기 보다는 더 드러내는 삶을 택했다. 답답함에서 벗어나고자 소속사를 나와 홀로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은 괜찮다"는 반응이다. 떠나고 싶을 때 해외로 떠나고, 글 쓰고 싶을 때 글 쓰고, 연기하고 싶을 때 연기하는 것도 결국 양익준의 능력이다. 의상까지 직접 준비해 코디하는 부지런함은 혀를 내두르게 한다.
일상적인 인터뷰도 일상적이지 않게 만드는 것은 결국 배우의 답변이다. 쉬운 듯 쉽지 않은 이야기를 쏟아낸 양익준은 '예술가' '아티스트'로 보이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이미 그 세계에 깊이있게 발을 들여놓은 것인지 다소 헷갈리게 만들지만 보편적이고 평범한 것을 거부하는 것 만큼은 확실하다. 여전히 날 것 그대로의 매력을 지켜내고 있는 양익준의 행보에 기대가 더해지는 이유다.
※인터뷰①에서 이어집니다.

- 영화인은 예술인으로 표현될 수 있다. 어디에서 주로 영감을 얻나.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아날로그. CD 플레이어를 다시 갖다 놓고, 타자기도 샀다. 내가 상업고등학교를 나와서 타자기를 쳤다. 노트북도 세로형을 쓴다. 시나리오를 쓸 수 있는 컴퓨터다. 가로형 컴퓨터에는 글을 못 쓴다. '똥파리' 시나리오는 노트에 볼펜으로 썼다. 핑계를 대자면 그래서 '똥파리' 이후로 글을 못 쓰고 있는 지점도 있다.(웃음)"
- 현대 문명과 멀어지려는 계획인가.
"그건 아닌데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은 있다. 국내든 해외든 상관없다. '똥파리'를 찍고 정신적으로 지쳐 2010년에 제주도에 다녀왔다. 이후에는 언어도 잘 안 통했으면 싶어 대부분 일본에 가 있었다. 필리핀도 갔다. 영어는 진짜 1도 못한다.(웃음) 근데도 돼지·염소 돌아다니는 완전 시골을 찾았다. 타르락이라고 마닐라에서 3시간 정도 고속도로를 타고 들어가야 한다."
- 얻은 것이 있다면.
"해외 영화의 에너지를 느끼면서 그들이 바라보는 한국 영화의 에너지를 새삼 깨닫게 되더라. 안에 있으면 잘 모르지 않나. 이란·필리핀 영화들을 보면 에너지가 좋다. 근데 일본 영화인들은 한국 영화가 좋은 이유로 야생성을 꼽는다.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 습관적인 습관일 수 있다.
"맞다. 한국이라는 곳에, 한국에서라는 것에 한계를 느끼는 애들이 잘 나간다. '한국을 넘어보자'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이명세 감독님 어머니가 그러셨다더라. '명세야. 넌 한국인이 아니라 세계인이야. 우리는 지구에서 태어났잖아.' 존경한다. 한국이라는 것이 뭔데.(웃음)"
- 익숙함을 싫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익숙하다'는 단어는 창작자에게 혐오에 가까운 단어다. 그냥 혐오가 아니라 완전 혐오다. 익숙함에 빠져있는 순간부터 정지돼 있다. 창작의 어떤 DNA 자체가 사라진다고 해야 하나? 인간은 동물이다. 창작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동물이 창작에 익숙해진다면 화석화 된다는 것과 똑같다. 화석이 된 상태에서 작품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은데 시간이 지나면, 한 세대가 지나면 완전히 굳어 버린다."
- 벗어나기 위해 일상에서 특별히 노력하는 것도 있나.
"'똥파리'를 30대 초반에 찍었는데 지금 40대 초반이 됐다. 지금 10대와는 전혀 다른 세대가 됐고, 간극은 더 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세대 친구들과 어떻게 교감하고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 그 친구들이 나를 보면 그저 '노땅'일 수 있다. 근데 나는 소통하고 싶다. 내 연기·연출 모티브 대상은 10대다. 중2부터 고2~고3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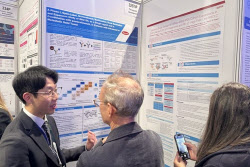










![[포토] 알파드라이브원, 순간 모인 훈남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2/isp20260112000287.400x280.0.jpg)
![[포토] 알파드라이브원, 어두운 무대에서도 빛이 나](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2/isp20260112000286.400x280.0.jpg)
![[포토] 알파드라이브원, 멋짐 가득](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2/isp20260112000284.400x280.0.jpg)
![[포토] 알파드라이브원, 무대를 부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2/isp20260112000285.400x280.0.jpg)
![[포토] 알파드라이브원, 중독성 강한 무대](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2/isp20260112000282.400x280.0.jpg)
![[포토] 알파드라이브원, 파워풀한 동작에 빠져들어](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2/isp20260112000288.400x280.0.jpg)
![[포토] 알파드라이브원, 신나는 무대](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2/isp20260112000283.400x280.0.jpg)
![[포토] 알파드라이브원, 다같이 손들어~](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2/isp20260112000281.400x280.0.jpg)
![[포토] 알파드라이브원, 딱딱 맞는 군무](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2/isp20260112000280.400x280.0.jpg)
![[포토] 알파드라이브원, 칼군무](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2/isp20260112000279.400x280.0.jpg)
![[포토] 알파드라이브원, 무대 장인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2/isp20260112000278.400x280.0.jpg)
![[포토] 알파드라이브원, 스웨그 가득한 동작](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2/isp20260112000273.4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