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최다득표, 라운드 MVP...국대 클래스 김다인
- '쿠팡 빈자리 치고 들어갑니다~' 역대 최장기간 설 선물 대전 나선 대형마트 백화점
- 아이유·변우석·전지현·이나영·장나라…인기 시리즈·대하사극, 기대작 쏟아진다 [2026 방송 라인업]
- [단독] 이병헌 “오스카 레이스, 아이돌 마음 이해…내 인생의 ‘현상’” [신년인터뷰]
- 20편밖에 없지만…‘휴민트’ ‘호프’ ‘국제시장2’ 큰 한 방 있다 [2026 韓영화 라인업]
- 붉은 말의 해, 다시 달릴 '말띠' 송재철 기수와 심승태 조교사
- ‘꽃미남 라면가게’ 조윤우, 결혼+은퇴한다… “소중한 인연 생겨”
- [TVis] ‘나솔’ 28기 정희, 성수동 올 리모델링 아파트… “♥광수 자주 놀러와” (홈즈)
- 한고은 “소주 7병, 억지로 먹은 거 아니다” 과거 발언 해명
- [TVis] 염유리, 췌장암 말기 어머니 생각하며 재도전… 무대는 ‘올하트’ (미스트롯4)
야구
김선우의 직구 고집, 다음 등판때도 계속되나?
등록2008.04.03 09:56

해외파 김선우(31·두산)가 또 직구만 고집하다 쓴맛을 봤다. 김선우는 한국 프로야구 데뷔전인 지난 2일 광주 KIA전에서 선발 4이닝 동안 7안타 2사사구(1탈삼진) 4실점하고 패전 투수가 됐다.
패인은 직구 위주의 피칭에 있었다. 김선우는 이날 던진 71개의 공 가운데 50개(70%)를 직구로 뿌렸다. 변화구 구사율을 높인 3회를 제외하곤 결과는 좋지 않았다.
7개의 피안타 가운데 1회 이현곤에게 맞은 안타(커브)를 제외하곤 6개의 안타가 직구를 던져 얻어맞았다. 직구만을 노리고 들어온 KIA 타자들에게 입맛에 맞는 공을 던져준 셈이다.
투수에게 가장 좋은 무기가 강속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아무리 좋은 변화구도 빠른 공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그 위력은 반감된다.
하지만 제구력이 뒷받침되지 않거나 공끝이 없는 직구도 난타를 당한다. 김선우는 일단 실패의 원인으로 전자를 꼽았다.
경기 후 “포수 채상병과 직구 위주의 피칭을 하기로 했는데 제구가 잘 되지 않았다. 몸쪽을 요구하면 바깥쪽으로 공이 들어갔고 그것이 안타로 이어졌다. 직구의 힘이 떨어졌다고 생각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과연 제구만의 문제일까. 김선우는 이날 최고 148㎞를 찍었고, 직구 평균 구속은 143~144㎞를 기록했다. 선발 투수로서 타자와 충분히 싸울 수 있는 구속이지만 타자들 압도하는 구속은 아니었다.
김선우는 이전에도 직구를 고집하다 봉변을 당한 적이 있다. 베이징올림픽 최종 예선 스페인전에서 선발 5이닝 동안 7안타를 얻어맞고 4실점했다. 마이너리그 싱글A도 수준도 안되는 타자들에게 뭇매를 맞은 것이다.
당시에도 김선우는 비슷한 말을 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직구의 힘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타자들이 느끼기에는 공끝이 무뎌 보였나 보다.”
김선우는 개막 전 “한국 타자들의 선구안과 원하는 공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커트하는 능력은 메이저리그보다 뛰어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럼에도 ‘쳐 볼테면 쳐 봐라”는 식으로 직구만을 뿌려댔다.
벤치의 김경문 감독은 어떻게 봤을까. 김 감독은 “(김)선우가 많은 걸 느꼈을 것이다”는 말로 평가를 대신한 뒤 “직구만으로 살아남기는 힘들다. 변화구를 던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페넌트레이스는 시범경기가 아닌 ‘실전’이다. 이후에도 직구 위주의 볼배합을 가져갈지 김선우의 다음 등판이 주목된다.
광주=정회훈 기자 [hoony@joongang.co.kr]
사진=김진경 기자
당신이 좋아할 만한정보
AD
당신이 좋아할 만한뉴스
지금 뜨고 있는뉴스
행사&비즈니스
많이 본뉴스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정조준…집행 속도낸다[only 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1/PS26010200017T.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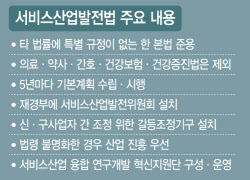








![[포토] 정소민, 파격적인 드레스 뒤태](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31/isp20251231000268.400x280.0.jpg)
![[포토] 정소민, 우아한 걸음걸이로 퇴장](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31/isp20251231000266.400x280.0.jpg)
![[포토] 정소민, 아름다움에 홀릭](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31/isp20251231000267.400x280.0.jpg)
![[포토] 김지훈, 카리스마 눈빛](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31/isp20251231000264.400x280.0.jpg)
![[포토] 김지훈, 걸음걸이도 완벽한 테리우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31/isp20251231000263.400x280.0.jpg)
![[포토] 김지훈, 턱시도 핏이 이렇게 잘 어울릴 일?](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31/isp20251231000265.400x280.0.jpg)
![[포토] 정소민, 아름다운 순백의 여신](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31/isp20251231000262.400x280.0.jpg)
![[포토] 정소민, 여신의 걸음걸이](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31/isp20251231000260.400x280.0.jpg)
![[포토] 전여빈, 러블리한 볼하트](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31/isp20251231000257.400x280.0.jpg)
![[포토] 정소민, 우아함 종결자](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31/isp20251231000261.400x280.0.jpg)
![[포토] 전여빈, 우아한 블랙 드레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31/isp20251231000259.400x280.0.jpg)
![[포토] 윤계상, 완벽한 슈트핏](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31/isp20251231000258.4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