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캐스팅 이후 ‘대박’… 유해진X박지훈 ‘왕과 사는 남자’, “복 받은 캐스팅” [종합]
- [영상] ‘왕과 사는 남자’ 유해진·박지훈, 왕사남 바로 저장각! …케미 폭발한 유쾌한 포토타임
- ‘왕사남’ 장항준 감독 “실록 두 줄에서 시작…역사 자문 교수 많아”
- ‘왕사남’ 박지훈 “혼자 방에 앉은 장면에 눈물 터져…아직도 생생”
- ‘왕사남’ 유해진 “박지훈, 눈만 봐도 전해지는 감정”
- 노시환, 연봉 10억원 사인...김서현도 200% 인상 → 준우승 한화 협상 훈풍
- 가수 하루, 신곡 ‘잘 지내요’ 카카오뮤직 실시간 차트 1위 등극
- 돌고래유괴단 “법원, ‘뉴진스 뮤비’ 저작권 침해 NO…계약위반 판단에 항소” [공식]
- ‘이사통’ 고윤정, 김선호와 데이트 포착…현실 커플 무드 [IS하이컷]
- 실패한 박병호·황재균이 돈과 도전 사이에 놓인 후배들에게..."값진 경험"
스포츠일반
침체된 한국복싱, 부활의 진군 시작
등록2011.08.18 10:01

멈춰있던 한국 복싱이 전진하기 시작했다.
복싱대표팀은 지난 13일 인천에서 막을 내린 아시아복싱선수권에서 49㎏급 신종훈(22·서울시청)과 81㎏급의 김형규(19·한체대)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64㎏급 박상혁(20·한체대)이 은메달, 56㎏의 이진영(24·상무)이 동메달을 추가했다. 한국은 2004년 이후 7년만에 3위 안에 진입하는 쾌거를 이뤘다. 홈링의 이점을 감안해도 기대 이상의 수확이었다.
한국 복싱의 침체는 길었다. 올림픽에서는 2000년 시드니 대회 이후 김정주가 2개의 동메달을 따낸 게 전부였고, 아시안게임에서도 2006년과 2010년 모두 노골드에 머물렀다. 대한아마튜어복싱연맹(이하 연맹)과 국제복싱연맹(AIBA)의 충돌로 국제대회 출전 징계까지 받는 외환도 겪었다.
그러나 지난 1년 사이 한국 복싱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지난 1월 사상 처음으로 공채를 실시해 이승배(40) 감독을 선임했다. 이 감독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동메달,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은메달리스트로 은퇴 뒤 박사 학위를 따기도 했다.
이 감독은 세계적인 흐름인 파워 복싱을 따라가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새로운 지도법을 제안했다. 라운드가 끝나야 점수가 공개되는 새 채점제도에 따라 공격적인 복싱을 할 것도 주문하고 있다. 신종훈은 "새로운 훈련방식이 맘에 든다. 또 감독님이 선수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 주시는 편이라 더욱 믿음이 간다"고 말했다.
젊어진 대표팀 분위기도 희망적이다. 과거의 '헝그리 정신' 대신 '즐겁게 하자'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복싱을 하고 있으면 시원한 느낌이 든다"는 박상혁의 말처럼 선수들의 의욕이 대단하다. 이승배 감독은 "대표팀이 전체적으로 어려져서 경험이 부족하다. 그러나 전지훈련을 통해 많은 대회에 참가했고, 효과가 점점 나고 있다"고 말했다.
복싱 대표팀은 다음달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에 출전한다. 이승배 감독은 "세계선수권에서 최대한 좋은 성적을 내 5~6장의 올림픽 출전권을 따내고 싶다. 물론 최종목표는 16년만의 올림픽 금메달이다. 조금씩 다가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효경 기자 [kaypubb@joongang.co.kr]
당신이 좋아할 만한정보
AD
당신이 좋아할 만한뉴스
지금 뜨고 있는뉴스
행사&비즈니스
많이 본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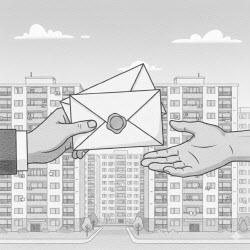










![[포토] 에이엠피 김신, 뽀뽀 쪽](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1/isp20260121000206.400x280.0.jpg)
![[포토] 에이엠피 '최장신' 김신](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1/isp20260121000207.400x280.0.jpg)
![[포토] 에이엠피 김신, 시크한 볼하트](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1/isp20260121000208.400x280.0.jpg)
![[포토] 에이엠피 크루, 푸처핸섭](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1/isp20260121000205.400x280.0.jpg)
![[포토] 에이엠피 크루, 사랑스러운 하트](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1/isp20260121000203.400x280.0.jpg)
![[포토] 에이엠피 크루, 멋진 볼하트](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1/isp20260121000209.400x280.0.jpg)
![[포토] 에이엠피 하유준, '패스' 무대 기대해 주세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1/isp20260121000204.400x280.0.jpg)
![[포토] 에이엠피 하유준, 귀엽게 브이](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1/isp20260121000202.400x280.0.jpg)
![[포토] 에이엠피 하유준, 금발로 변신](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1/isp20260121000201.400x280.0.jpg)
![[포토] 에이엠피 주환, 카리스마 작렬](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1/isp20260121000200.400x280.0.jpg)
![[포토] 에이엠피 주환, 눈빛으로 압도하는 분위기](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1/isp20260121000210.400x280.0.jpg)
![[포토] 에이엠피 주환, '패스' 피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1/isp20260121000199.4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