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손흥민도 제친 안세영, 스포츠 선수 넘버원 브랜드 확인...'글로벌 스포츠 리더십' 부문 수상
- [영상] ‘은애하는 도적님아’ 문상민, ‘연상연하 대신 오빠美로 리드’…“남지현에게 좋은 자극 받았다”
- ‘제10회 국가브랜드컨퍼런스’ 개최... 소녀시대 윤아 문화 부문 수상
- 안효섭, 전 세계 어린이에 따뜻한 손길…유니세프 5천만원 기부
- [영상] ‘은애하는 도적님아’ 남지현, 8년 만의 사극 컴백 “뜻깊어…다양한 캐릭터 보여드릴 것”
- K리그2 충북청주, 포르투갈 출신 마누엘 레이스 감독 선임…“공격 축구 추구한다”
- ‘믿보’ 남지현X‘대군상’ 문상민, 사극 로맨스로 만났다…‘은애하는 도적님아’ KBS 살릴까 [종합]
- 김수용, ‘20분 심정지’ 긴박했던 그날 공개…“전기충격만 11번” (김숙티비)
- 어도어, 다니엘 등 431억 손배 소송... ‘민희진 사건’ 심리한 재판부 배당 [왓IS]
- '해킹' KT, 전체 고객 위약금 면제…데이터·OTT 보상 프로그램도
연예
불법 경마 잡으면 복지가 해결된다
등록2014.11.21 07:00
경마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가 시작돼야 할 시점이다.
사회적인 합의와 정부의 입장만 달라지면 경마 하나만으로도 양분된 한국 사회를 봉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1C 한국 사회는 '보편적인 복지'와 '선택적인 복지'를 놓고 양분돼 있다. 핵심은 재원부족이다.
경마는 영국 왕실이 즐기는 스포츠이고 미국 대선주자도 마주로 참여하는 레저스포츠다. 호주의 유명 경마인 '멜번컵'은 축제이고 홍콩에서는 거대한 복지기금이다. 선진국 경마는 즐기는 레저 스포츠지만 한국에서 경마는 '죄악'으로 폄훼되고 있다.
선진국이 경마를 도박이 아닌 레저스포츠로 인정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다. 복지 재원의 한 축을 경마가 담당하기 때문이다.
한국 경마는 2013년 7조7035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1조6575억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2013년 사감위(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불법도박 시장은 75조, 국정원에서는 88조로 보고 있다.
2012년 사감위 자료는 사설경마 시장이 10조, 2013년 형사정책연구원 추산 자료는 최대 33조로 보고 있다. 사감위와 형사연구원 자료의 평균치로 보면 불법 경마시장은 20조 정도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불법 경마 시장의 20조가 합법 경마 시장으로 편입되면 경마는 매년 약 28조(불법20조+합법7조7035억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 경마가 28조의 매출을 올리면 6조1432억원(세금 4조4800억원+기금 1조6632억원)정도의 재원이 마련된다. 수치상으로는 경마 하나만으로도 3~5세 누리과정(2015년 예산 3조9284억원)과 의무급식(2015년 예산 2조 6239억원 ) 예산인 6조5523억원의 상당부분(93.8%)을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사회에서 경마가 '죄악'이 된 이유는 일제 강점기 시작된 '과거사' 때문이다.
한국 경마는 1922년 4월 5일 조선경마구락부로 시작했고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인 수탈의 도구로 활용했다. 일제강점기 신설동에서 시작된 경마 수익금은 일본의 전쟁비용으로 편입됐다. 당연히 경마는 백안시 됐다. 그런데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도 경마에 대한 인식은 바뀌지 않았다. 6.25동란·군사독제를 거치면서 이미지 개선 시점을 잡지 못했다. 또 정부정책도 경마를 어둡게만 했다. 세금을 걷기만 할 뿐 경마의 순기능은 알리지 않았다. 알려서 좋을 게 없다는 판단이었다. 정부시책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 오죽하면 경마 시행체인 KRA한국마사회는 지상파에 공익광고 조차 할 수 없다.
최근에는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장외 지점 개설을 사회 이슈로 확대 재생산하면서 경마의 부정적 이미지만 확대 됐다. 이밖에 KRA한국마사회의 무능도 이유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경기권 도시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지 못하면서 기반을 상실했다.
채준 기자
[레이싱긱 안드로이드 다운 받기]
[레이싱긱 아이폰 다운 받기]
사회적인 합의와 정부의 입장만 달라지면 경마 하나만으로도 양분된 한국 사회를 봉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1C 한국 사회는 '보편적인 복지'와 '선택적인 복지'를 놓고 양분돼 있다. 핵심은 재원부족이다.
경마는 영국 왕실이 즐기는 스포츠이고 미국 대선주자도 마주로 참여하는 레저스포츠다. 호주의 유명 경마인 '멜번컵'은 축제이고 홍콩에서는 거대한 복지기금이다. 선진국 경마는 즐기는 레저 스포츠지만 한국에서 경마는 '죄악'으로 폄훼되고 있다.
선진국이 경마를 도박이 아닌 레저스포츠로 인정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다. 복지 재원의 한 축을 경마가 담당하기 때문이다.
한국 경마는 2013년 7조7035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1조6575억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2013년 사감위(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불법도박 시장은 75조, 국정원에서는 88조로 보고 있다.
2012년 사감위 자료는 사설경마 시장이 10조, 2013년 형사정책연구원 추산 자료는 최대 33조로 보고 있다. 사감위와 형사연구원 자료의 평균치로 보면 불법 경마시장은 20조 정도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불법 경마 시장의 20조가 합법 경마 시장으로 편입되면 경마는 매년 약 28조(불법20조+합법7조7035억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 경마가 28조의 매출을 올리면 6조1432억원(세금 4조4800억원+기금 1조6632억원)정도의 재원이 마련된다. 수치상으로는 경마 하나만으로도 3~5세 누리과정(2015년 예산 3조9284억원)과 의무급식(2015년 예산 2조 6239억원 ) 예산인 6조5523억원의 상당부분(93.8%)을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사회에서 경마가 '죄악'이 된 이유는 일제 강점기 시작된 '과거사' 때문이다.
한국 경마는 1922년 4월 5일 조선경마구락부로 시작했고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인 수탈의 도구로 활용했다. 일제강점기 신설동에서 시작된 경마 수익금은 일본의 전쟁비용으로 편입됐다. 당연히 경마는 백안시 됐다. 그런데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도 경마에 대한 인식은 바뀌지 않았다. 6.25동란·군사독제를 거치면서 이미지 개선 시점을 잡지 못했다. 또 정부정책도 경마를 어둡게만 했다. 세금을 걷기만 할 뿐 경마의 순기능은 알리지 않았다. 알려서 좋을 게 없다는 판단이었다. 정부시책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 오죽하면 경마 시행체인 KRA한국마사회는 지상파에 공익광고 조차 할 수 없다.
최근에는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장외 지점 개설을 사회 이슈로 확대 재생산하면서 경마의 부정적 이미지만 확대 됐다. 이밖에 KRA한국마사회의 무능도 이유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경기권 도시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지 못하면서 기반을 상실했다.
채준 기자
[레이싱긱 안드로이드 다운 받기]
[레이싱긱 아이폰 다운 받기]
당신이 좋아할 만한정보
AD
당신이 좋아할 만한뉴스
지금 뜨고 있는뉴스
행사&비즈니스
많이 본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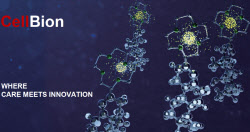










![[포토] 영케이, 귀여운 손인사](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25/isp20251225000212.400x280.0.jpg)
![[포토] SBS 가요대전 3MC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25/isp20251225000213.400x280.0.jpg)
![[포토] 엔시티 드림, 백마 탄 왕자님들 여기 다 모였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25/isp20251225000209.400x280.0.jpg)
![[포토] 엔시티 드림 마크, 귀엽게 팔 흔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25/isp20251225000211.400x280.0.jpg)
![[포토] 아이브 장원영, 눈맞춤에 심쿵](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25/isp20251225000207.400x280.0.jpg)
![[포토] 아이브 장원영, 럭키비키 워킹](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25/isp20251225000206.400x280.0.jpg)
![[포토] 아이브, 산타걸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25/isp20251225000208.400x280.0.jpg)
![[포토] 아이브 안유진, 아름다운 드레스 자태](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25/isp20251225000205.400x280.0.jpg)
![[포토] 스트레이 키즈, 멋진 무대 기대해 주세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25/isp20251225000204.400x280.0.jpg)
![[포토] 스트레이 키즈 필릭스, 왕자님 비주얼](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25/isp20251225000200.400x280.0.jpg)
![[포토] 스트레이 키즈 현진, 시크한 손인사](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25/isp20251225000203.400x280.0.jpg)
![[포토] 에이티즈 산, 멋진 손인사](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25/isp20251225000201.4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