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여왕’ 지소연 결승 PK골…여자축구, 대만 꺾고 20년 만에 동아시안컵 우승
- 펜타곤 후이, 전속계약 종료…큐브 측 “부상 회복 물심양면 지원”[공식]
- 아이유 리메이크에 박혜경 ‘빨간 운동화’ 저작권료 180배 뛰었다
- 이연복 이름 건 국밥 밀키트서 대장균 검출…“전적인 책임 질 것” 사과 [왓IS]
- 이븐, 굉장한 반전 매력
- 스타쉽 新 보이그룹 아이딧, 프리데뷔 앞두고 콘셉트 포토 공개
- 블랙핑크 ‘뛰어’ 글로벌 질주 중…스포티파이 톱 송 사흘 연속 1위
- 방시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고발돼…하이브 ‘오너 리스크’ 현실화 [종합]
- ‘박지현 18점’ 여자농구, 인도네시아 완파…4강 진출 결정전 유력
- 금융당국, 하이브 방시혁 의장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 고발
경제
'갑질' 피자헛·미스터피자 고전…중소형 피자 약진
등록2016.12.27 07:00

피자 업계의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대형 브랜드 빅3 중 두 곳이 고전하고 있는 사이에 중소형 브랜드가 약진하고 있다. 실적이 나쁜 빅2는 '갑질' 논란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곳으로 인과응보라는 지적이다.
주춤하는 대형 피자…도미노만 성장
26일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은 2015년을 기준으로 한 10개 피자 프랜차이즈 비교 정보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10개 피자 브랜드 중 2015년 가맹점 연평균 매출액이 가장 높은 곳은 도미노피자였다.
도미노피자는 피자헛·미스터피자를 포함한 빅3 피자 브랜드 중 유일하게 실적이 증가했다.
도미노피자를 운영하는 청오디피케이의 지난해 매출은 1953억원으로, 2014년 1805억원보다 8.2% 증가했다. 2013년에는 1703억원으로 최근 3년 동안 매년 100억원 이상씩 꾸준히 늘었다.
영업이익도 증가세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227억원으로 전년 132억원보다 72% 급증했다. 2013년 112억원과 비교했을 때는 2배 이상 늘었다.
도미노피자 관계자는 실적 성장 이유에 대해 "신제품 출시와 함께 가맹점과 원활하게 소통한 것이 플러스 요인이 됐다"고 말했다.
반면 피자헛과 미스터피자는 내림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피자헛의 지난해 매출은 893억원으로, 2014년(1142억원) 보다 249억원이나 감소했다. 피자헛은 2013년 매출이 1451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매년 줄고 있다.
영업손실도 2013년 2억원 적자를 기록한 이후 작년에는 206억원으로 적자폭이 더욱 커졌다.
더구나 피자헛은 장사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이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피자헛 레스토랑형 매장을 하려면 최초 가맹비 8852만원에 인테리어·설비 및 집기 등 비용 3억7800만원으로 총 4억6652만원을 내야 한다. 가맹점 면적 100㎡(약 30평) 이하 형태에서도 피자헛 배달 형태의 창업비용은 2억3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미스터피자도 비슷한 상황이다. 운영사 MPK그룹의 지난해 매출은 1103억원으로, 2013년(1703억원), 2014년(1428억원)에 이어 계속 하락세다.
영업이익도 매년 줄다가 지난해 72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가맹점 폐점률도 7.5%로 빅3 피자 브랜드 중 가장 높았다. 2014년에는 0.9%에 불과했던 것이 1년 사이에 8배 가량 급증했다.
부진의 늪에 빠진 피자헛과 미스터피자는 공교롭게 지난해 갑질 논란으로 도마에 올랐다.
피자헛은 가맹점주들에게 강제로 합의서를 요구해 가맹계약서에는 없는 어드민피를 받아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미스터피자는 광고판촉비를 가맹점주에게 전가하고 원재료를 비싸게 납품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심지어 올해는 정우현 MPK그룹 회장이 경비원을 폭행하는 등 논란으로 벌써 60여 곳이 문을 닫았다.
MPK그룹 관계자는 "최근 다이닝(외식) 사업이 전반적으로 좋지 못하다보니 기존 사업자들이 업종을 전환하는 등으로 가맹점주들이 많이 빠지면서 실적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중소형 피자 '약진'
빅2 브랜드가 주춤하는 사이 중소형 브랜드들은 약진했다.
피자알볼로는 가맹점 연평균 매출액이 5억2145만원으로 도미노피자 다음으로 높았다. 이는 가맹점 연평균 매출액이 4억원대인 미스터피자와 피자헛보다 높은 수준이다.
가맹점 증가율도 26.3%로 가장 높았고, 신규 개점률도 20.8%에 달했다. 지난해 폐점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성장성 측면에서도 피자알볼로는 자산 증가율이 116%로 가장 높았다.
오구피자는 부채비율 13.3%로 가장 낮고 자본비율은 88.1%로 가장 높아 안정성이 가장 우수했다.
가맹점 수로는 피자스쿨이 822개로 가장 많았다.
피자나라치킨공주는 3.3㎡(약 1평) 면적 당 소요되는 인테리어 비용이 154만원으로 가장 적었고, 영업이익 증가율은 166.5%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폐점한 가맹점은 없었다.
뽕뜨락피자는 가맹점 신규개점률이 21.9%로 가장 높았지만 폐점률도 8.7%로 높은 수준이었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당신이 좋아할 만한정보
AD
당신이 좋아할 만한뉴스
지금 뜨고 있는뉴스
행사&비즈니스
많이 본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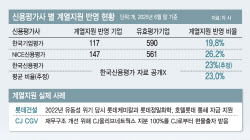
![베트남 포토부스 폭행 여성 “나도 신상 유출된 피해자” [영상]](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7/PS25071601254T.jpg)








![[포토] 아크, 사랑스러운 소년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7/16/isp20250716000494.400x280.0.jpg)
![[포토] 아크 '호프'로 컴백했어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7/16/isp20250716000495.400x280.0.jpg)
![[포토] 아크, 세 번째 미니 앨범 '호프'로 컴백](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7/16/isp20250716000496.400x280.0.jpg)
![[포토]이프아이 카시아, 신비스러운 눈빛](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7/16/isp20250716000493.400x280.0.jpg)
![[포토] 아크 도하, 시크한 춤선](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7/16/isp20250716000482.400x280.0.jpg)
![[포토] 아크 지빈, 댄스 타임~](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7/16/isp20250716000483.400x280.0.jpg)
![[포토] 아크 최한, 무대 장인](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7/16/isp20250716000479.400x280.0.jpg)
![[포토] 아크 끼엔, 사랑스러운 미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7/16/isp20250716000480.400x280.0.jpg)
![[포토] 아크 최한, 내가 부리더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7/16/isp20250716000481.400x280.0.jpg)
![[포토] 아크 현민, 끼 가득 미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7/16/isp20250716000475.400x280.0.jpg)
![[포토] 아크 앤디, 눈빛에 심쿵](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7/16/isp20250716000478.400x280.0.jpg)
![[포토] 아크 리오토, 왕자님 눈빛](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7/16/isp20250716000477.4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