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휴민트’ 조인성·박정민, 기싸움 시작됐다
- [단독] “뭐라도 해야죠”…박나래, 막걸리 학원서 근황 첫 포착
- ‘어쩔수가없다’ 오스카 진출 불발…美 언론 “박찬욱 작품 또 냉대”
- ‘맥심 출신’ BJ 박민영, 유튜버 송형주와 결혼…“인생 2막 시작” [전문]
- 국가대표 사령탑이 왜? 차상현 신임 감독은 왜 아마추어 현장 방문을 계획하나 [IS 포커스]
- 숫자로 고백했던 아련한 삐삐 감성, KT 온마루가 품은 140년 통신 헤리티지
- 방탄소년단 월드투어 선예매 전석 매진…美 공연 2회 추가 [공식]
- ‘43억 횡령’ 황정음, 13년만 1인 기획사 등록…활동 복귀할까
- '헌신좌' 영입하고 다년계약까지 맺은 차 단장 "고생했으니까, 누구나 열심히 하면..."
- '주급 7억 원' 맨유 MF 카세미루, 올여름 동행 마침표 [공식발표]
야구
[야구로읽다]월급쟁이 사장, 테오 엡스타인
등록2017.03.22 06:00

5년에 5000만 달러를 받는 야구인이 있다. 선수가 아닌 사장이다.
프로야구 역사상 가장 많은 보수를 받는 전문경영인은 86년 된 ‘밤비노의 저주’와 108년 간 이어진 ‘염소의 저주’를 퇴마하며 보스턴 레드삭스와 시카고 컵스를 우승으로 이끈 테오 엡스타인이다.
보스턴과 시카고 팬들을 ‘희망고문’으로부터 구해준 엡스타인의 신화는 21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1년 오클랜드 어슬레틱스의 빌리 빈이 보스턴 단장직을 거절하자, 엡스타인은 스물아홉이라는 젊은 나이에 2002 년 말 레드삭스 단장에 취임할 수 있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의 엡스타인은 빈이 만들었다고도 할 수 있다.
2002년 레드삭스는 양키스의 독주를 위협하던 자타공인 강팀이었다. 레드삭스는 엡스타인이 이끌기 시작한 2003년에 플레이오프에 진출했고, 그 다음 해에는 월드시리즈까지 제패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엡스타인을 행운아로 치부하지만, 그의 성공사 내막을 들여다보면 운이 아닌 실력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엡스타인은 중장기적인 전력을 위해 마이너리그 팜(Farm) 선수 육성에 지속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단기적 목표인 우승을 위해 과감한 영입을 추진했다. 필라델피아 필리스에서 경질된 후 4년 간 감독직을 맡지 못했지만 ‘과학 야구’에 열린 생각을 가진 도전적인 테리 프랑코나를 2004년에 고용한 것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덕분에 레드삭스는 2007년에도 우승할 수 있었고, 엡스타인이 보스턴을 떠난 후에 일궈낸 2013년 우승에서도 엡스타인이 직접 육성한 선수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냈다.

엡스타인이 보스턴에서 감행했던 수 많은 결정 중 가장 인상적인 결단은 2004년 시즌 여름에 나왔다. 보스턴의 현역 레전드 노마 가르시아파라를 컵스의 올란도 카브레라와 바꾼 트레이드였다. 올스타에 다섯 번이나 선정된 보스턴 스타 유격수를 ‘듣보잡’ 선수로 대체한다는 소식에 팬들과 언론은 격분하며 엡스타인을 비난했다.
그러나 엡스타인의 판단은 합리적이었다. 냉정하게 봤을 때, 왕년에 타격왕을 두 차례 수상한 가르시아파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유격수 수비의 안정을 위해서도 잦은 부상으로 불안한 가르시아파라보다는 무난하지만 건강한 카브레라가 필요했다. 엡스타인은 과거 성공사례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와 현실에 충실하는 원칙을 지킬 줄 아는 경영자였다.
엡스타인이 물려 받은 컵스는 레드삭스와는 완전히 다른 ‘상태’의 팀이었다. 2004년 레드삭스가 노장과 스타가 즐비한 베테랑 팀이었다면, 2011년 정규시즌에서 91패를 한 컵스는 싹수가 없는 오합지졸 루저였다. 엡스타인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컵스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팬들의 인내심을 구했다. 그가 사장으로 이끈 첫 시즌 2012년에는 101패, 2013년에는 96패, 2014년에는 89패를 기록하다가, 2015년에야 비로소 컵스는 와일드카드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었다.
그러다 자신의 5년 계약이 만료되는 2016년시즌에 103승을 거둔 컵스가 월드시리즈 챔피언이 되며 엡스타인의 공약을 극적으로 완성시켰다. 2011년 컵스는 말 그대로 ‘다시 만들어야’ 하는 팀이었다. 그래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이어진 민망한 성적은 컵스에게 유리한 드래프트 순위를 가져다 줬다. 아무리 망가져도 중심을 잡으면 기회는 다시 오는 법이다. 엡스타인은 아주 젊은 선수들로 공격진을 형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하비에르 바에스, 크리스 브라이언트, 카일 슈와버, 애디슨 러셀, 호르헤 솔러와 같은 선수들이 그런 결과물이다. 타격이 어느 정도 전력을 갖추자, 엡스타인은 존 레스터, 존 래키와 같은 노장 투수들을 계약했다. 세이버메트릭스로 분석 파악하기 가장 어렵고, 부상에 따른 부침이 커 위험요소가 많은 투수진에 가장 늦게 투자한 전술이 흥미롭다.
이 모든 과정에서 엡스타인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며 직원들을 설득했다. 세이버메트리션, 스카우트, 비디오 분석관, 트레이너까지 모두 엡스타인의 비전에 맞춰 적합한 선수들을 영입하고, 또 영입한 선수들을 엡스타인이 그리는 ‘미래’에 맞게 차근차근 다듬어 갔다. 재건과 대개조는 그렇게 ‘한 방’이 아닌 ‘한 걸음’씩 이뤄졌다.
2016년 컵스 팀 총합 WAR(대체선수대비승리기여)의 43%는 컵스에서 데뷔한 선수들이었고, 이들 중 다수는 엡스타인이 발탁한 선수였다. 엡스타인은 레드삭스를 이끌었을 때와 같이 컵스의 상황과 전략에 알맞는 선수들을 직접 키워냈다.
아이비리그 출신 야구 경영자 1세대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엡스타인은 2004년 레드삭스를 초창기 세이버매트릭스 모델에 의존해 운영했다. 타석에서는 인내와 화력을
강조했고, 삼진을 많이 잡는 파워 피처들을 선호했다. 그러나 2016년 컵스의 승리방정식은 달랐다. 요즘 시류에 맞춰 바에스 같은 역동적인 프리-스윙어의 장점을 살리면서 총체적인 수비력에 비중을 두는 야구를 추구했다.
따져보면 2004년 레드삭스와 2016년 컵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수비력이다. 두 팀의 단순 기록은 물론이고 세이버메트릭스로 해당 시즌들의 변수들을 조정 감안해 비교 분석하면 2016년 컵스가 수비에서 훨씬 월등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04년 레드삭스와 2016년 컵스의 각기 다른 우승 비결은 두 시대 상황의 차이와 세이버매트릭스의 진화를 잘 보여준다.
그러면 메이저리그 저주 전문 퇴마사 엡스타인의 비법은 과연 무엇일까? 엡스타인은 빌리 빈처럼 혁신적인 인물이 아니다. 오히려 유능한 관리자에 가깝다. ‘지속 가능한 성공 토대’를 만든다는 큰 전략 안에서 때에 따라 전술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하는 엡스타인은 '문제 해결사'이다.

엡스타인 비법은 한 마디로 ‘인간경영’이다. 그는 선수가 아닌 사람을 찾는다. 때로는 개개인의 기록보다 기질을 더 중시한다. 엡스타인은 팀의 방향성이나 시너지를 저해하는 선수는 과감하게 내보낸다. 그래서 엡스타인은 세이버매트릭스와 현실 야구의 균형을 잃지 않는 경영인으로 존경 받는다(2004 년 레드삭스 우승의 시발점은 ALCS 4 차전 9회말에 이뤄진 데이브 로버츠의 도루였다. 당시 세이버매트릭스가 그리도 평가절하한 도루!).
얼마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1라운드에서 탈락한 한국 국가대표팀을 두고 말들이 많다. KBO의 경쟁력에 대해 잎, 나무, 숲을 보는 관점에서 제기된 일리있는 지적들이다. 거기에 한 가지 더하고 싶다. 바로 한국 프로야구에서 입지가 좁은 사장과 단장이라는 전문경영직에 대한 고민이다.
전문경영인들은 단순히 구단주와 선수들 간 조율자가 아니다. 아는 척하며 간섭하는 오너의 비위나 맞추는 예스맨은 더더욱 아니다. 구단의 방향과 정책을 제시하며 집행하고, 팀을 관리하며 이끌어가는 지도자다. 21세기 프로야구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전문경영인이 성패를 좌우한다. 예전보다는 나아졌지만 한국은 여전히 전문경영인이 우대 받는 토양이 아니다. 아니 전문경영에 대한 개념과 인식조차 부족한 사회다.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전문경영인’ 대통령까지 파렴치한 오너처럼 굴다가 파면되지 않았나.
조만간 '구단 대한민국'의 구단주인 유권자들은 새로운 사장, 또는 단장을 선정해야 한다. 엡스타인처럼 망가진 팀을 재건하고 시대 흐름에 맞춰 ‘지속 가능한 성공 토대’를 만들어내는 유능한 전문경영인이 나올 수 있을까? 또 하나의 ‘희망고문’이 되지 않기 바란다.
정승구
영화감독·작가. 시카고 대학에서 경제학을, 하버드 대학에서 정책학을 공부했다
[야구로읽다]메이저리그의 '저주', 비리에서 잉태됐다
[야구로읽다]대세론 따위 개도 안 먹는다
[야구로읽다]'괴물투수'는 사회가 만들어낸다
[야구로읽다]바트만을 용서한다고?
당신이 좋아할 만한정보
AD
당신이 좋아할 만한뉴스
지금 뜨고 있는뉴스
행사&비즈니스
많이 본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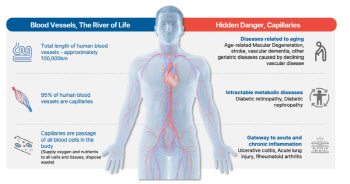
![뉴욕증시 강세 마감…머스크 “내년 휴머노이드 시중 판매”[뉴스새벽배송]](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1/PS26012300274T.jpg)










![[포토] 에이엠피 김신, 뽀뽀 쪽](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1/isp20260121000206.400x280.0.jpg)
![[포토] 에이엠피 '최장신' 김신](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1/isp20260121000207.400x280.0.jpg)
![[포토] 에이엠피 김신, 시크한 볼하트](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1/isp20260121000208.400x280.0.jpg)
![[포토] 에이엠피 크루, 푸처핸섭](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1/isp20260121000205.400x280.0.jpg)
![[포토] 에이엠피 크루, 사랑스러운 하트](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1/isp20260121000203.400x280.0.jpg)
![[포토] 에이엠피 크루, 멋진 볼하트](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1/isp20260121000209.400x280.0.jpg)
![[포토] 에이엠피 하유준, '패스' 무대 기대해 주세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1/isp20260121000204.400x280.0.jpg)
![[포토] 에이엠피 하유준, 귀엽게 브이](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1/isp20260121000202.400x280.0.jpg)
![[포토] 에이엠피 하유준, 금발로 변신](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1/isp20260121000201.400x280.0.jpg)
![[포토] 에이엠피 주환, 카리스마 작렬](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1/isp20260121000200.400x280.0.jpg)
![[포토] 에이엠피 주환, 눈빛으로 압도하는 분위기](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1/isp20260121000210.400x280.0.jpg)
![[포토] 에이엠피 주환, '패스' 피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1/isp20260121000199.4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