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TVis] “식장은 나지”…안재현, 넓어진 어깨만큼 커진 자신감 (‘나 혼자 산다’)
- [TVis] 김양 “10년 전 산 빌라 재개발…집값 5배 상승” 함박웃음 (‘편스토랑’)
- ‘2연승’ 수원대, 조 1위 16강 진출…경희대·용인대도 연승 행진
- 마이큐♥김나영, 홍콩 달군 패피 가족 [IS하이컷]
- 박철민 “故안성기 사모님 부탁으로 운구…울컥” (배우 안성기)
- [TVis] 윤보미, 결혼 축하에 쑥스러운 미소 “에이핑크 2년만에 컴백” (‘편스토랑’)
- 쯔양, 박명수 미담 공개 “힘들 때 전화해줘, 너무 감동” (‘할명수’)
- 정동원 입대 전 마지막 팬콘서트 5분만에 전석 매진
- “귀한 분이 가셨다”…고현정, 故 안성기 추모
- 블랙핑크 로제, 美 아이하트라디오 어워즈 8개 부문 노미네이트
축구
K리그에 쌓인 높은 불신의 벽, 'VAR'이 깬다
등록2017.06.20 06:00

K리그에 만연해 있는 '불신의 벽'을 깰 수 있는 무기가 온다. 바로 비디오판독시스템(VAR·Video Assistant Referee)이다.
VAR은 말 그대로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장면을 비디오 판독을 통해 공정한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6월 초 끝난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에서 시행돼 한국 축구팬들에게도 어느 정도 익숙한 제도다.
올 시즌 초반 K리그에는 승부에 영향을 미치는 오심이 연이어 나왔다. 피해를 당한 팀들은 격분했고, 구단 단장들이 직접 나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K리그 심판 자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컸다. K리그에 대한 팬들의 신뢰가 깨지는 것은 당연했다. '의도성'이 있을 수 있다는 불신의 눈으로 K리그를 바라봤다. 흥행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모든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VAR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축구연맹)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움직였다.
축구연맹은 19일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VAR 미디어 설명회'를 열고 앞으로의 계획과 VAR 적용 상황, 판독 과정 등을 설명했다.

축구연맹은 파국의 상황을 막기 위해 VAR 카드를 예정보다 일찍 꺼내 들었다. 당초 2018시즌 초에 시작하려고 했던 VAR을 앞당겨 다음달 1일 열리는 K리그 클래식(1부리그) 18라운드부터 시행한다. 이를 위해 축구연맹은 경기장에 카메라 12대를 배치하고, VAR을 통해 판정할 '영상판독실(VOR·Video Operation Room)' 차량 3대도 도입했다. VAR 운영에는 K리그 주심 23명과 K리그 출신 은퇴 심판 3명이 합류해 팀을 이룬다.
유병섭 대한축구협회(KFA) 전임강사는 "경기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상황에서 명백한 오심을 없애기 위해 VAR을 시도한다"며 "최종 결정은 주심이 내린다. VAR은 최소한의 개입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VAR은 '골 상황·페널티킥 상황·레드카드 상황·징계조치 오류 상황' 등 네 가지 상황에서만 작동된다. 또 주심이 영상판독을 할 때 구단 관계자와 선수들이 개입할 수 없게 했다. 구단과 선수들이 VAR 판독을 요청할 수도 없다. 그렇게 한다면 선수는 경고, 구단 관계자는 퇴장을 당한다. 심판의 권위를 지키면서 VAR 판독 난무로 인한 경기 지연을 막기 위함이다. 이는 국제축구평의회(IFAB) 규정이다. 축구연맹 자의적으로 바꿀 수 없다.
시험 운행은 마쳤다. 축구연맹은 총 32경기에서 VAR 오프라인 테스트를 진행했다. 이 중 16차례 오심이 발견됐고, 평균 판독 시간은 20초였다. 승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정을 100% 바로잡았다.
축구연맹은 "VAR로 판정에 대한 항의를 줄이고 신뢰성을 확보해 존중과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선수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K리그가 공정한 리그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최용재 기자
당신이 좋아할 만한정보
AD
당신이 좋아할 만한뉴스
지금 뜨고 있는뉴스
행사&비즈니스
많이 본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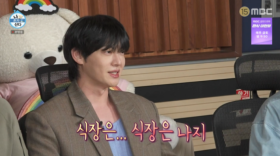













![[포토] 아이브 장원영, 안 보이게 꽁꽁 싸매고 골든디스크 행](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09/isp20260109000088.400x280.0.jpg)
![[포토] 아이브 레이, 콩순이 손인사](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09/isp20260109000087.400x280.0.jpg)
![[포토] 아이브 장원영, 꽁꽁 싸매도 장원영](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09/isp20260109000086.400x280.0.jpg)
![[포토] 아이브 안유진, 추워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09/isp20260109000084.400x280.0.jpg)
![[포토] 아이브 리즈, 치명적인 눈빛으로 '메롱'](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09/isp20260109000085.400x280.0.jpg)
![[포토] 아이브, 골든디스크 잘 다녀오겠습니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09/isp20260109000083.400x280.0.jpg)
![[포토] 아이브 리즈, 눈 효과 '예쁜 눈빛'](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09/isp20260109000078.400x280.0.jpg)
![[포토] 아이브 레이, 지켜주고 싶은 분위기](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09/isp20260109000079.400x280.0.jpg)
![[포토] 아이브 리즈, 사랑스러운 손인사](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09/isp20260109000076.400x280.0.jpg)
![[포토] 아이브 이서, 핑크 공주](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09/isp20260109000081.400x280.0.jpg)
![[포토] 아이브 레이, 여리여리 여신 분위기](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09/isp20260109000080.400x280.0.jpg)
![[포토] 아이브 안유진, 마스크 속 앳된 얼굴](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09/isp20260109000077.4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