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다니엘-문유현-강지훈 발탁, 허웅 탈락...마줄스 농구대표팀 감독, 국가대표 파격 명단 발표
- ‘대한항공 AI 챗봇’ 출시… 생성형 AI로 고객 맞춤형 상담
- 현대차·기아, 1월 美 판매 역대 최대 기록… ‘하이브리드’가 견인
- 전체 1순위 신인 박준현, 캠프 4번째 불펜 피칭...다르빗슈와 흡사한 투구 메커니즘 [IS 가오슝]
- 유연석, 神들린 변호사 출격…‘신이랑 법률사무소’ 3월 13일 첫방 [공식]
- [포토] 신세경, 물 먹는 모습도 아름다워
- 츄, AI야 사람이야... 금발+컬러렌즈 조합 美쳤다 [AI 포토컷]
- “할많하말” 심경 밝힌 김소향, 옥주현과 ‘눈만 빼꼼’ 투샷 포착 [왓IS]
- 츄, 후배 키키 향한 애정... AI 연상케 하는 비주얼은 덤 [IS하이컷]
- [포토] 박정민, '조인성 형은 바라만 봐도 좋아요'
메이저리그
[송재우의 포커스 MLB] KC, 위기 때 빛나는 운영
등록2020.06.26 06:00
수정
2023.09.20 16:11

올 시즌 메이저리그 개막이 연기된 지 거의 3개월이 다 됐다. 사무국과 구단주, 선수 노조는 여전히 불협화음을 내며 시즌 개막 날짜는 고사하고 개막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사무국과 선수노조 양측이 주고받은 제안은 서로에 의해 거부되고 카운트 오퍼도 통하지 않았다. 결국 리그가 처음 멈췄을 때 당시 합의됐던 커미셔너의 결정에 따라 리그 재개가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상황도 만만치 않다. 각 팀은 나름대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 중이다. 수입이 크게 줄어든 것을 고려해 고용인들을 내보내는 등 허리띠를 졸라맸다. 이런 상황에서 주목받는 팀이 있다. 모두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꿋꿋하게 주관을 갖고 팀을 운영하는 캔자스시티 로열즈다.
1969년부터 리그에 참여한 캔자스시티는 2번의 월드시리즈 우승, 4번의 리그 우승, 9번의 플레이오프 진출을 이뤄냈다. 2015년에는 막강 불펜을 앞세워 뉴욕 메츠를 월드시리즈에서 꺾고 왕좌의 자리에 오르기도 했다. 나름 성공한 팀으로 꼽을 수 있지만, 메이저리그 구단 중 전형적인 스몰마켓이다. 흔히 말하는 '명문팀'에 속하지 않는다.
제한적 재정 한계로 FA(프리에이전트) 시장이나 팀 연봉 순위에서 매년 하위권을 맴돈다. 지난 4월 경제지 포춘이 선정한 메이저리그 팀 가치에서 10억2500만 달러(1조2300억원)를 평가받아 30개 팀 중 29위에 그쳤다. 뒤늦게 리그에 합류한 탬파베이·콜로라도·애리조나·시애틀·워싱턴보다 팀 가치가 떨어졌다.
하지만 캔자스시티의 최근 행보는 다른 팀과 차별화되며 귀감이 되고 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여러 팀이 지출을 줄이기 위해 마이너리그 선수들을 방출하고 있지만, 캔자스시티는 단 한 명도 내치지 않을 계획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시즌 개막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생활이 어려울 수 있는 마이너리그 선수 전원에게 올해 연봉을 지불하기로 했다. 또 마이너리그 구단에서 '강제' 휴직 중인 구단 직원 누구도 내보내지 않기로 해 실업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왔다. 만약 시즌이 재개된다면 감봉당한 직원들은 감봉당한 액수만큼 되돌려줄 것을 공식화했다. 캔자스시티의 결정은 훨씬 큰 시장과 재정 규모를 갖춘 팀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구단 직원들의 팀 충성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동시에 스몰마켓 팀에게 중요한 유망주 확보도 게으르게 하지 않았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매년 40라운드까지 진행되던 신인 드래프트가 5라운드까지 '축소' 진행됐다. 1300~1400명의 선수가 지명되던 게 160명으로 확 줄었다. 그러면서 드래프트에서 지명되지 않은 선수를 최대 2만 달러의 계약금을 주고 영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열렸다. 캔자스시티는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잘 이용했다. 1라운드 전체 4번에 지명한 유망주 투수 아사 레이시와 빠르게 계약한 뒤 선수 수급에 집중했다.
저예산 팀의 기지를 십분 발휘해 베이스볼 아메리카가 선정한 아마추어 유망주 500인 가운데 드래프트에 호명되지 않은 12명을 영입했다. 이들 중 4명은 상위 5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블루칩이라는 평가다. 드래프트에서 미지명된 선수는 어느 팀과 계약할 수 있다는 조항을 최대한 활용한 것이다. 모든 팀이 비(非) 드래프트 선수 대상 자유 영입 경쟁을 펼치면 아무래도 이름값 높은 명문 팀들이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캔자스시티가 '싹쓸이'에 성공한 걸 보면 코로나19 사태에서 보인 구단의 행보가 큰 공감을 얻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프로야구는 비즈니스이다. 어느 정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차별화가 필요하다. 캔자스시티는 시장 규모나 명성에서 뒤처질 수 있지만 젊은 선수들의 마음을 샀다. 이런 상황이 늘 벌어지진 않겠지만, 미래를 내다본 그들의 위기 속 경영 스타일은 시사하는 바가 있어 보인다.
송재우 MBC SPORTS+ 해설위원
정리=배중현 기자
당신이 좋아할 만한정보
AD
당신이 좋아할 만한뉴스
지금 뜨고 있는뉴스
행사&비즈니스
많이 본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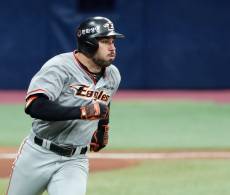

















![[포토] 신세경, 물 먹는 모습도 아름다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4/isp20260204000318.400x280.0.jpg)
![[포토] 박정민, '조인성 형은 바라만 봐도 좋아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4/isp20260204000311.400x280.0.jpg)
![[포토] 조인성, ''박정민-신세경' 로맨스...애절하게 잘 나온 것 같아'](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4/isp20260204000309.400x280.0.jpg)
![[포토] 신세경, 여신 강림](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4/isp20260204000307.400x280.0.jpg)
![[포토] 신세경, 아름다운 여신](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4/isp20260204000308.400x280.0.jpg)
![[포토] 류승완, '신세경...예쁘게 찍힌 게 아니라 원래 예뻐'](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4/isp20260204000299.400x280.0.jpg)
![[포토] '휴민트' 기자간담회, 진지한 분위기](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4/isp20260204000295.400x280.0.jpg)
![[포토] 인사말 하는 박해준](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4/isp20260204000293.400x280.0.jpg)
![[포토] 인사말 하는 조인성](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4/isp20260204000291.400x280.0.jpg)
![[포토] 인사말 하는 박정민](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4/isp20260204000292.400x280.0.jpg)
![[포토] 인사말 하는 신세경](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4/isp20260204000289.400x280.0.jpg)
![[포토] 인사말 하는 류승완 감독](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4/isp20260204000290.4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