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사보니스+라빈 동반 시즌 아웃' 14연패 승률 0.214 SAC, 꼴찌 향한 마지막 승부수?
- 심은경, 데뷔 첫 연극 무대 선다…‘반야 아재’ 출연
- 3만7883구 던진 김광현의 어깨 통증, 2026시즌 개막 엔트리 사실상 무산 분위기 [IS 이슈]
- ‘쇼미12’ 오늘(19일) 송캠프 마지막... ‘야차의 세계’ 부활 3人도 등장
- ‘수호신 왔다’ 아쉬웠던 2실점에도 희망 본 GK 구성윤의 선방쇼
- 임성한이 온다…첫 메디컬 스릴러 ‘닥터신’ 3월 14일 공개 [공식]
- 전현무, ‘두쫀쿠 만들기 도전’…충격의 난장판 현장 (나혼산)
- 지드래곤, 두바이 헤드라이너 출격…중동 첫 공식 무대로 월드클래스 영향력 확장
- 배인혁, 결국 고백했다... 노정의 향한 “좋아해” 엔딩 (우주를 줄게)
- ‘김준호♥’ 김지민, 얼굴 부상에…“오히려 좋아” 쇄도, 왜? [IS하이컷]
무비위크
[인터뷰④] 오달수 "'이웃사촌' 개봉 믿기지 않아…욕보일까 걱정"
등록2020.11.19 11:23

오달수가 '이웃사촌' 개봉에 대한 심경을 전했다.
영화 '이웃사촌(이환경 감독)'을 통해 공식 복귀하는 오달수는 19일 서울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장고 끝 '이웃사촌' 개봉이 결정됐을 때 마음이 어땠냐"는 질문에 "믿기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
'이웃사촌'은 오달수가 사생활 이슈에 휩싸였을 당시 막바지 촬영을 진행 중이었던 작품. '천만 요정'으로 호감도의 정점을 찍었을 시기였던 만큼, 캐릭터의 존재감도 막강하다. 오달수는 극중 자택에 강제 연금된 차기 대선 주자로 분해 민주주의를 꽃피우려는 의로운 인물로 열연했다.
오달수는 "사실 촬영할 때도 뉴스에서는 떠들석 난리가 났고 '어디 숨어있냐. 대책회의 하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다"며 "당시 '이웃사촌' 막바지 촬영을 진행 중이었고, 보조 출연자만 약 200~300명 씩 투입되는 유세 장면 등 큰 덩어리를 해결해야 했던 시점이었다. 그래서 (미투 내용은) 전혀 신경을 못 썼다"고 솔직하게 고백했다.
이어 "감독님께서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나도 솔직히 초반에는 대책을 마련한다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 촬영만 생각했고, 끝나고 서울에 올라 오니 여론이나 회사, 사회적 분위기 등 전반적인 분위기가 장난 아니게 흘러가 있더라. 그제서야 체감을 했다. 이전에는 중요한 장면들 때문에 다른 것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완성된 영화를 볼 때 느낌은 어땠냐"고 묻자 오달수는 "시사회 때 처음 봤다. 편집이 굉장히 잘 됐고, '기대 이상'이라고 표현해 드리고 싶다. 진심으로 나 빼고는 다 좋더라"며 살짝 미소짓더니 "나는 내가 봐도 낯설더라. 개인 문제를 떠나 기사에도 많이 나던데 이전까지 감초 역, 주변부 인물의 삶을 주로 연기하다가 갑자기 야당 총재로 나선 것 자체가 낯설 수 밖에 없다. 그렇게 흡족한 모습은 아니었다"고 귀띔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는 실존 인물이 연상될 수 밖에 없다"는 말에는 "첫 대본은 아예 전라도 사투리로 나왔다. 감독님과 의논을 하면서 그 설정은 제외했다.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특정 인물을 콕 집을 수 밖에 없겠더라. 우리 영화가 정치 영화도 아니고 휴먼 드라마인데, 그럴 필요가 있을가 싶기도 했다. 연기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됐을 것이다. 자칫하면 그 분을 더 욕되게 할 수도 있고.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기억이 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8년 두 명의 여성에게 미투(성추행) 고발을 당했던 오달수는 자숙과 칩거 후 '이웃사촌' 개봉과 함께 약 3년만에 대중 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해 초 오달수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내사 종결 처리했다.
'이웃사촌'은 좌천 위기의 도청팀이 자택 격리된 정치인 가족의 옆집으로 위장 이사를 오게 돼 낮이고 밤이고 감시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1280만 관객을 울리고 웃긴 '7번방의 선물'(2017) 이환경 감독과 제작진이 7년만에 재회해서 선보이는 영화로 주목받고 있다. 25일 개봉한다.
>>[인터뷰⑤] 에서 계속
조연경 기자 cho.yeongyeong@jtbc.co.kr
사진=씨제스엔터테인먼트
당신이 좋아할 만한정보
AD
당신이 좋아할 만한뉴스
지금 뜨고 있는뉴스
행사&비즈니스
많이 본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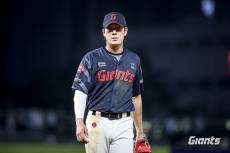




![설 연휴 끝나자 '20%대' 폭등…증권주 '불기둥'[특징주]](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1900455T.jpg)
![삼성전자, 사상 첫 19만원 돌파…SK하이닉스, 90만원선 회복[특징주]](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1900445T.jpg)








![[포토] 티파니 영, 미소에 홀릭](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35.400x280.0.jpg)
![[포토] 티파니 영-이찬원, 한터뮤직어워즈 MC 맡았어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37.400x280.0.jpg)
![[포토] 티파니 영, 우아함 종결자](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34.400x280.0.jpg)
![[포토] 티파니 영, 아름다운 드레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32.400x280.0.jpg)
![[포토] 티파니 영, 사뿐사뿐](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36.400x280.0.jpg)
![[포토] 티파니 영, 공주님 들어가십니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33.400x280.0.jpg)
![[포토] 이찬원, 팬분들 사랑해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30.400x280.0.jpg)
![[포토] 이찬원, 멋진 슈트핏](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31.400x280.0.jpg)
![[포토] 이찬원, 여유로운 MC의 입장](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29.400x280.0.jpg)
![[포토] 윤종신, 18년 만에 내는 정규앨범 기대해 주세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27.400x280.0.jpg)
![[포토] 윤종신, 인자한 손인사](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28.400x280.0.jpg)
![[포토] 이창섭, 감기투혼 포즈](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25.4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