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코요태, 3월 7일 베트남 단독 공연 개최
- SM, 에스파·NCT 위시 등 소속가수 악플러 아이디 박제 초강수 [전문]
- 6위 KT 비상…‘헐크’ 하윤기, 오른 발목 수술로 장기 이탈
- 사나, 멍뭉미에도 가려지지 않는 완벽 핏 [IS하이컷]
- “지미답게 농담했다” GSW 버틀러, 무릎 부상으로 이탈…쿠밍가 출전 가능성↑
- 사나, 다이어트 욕구 자극하는 완벽한 핏 [AI 포토컷]
- 시티 프로토콜, AI 숏폼 플랫폼 'Viral City 2.0' 공식 출시
- 송혜교, 거울 셀카도 ‘A컷’ 만드는 미모 [AI 포토컷]
- [IS하이컷] 신세경, 일상 속 빛나는 독보적 비주얼
- 송혜교, 긴 머리 그리웠나…“머리 언제 기르지” 셀카 모음 공개 [IS하이컷]
연예일반
[IS시선] 영화기자는 아무나 못 되는 건 줄 알았다
정진영 기자
등록2023.03.26 15:42

기자에게 출입처란 자신의 전문 분야다. 중학교 때부터 가끔씩 방과 후 수업을 빼고 영화관에 갈 만큼 영화를 좋아했기에 언젠가 영화 기자가 되고 싶단 마음이 있었지만, 틈만 나면 탈색을 하는 ‘양’스러운 외모는 딱 봐도 기준 미달 같았다.
최근 영화 ‘웅남이’에 대한 한 평론가의 평가가 대중의 도마 위에 올랐다. ‘여기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을까’라는 것이다. ‘웅남이’는 코미디언 박성광의 상업영화 감독 데뷔작. 맥락상 ‘여기’는 ‘영화계’인 것으로 보인다. ‘거기’(코미디계)와 ‘여기’(영화계) 사이에 세운 노골적인 경계. 이 벽에 많은 누리꾼이 거부감을 드러냈다.

배우들 사이에서도 ‘드라마 출연 배우’와 ‘영화 출연 배우’는 다르게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다. 드라마는 소위 말해 ‘TV를 틀면 볼 수 있는’ 무료 콘텐츠(시청료, 케이블 및 OTT 가입 비용은 논외로 하자)고 영화는 ‘그 작품의 티켓을 사야만 볼 수 있는’ 유료 콘텐츠라는 인식 탓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영화를 주로 하는 배우들의 급이 드라마를 주로 하는 배우들보다 더 높은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말랑말랑한 로맨틱 코미디로 인기를 끈 남자 배우가 스크린에 진출하기 위해 무리한 연기 변신을 감행하는 이유엔 이런 인식도 없지 않다.
기자도, 배우도, 영화 담당은 남달라 보이는 매직. 코미디, 가요, 드라마, 영화가 모두 ‘대중문화’라는 카테고리 안에 묶여 있음에도, 왠지 그 안에서 등급을 나눈다면 가장 위엔 영화가 있을 것만 같은 느낌적인 느낌. 세계인이 사랑하는 K콘텐츠 ‘한류’의 시작이 드라마와 가요였음을 감안하면 아이러니한 일이다.
한국 영화계가 위기다. 지난해 11월 개봉했던 ‘올빼미’ 이후 단 한 편의 한국영화도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 했다. ‘아바타: 물의 길’ 같은 강력한 대작이 있었다는 변명도 궁색하다. 기대작이라 불렸던 한국 영화들도 연이어 물을 먹었기 때문이다.
티켓을 예매하고 집에서 나와 극장으로 가서, 상영 시간을 기다렸다가 들어가 가만히 2시간 가량을 같은 자리에 숨죽이며 앉았다가 나오는 일. 어쩌면 영화를 향한 길이 대중에겐 이제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건 아닐까.
어느덧 연차가 쌓이고 영화 담당이 돼 그렇게 가고 싶었던 영화 시사회장으로 일하러 간다. 개봉 전인 영화를 미리 보고 소감을 공유하는 일은 여전히 특별하고 기쁘지만, 사실 ‘새 영화’를 새 앨범, 새 공연과 치환하면 다른 출입처와 별반 다르지는 않다.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도 비슷하긴 마찬가지다. 다만 어떤 분야에 조금 더 애정을 갖고 있는가, 이 차이가 있을 뿐이다.
영화 담당 기자라고, 영화배우라고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니었다. 높이 쌓아올린 성벽과 높은 콧대를 내리고 대중과 눈높이를 맞추는 일. 어쩌면 그게 한국 영화계 위기를 타파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당신이 좋아할 만한정보
AD
당신이 좋아할 만한뉴스
지금 뜨고 있는뉴스
행사&비즈니스
많이 본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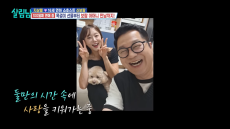






!['엘리트 코스' 옛말…軍 사관학교 합격선 최대 66점 '뚝'[only 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1/PS26012000938T.jpg)









![[포토] NCT 드림 지성, 으 추워라~~](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0/isp20260120000164.400x280.0.jpg)
![[포토] NCT 드림 지성, 귀여운 볼빵빵 손인사](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0/isp20260120000165.400x280.0.jpg)
![[포토] NCT 드림 지성, 남친룩의 정석](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0/isp20260120000166.400x280.0.jpg)
![[포토] NCT 드림 지성, '밥 먹었어?'](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0/isp20260120000163.400x280.0.jpg)
![[포토] NCT 드림 지성, 귀여운 곰돌이 인형 가방에 달고](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0/isp20260120000162.400x280.0.jpg)
![[포토] 스트레이 키즈 현진, 얼굴로 심장 공격](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0/isp20260120000155.400x280.0.jpg)
![[포토] 스트레이 키즈 현진, 데님 패션이 찰떡이야](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0/isp20260120000157.400x280.0.jpg)
![[포토] 스트레이 키즈 현진, 냉동고 추위 대한에도 패션 포기 못해](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0/isp20260120000158.400x280.0.jpg)
![[포토] 스트레이 키즈 현진, 섹시한 남자](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0/isp20260120000154.400x280.0.jpg)
![[포토] 스트레이 키즈 현진, 영화 속 한 장면](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0/isp20260120000156.400x280.0.jpg)
![[포토] 에이티즈 성화, 잘생겨서 줌인](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0/isp20260120000153.400x280.0.jpg)
![[포토] 에이티즈 성화, 귀여운 토끼 귀 포즈](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0/isp20260120000152.4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