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김형묵 교통사고 당해...”큰 부상 아냐, ‘사랑을 처방’ 촬영 소화 중” [공식]
- 은가은♥박현호, 오늘(20일) 딸 출산 [공식]
-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재선임 의결…2028년까지 6년 임기
- 민선홍, 정이찬으로 활동명 변경…임성한 작가 ‘닥터신’ 주연
- "두 번 더 나가고 싶다"했는데, 첫 메달 감동 PSG가 사라진다고? [2026 밀라노]
- 국대 AI 프로젝트에 모티프 추가 선정
- "와!" 손·메대전 열린다…메시, 햄스트링 부상→훈련 복귀해 출전 가능!
- ‘우주를 줄게’ 박서함, 훈훈 비주얼+다정한 매력까지
- 故 김철홍 소방교 유족, ‘운명전쟁49’ 중단 요구…“숭고한 희생 유희 전락”
- 유재석에 관심 갈구 박명수…젠슨 황 차림으로 시선 강탈 (놀면 뭐하니?)
연예일반
[IS인터뷰] ‘사랑의 고고학’ 옥자연 “죽을 때 후회없는 삶 살고파”
정진영 기자
등록2023.04.11 06:30
수정
2023.09.20 17:51

영화 ‘사랑의 고고학’ 개봉을 앞둔 옥자연을 최근 서울 동작구의 한 영화관에서 만났다. ‘경이로운 소문’부터 ‘슈룹’에 이르기까지 연이은 드라마 성공을 경험하고 있는 그는 ‘사랑의 고고학’으로 오랜만에 스크린 주연으로까지 나서게 됐다. 옥자연은 “운이 좋았다. 불러주신 분들께 감사할 따름”이라며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
“좋은 콜을 받았던 거죠. 제가, 대본이 쏟아져 들어오는 배우라서 여러 작품 가운데 뭘 고른 것도 아니거든요. 들어오는 작품들은 웬만하면 감사한 마음으로 다 임했어요. 계속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에 대한 가치관과 방향성은 달라지게 마련이다. 10대 시절 고등학생 특유의 정의감에 빠졌던 옥자연은 대학생이 된 이후엔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때까지 삶을 돌이켜 보니 그동안 발만 담그듯 해온 일이 많았다. 밴드도 했고 연극도 했고 그림도 그렸다. 그런 활동들 가운데 뭐가 제일 재미있었을까 고민하니 답이 나왔다.
“그 전까지 배우가 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냥 영화 보고 연극 보는 거 좋아하는 학생이었거든요. 아마 제가 영화만 보는 아이였다면 배우가 못 됐을 수도 있어요. 화면에 나오는 건 특별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연극은 다르잖아요. 눈 앞에서 사람이 움직이고, 연기를 하는 걸 보니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옥자연은 아주 느릿하게, 서두르는 기색 없이 말을 이어나갔다. 그건 그의 커리어도 마찬가지다. “반대는 없었지만 우려와 걱정은 있었다”는 부모님의 응원도, “여전히 배우라는 직업으로 먹고 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는 옥자연의 생각도 미지근하긴 마찬가지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이런 미지근한 태도로 옥자연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일을 해나가는 것 같았다. 단기간에 스타가 돼야겠다거나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초조함이 그에게선 느껴지지 않았다.

이런 면은 일견 ‘사랑의 고고학’ 속 영실과 닮았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단 자신이 선택한 관계이기에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영실이 옥자연의 얼굴에서 보였다. 옥자연은 배우로서도 인간으로서도 의미 있는 일을 해나가기를 원할 뿐이다. 정의감에서 재미로, 다시 의미로. 인간 옥자연은 새로운 챕터에 서 있다.
“의미 있는 게 무엇일지를 고민하는 요즘이에요.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하고요. 인간은 어쨌거나 유한한 존재고 삶은 생각보다 길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고 기왕 인간으로 태어났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아직은 막연하지만,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언젠가 좋은 기회를 만나 세상에 나올 일이 있겠죠.”
배우로서 목표도 비슷하다. 배우로 살며 어느 순간부터는 의미를 생각해보기 시작했다.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힘, 혹은 위로를 줄 수 있는 작품을 해나가고 싶다. 시청자나 관객으로서 옥자연이 따스한 작품을 좋아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배우로서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저한테 달린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제가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계속 열심히 해나갈 뿐이죠. 그리고 스스로 자신이 있고 만족할 수 있는 작품을 다섯 작품은 하고 싶어요. 그러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죽을 때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다는 옥자연. 이런 그의 진중함이 묻어 있는 ‘사랑의 고고학’은 12일 개봉한다.
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당신이 좋아할 만한정보
AD
당신이 좋아할 만한뉴스
지금 뜨고 있는뉴스
행사&비즈니스
많이 본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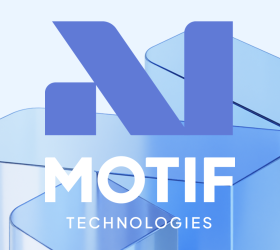












![[포토] 롱샷 루이, 장꾸 하트](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20/isp20260220000058.400x280.0.jpg)
![[포토] 롱샷 오율-률, 우리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20/isp20260220000056.400x280.0.jpg)
![[포토] 롱샷 우진, 바지 한껏 내리고](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20/isp20260220000057.400x280.0.jpg)
![[포토] 롱샷 오율, 훈훈하게 후광 발산](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20/isp20260220000052.400x280.0.jpg)
![[포토] 롱샷, 힙함 가득한 단체 샷](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20/isp20260220000053.400x280.0.jpg)
![[포토] 롱샷 루이-우진, 멋진 신호등 런웨이](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20/isp20260220000051.400x280.0.jpg)
![[포토] 롱샷 오율, 잘생긴 미모 뿜뿜](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20/isp20260220000049.400x280.0.jpg)
![[포토] 롱샷, 힘차게 화이팅](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20/isp20260220000055.400x280.0.jpg)
![[포토] 롱샷 루이, 카리스마 넘치는 포즈](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20/isp20260220000047.400x280.0.jpg)
![[포토] 롱샷, 아직은 공항이 어색해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20/isp20260220000048.400x280.0.jpg)
![[포토] 롱샷 우진, 멋진 분위기](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20/isp20260220000050.400x280.0.jpg)
![[포토] 롱샷, 힙한 분위기](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20/isp20260220000054.4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