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1위 8강 도전’ 이민성호, 강성진·김태원 선발 출격…우즈베키스탄전 베스트11 공개
- 브브걸 은지 “‘롤린’ 역주행에 운 다 쓴 듯” (‘귀묘한 이야기2’)
- 임시완 “프로 방문러 된 후 밥 먹자는 횟수 확실 줄어” (‘살롱드립’)
- 임시완 “사이코패스 연기, 일상에도 영향” (‘살롱드립’)
- 임시완 “음반 활동시 더블랙레이블-SM 매니저 두 명 다 나와” (‘살롱드립’)
- 어도어, 민희진 용산구 아파트 상대 5억 가압류…법원 인용 [왓IS]
- [IS하이컷] 남규리, 변치 않는 인형 비주얼…”겨울 내내”
- 올림픽 앞둔 스피드스케이팅 김민선·이나현, 동계체전서 2관왕
- LGU+, 대학생 앰배서더 '유쓰피릿' 17기 모집
- '다음은 체임벌린?' 2만8596점 오닐 넘어선 하든, NBA 역대 득점 9위 등극

30년 전 즈음이었습니다. 농민신문사에서 잡지를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고, 산나물에 대한 취재 계획을 세웠습니다. ‘산나물 백과와 요리’ 식의 기사는 피하고 싶었습니다.
강원도 지역의 민속자료를 뒤져서 화전민 가옥을 찾아내었습니다. 어찌어찌 전화 연결을 하였는데, 거기에 화전민 출신의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강원도 삼천시 하장면의 어느 골짝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1시간 정도 산을 올랐습니다. 숲길 주변으로 집이라곤 보이지 않았습니다. 봄꽃이 만개한 깊은 산 속에 따개비 같은 작은 집이 나타났습니다. 지붕은 겨릅대(대마의 속대)로 이었고 흙벽에 나무껍질을 대었습니다. 네모 모양의 집이었는데, 외양간이 집안에 있는 구조였습니다. 부엌 바로 옆이 외양간이었습니다. 노부부는 저희(저와 사진기자)를 무척 반겼습니다. 거기까지 올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지요.
노부부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방이 둘이어서 잠자리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저와 사진기자는 작은 방으로 건너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녀. 여기서 자” 하고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작은 방에서.” 할아버지가 다시 말했습니다. “여기서 나하고 자면 돼.” 할머니는 벌써 작은 방으로 몸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젊은이 여러분은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에 저 역시 금방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와 사진기자가 할아버지 옆에 이부자리를 펴고 누웠을 때에야 생각이 났습니다. 남.녀.유.별.
조선의 유교는 남자와 여자를 하나의 생활공간에서 살지 못하게 했습니다. 남자는 사랑채에서, 여자는 안채에서 살았습니다. 살림이 넉넉하지 않아 한 채의 집에서 살아도 사랑방과 안방의 구별은 있었습니다. 그 작은 겨릅대흙벽집이어도 남녀의 공간은 나뉘어야 한다고 노부부는 생각하였던 것이지요.

불을 넉넉하게 때 방바닥은 쩔쩔 끓었습니다. 방바닥이 약간 기울어서 혼란해진 균형감각 때문에 잠을 설치었고, 그 덕에 여러 상념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그때의 상념 조각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조선이 먼 과거가 아니다.”
다음날 아침밥을 먹고 할머니를 따라 산나물을 뜯으러 나섰습니다. 아니, 나섰다고 말하기는 애매합니다. 집 둘레가 온통 산나물이었습니다. 할머니 곁에 쪼그리고 앉아 할머니가 말하는 산나물의 이름을 하나하나 수첩에 적었습니다. “이건 곤드레, 이건 딱주기, 이건 미역취, 이건…” 우리 삶터 주변에 먹는 풀이 지천입니다. 산업화 이전, 그러니까 적어도 조선시대 우리 조상은 봄이 오면 자기 집 바로 옆에서 산나물을 뜯었을 것입니다.
광주리에 산나물이 금방 찼습니다. 이를 부엌에 가져와 솥에다 데치고 툴툴 털어 겨릅대자리 위에 널어서 말렸습니다. 말린 산나물은 노부부의 반식량입니다.
점심에 산나물죽을 해서 먹었습니다. 옥수수를 맷돌에 갈아 끓이다가 산나물을 넣고 된장을 풀었습니다. 맛있을 것 같지요? 여물 냄새가 나서 저는 두어 숟가락 먹고 말았습니다. 배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었습니다. 사진기자는 한 그릇을 다 비웠다가 할머니가 잘 먹는다고 또 한 그릇을 주어서 먹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 맛내는 것이 달랑 된장 하나였던 산나물죽이니 누구든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산나물을 뜯는 할머니 곁에 앉아 할머니의 인생을 들었습니다. 구슬픈 아라리도 들었습니다. 첩첩산중에서 이웃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어떨 때에는 행복하고 어떨 때에는 행복하지 않다고 할머니는 말했고, 30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제가 대도시 한복판에서 살아도 할머니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할머니 발치에 작은 풀꽃이 송송송 돋았습니다. 풀꽃을 꺾어 ‘산나물 척척박사’ 할머니께 보여드리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꽃 이름이 뭐예요?” 곁눈으로 슬쩍 보시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몰라.”
인간은 의미 없는 것에는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할머니에게 ‘먹는 풀’이 아닌 풀꽃은 의미가 없었던 것일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봄이면, 가을에 거둔 곡물을 겨우내 다 먹어 광이 비었을 때입니다. 풀꽃인들 예쁘게 보였겠는지요. 봄꽃이 여러분의 눈에 의미 있게 들어온 봄이었는지요.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당신이 좋아할 만한정보
AD
당신이 좋아할 만한뉴스
지금 뜨고 있는뉴스
행사&비즈니스
많이 본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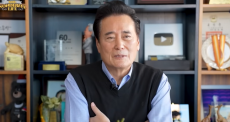







![정부 요구 자료 70~80%만 낸 쿠팡…핵심 포렌식 ‘원본’은 공백[only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1/PS26011301252T.jpg)









![[포토] 롱샷 데뷔 쇼케이스 현장](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3/isp20260113000221.400x280.0.jpg)
![[포토] 롱샷 프로듀서 박재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3/isp20260113000219.400x280.0.jpg)
![[포토] 롱샷 프로듀서 박재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3/isp20260113000220.400x280.0.jpg)
![[포토] 롱샷, 신나는 무대](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3/isp20260113000215.400x280.0.jpg)
![[포토] 롱샷 우진, 그루브 넘치는 춤선](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3/isp20260113000211.400x280.0.jpg)
![[포토] 롱샷, 눈빛에 치인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3/isp20260113000212.400x280.0.jpg)
![[포토] 롱샷 률, 내가 바로 상남자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3/isp20260113000214.400x280.0.jpg)
![[포토] 롱샷 오율, 치명적인 표정](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3/isp20260113000209.400x280.0.jpg)
![[포토] 롱샷, 칼군무](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3/isp20260113000213.400x280.0.jpg)
![[포토] 롱샷 오율, 무대를 즐겨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3/isp20260113000208.400x280.0.jpg)
![[포토] 롱샷, 파워풀한 안무](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3/isp20260113000207.400x280.0.jpg)
![[포토] 롱샷 우진, 멋진 래핑](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3/isp20260113000205.400x280.0.jpg)